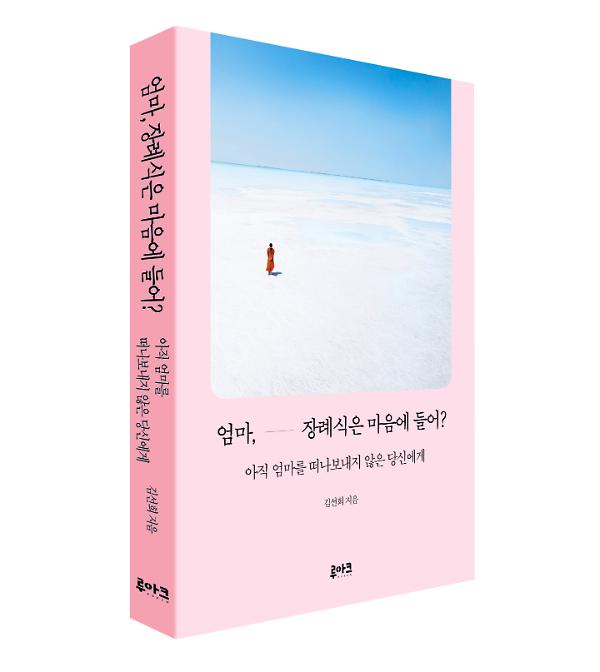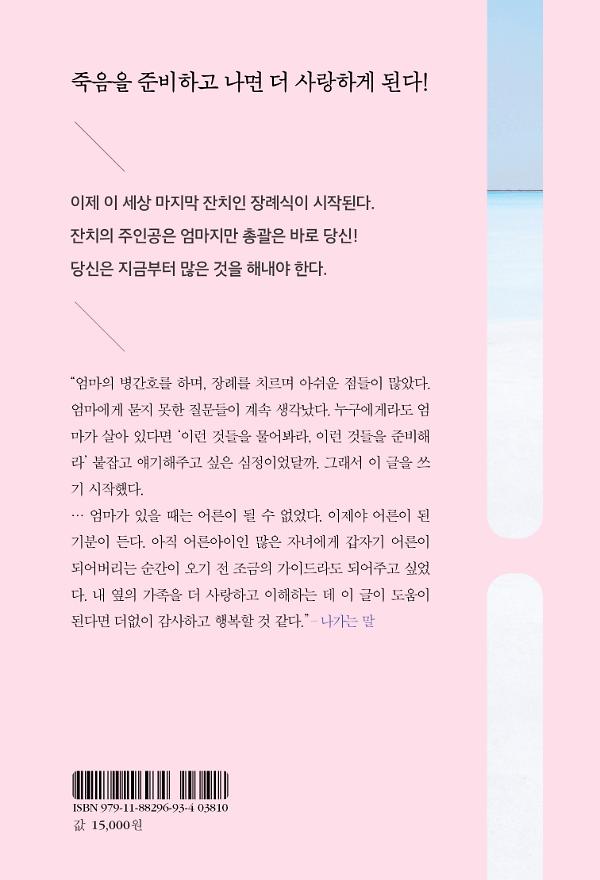엄마는 동네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에 갔고 허리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니, 뼈에 금이 갔는데 허리가 좀 아프다니. 도대체 엄마는 얼마나 아파야 ‘나 죽네’ 앓는 소리를 할까? 한평생 참는 게 숨 쉬듯 익숙한 사람, 엄마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보호대를 착용하고 치료를 받아도 뼈가 잘 붙지 않았다. 오히려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종합병원에서는 그제야 무언가 이상했는지 의뢰서를 써주었고, 우리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았다. 당연히 정형외과로 가겠거니 했는데 이런저런 검사 뒤 마주 앉은 사람은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이었다. 엄마가 구강검진을 하러 간 사이 혈액종양내과 간호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 교수님께서 보호자와 먼저 면담을 원한다고 한 것이다.
#14쪽_참기 대장 엄마 대신 내가 유난을 떨었어야 했을지도
부모님이 젊고 건강하다 해도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할지 모른다. 미리 준비했더라도 부모님의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부모님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 준비해두었다는 생각에 오늘을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죽음이라는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에게 대책 없이 얻어맞는 기분은 들지 않을 것이다.
#46쪽_지금 당장 엄마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
남편과 쪼그려 앉아서 친척과 지인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헤아려봤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조를 짜서 시간 맞춰 올 것도 아니니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모자르게 하느니 남기고 말지’ 하는 태도로 베푸는 사람이었다. 엄마를 떠올리자 결정이 쉬워졌다. ‘그래, 사람들 밥 못 먹고 나가느니 널널하게 있다 가게 하자. 넓으면 밤에 여기저기 누워 자기도 좋지 뭐.’ 그렇게 제일 큰 특실로 정했다. 막상 장례식을 치러보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첫날과 둘째 날 저녁에는 그 넓은 곳이 꽉 들어찼다.
#76쪽_장례식은 눈치 게임 하나, 둘, 셋!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가족의 장례식을 상상하면 땅을 치고 통곡하거나 눈물을 흘리다 지쳐 쓰러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간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장례를 치러보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봤을 때는 반가웠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순식간에 눈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도 했지만.
좋은 유가족의 자세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술에 취하든, 갑자기 오열하든, 뜬금없이 웃어버리든 사람들은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 같다.
#96쪽_엄마 장례식장에서 때아닌 웃참 챌린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든 잘 다듬어진 형식이 있으면 그걸 지키면서 진정성이 곁들기도 하니까. 하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에서 형식이 진심을 이길 수는 없다. 형식을 챙기느라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게 옳은 일은 아닐 것이다.
엄마의 49재 이전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덥더니 49재 때 비가 억수로 쏟아진 뒤로는 갑자기 시원한 가을이 시작됐다. 한평생 우리 힘든 건 다 대신하고 좋은 것만 가져다주던 엄마가 떠나면서까지 지긋지긋했던 여름을 가져가고 선선한 가을을 내주고 갔다. 엄마답게.
#118쪽_삼우제와 49재는 필수 아닌 선택
예전에는 고인이 쓰던 물건을 태워서 고인과 함께 떠나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믿음 자체가 희미해진 데다 아무 데서나 물건을 태웠다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우리는 최근 사드린 새 옷 한 벌만 49재를 지낼 절에서 태우기로 하고 나머지는 헌옷 수거함이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했다. 엄마의 앞치마를 돌돌 말아 안아 들고 시뻘게진 눈과 코를 하고는 엄마 집을 나섰다. 엄마의 공간에 잠시 있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마구 헤집어졌다. 동생을 서둘러 이사시켜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135쪽_엄마 앞치마를 입어봐도 엄마 손맛은 안 난다 
고맙게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 어느새 엄마가 떠난 지 10개월이 되었다. 겨우 10개월 사이에 질투도, 부끄러움도 옅어졌다. 내가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곱게 먹은 건 아니다. 애초 시간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다.
아직도 TV 속에서 모녀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중에 엄마와 다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 “엄마, 엄마, 엄마” 하며 하루에 수천 번씩 나를 불러 내 넋을 빼놓을 때는 초점 없는 눈으로 입만 웃으며 속으로 ‘아, 나만 없어, 엄마’ 하고 자조 섞인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질투도 부끄러움도 아니다. 그저 엄마와 딱 한 번이라도 더 데이트하고 싶다는 사무치는 그리움이고, 엄마가 내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아쉬움이다.
#158-159쪽_나만 없어,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