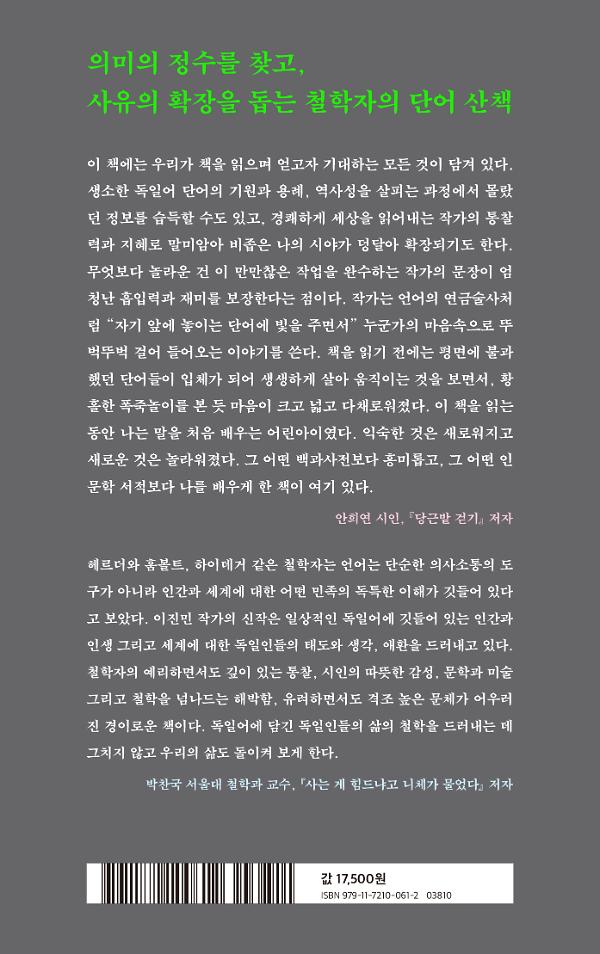〈 출판사 리뷰 〉
* 안희연 시인,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 추천!
* 철학자의 사유와 경계인의 시선으로 완성한 책
철학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이진민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독일어 단어를 유리구슬 삼아 독일과 한국 사회를 비춰보는 글을 쓰려고 했다”고 적었다. 독일어 단어를 소재로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인문교양서가 완성된 건 저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 덕분이다. 새롭게 터를 잡은 독일에서 다시 아이가 되어 말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였기에 투명한 눈과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독일어 단어들을 골라 모을 수 있었다. 한편,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자 본질을 탐색하는 학문인 철학을 오래 공부해 온 철학자답게 여러 각도에서 단어를 입체적으로 살피며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길어 올린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만든 나라다. 독일어로 유치원은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아이들을(Kinder) 위한 정원(Garten)을 의미한다. 교복이나 다름없는 방수 재질의 놀이 바지 마치호제를 입고 사시사철 유치원의 큰 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저자는 한국의 유치원이 학습이 주가 되는 곳이라면, 독일의 유치원은 ‘아이로서의 삶을 사는 곳’이라 말한다.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사회가 아이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유치원에는 라우스부르프(Rauswurf)라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 라우스부르프는 퇴출이나 제명의 의미로 쓰이지만, 선생님이 유치원을 졸업하는 아이들을 유치원 밖으로 던져주는 세리머니를 지칭하기도 한다. 물론 바닥에는 두터운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아둔다. 독일 유치원 졸업식의 하이라이트인 라우스부르프에서 저자는 하이데거의 피투성(被投性, Geworfenheit)과 기투성(企投性, Entwurf)을 연결한다.
“우리는 내던져지는 존재지만, 타인을 어딘가로 던져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중요하게는 나 자신도 어디론가 던질 수 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피투성과 더불어 등장하는 ‘기투성’이다. 특정한 방향으로 스스로를 던지고 데굴데굴 굴러감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갈밭에서 구르는 타인을 그보다는 조금 나은 모래밭으로 던져줄 수도 있다. 피투성은 필연이고 수동이지만, 기투성은 가능성이고 능동이다.” (132~133쪽)
일상의 단어를 들여다보면
그 사회의 지향이 보인다
철학자의 사유가 독일어 단어에서 출발한 글을 삶의 이야기로 확장시킨다면,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라는 ‘경계인’의 시선은 이 글을 한국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로 한 번 더 확장시킨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말을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였다. 익숙한 것은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은 놀라워졌다”는 안희연 시인의 극찬과, “독일어에 담긴 독일인들의 삶의 철학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도 돌이켜 보게 한다”는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추천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책의 문을 연 첫 단어는 독일 사람들이 평일 일과를 마칠 때 외치는 ‘파이어아벤트(Feierabend)’다. 축제나 파티를 뜻하는 파이어(Feier)와 저녁을 뜻하는 아벤트(Abend)가 합쳐진 말이다. 저자는 비슷한 한국어로 ‘퇴근’을 꼽으면서도 두 단어의 표정은 “전자파 충만한 얼굴로 ‘물러나는(退)’ 얼굴과 작은 축제를 선포하며 일어나는 얼굴 사이의 간극”만큼이나 다르다고 밝힌다. 지금으로부터 십 년도 훨씬 전에 한 정치인이 내걸었던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요원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축제가 있는 매일 저녁’이 일상의 언어로 뿌리 내린 독일 사회와의 차이를 실감케 한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가던 어느 날, 저자의 반려인이 다니는 연구소 대표가 직원들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은 같은 시기 모범 방역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치고 보지 않으려 했는지 묵직한 질문을 남긴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한두 달 내로 다시 봉쇄령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지 말고, 그 기간을 가장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휴가를 쓰고 싶으면 쓰세요. 아직은 하이킹을 하거나 산책을 할 수 있을 때, 자연에서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겁니다. 또 다른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으니, 마음을 돌보고 건강에 신경 써서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서 자신을 다그치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22~23쪽)
“어떤 단어가 존재하는가를 통해 그 사회를 알 수 있고, 여러 단어가 있다면 어느 상황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가를 통해서도 그 사회를 볼 수 있다”는 책 속 문장처럼 우리는 단어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읽어낼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일상의 단어들을 한 번쯤 의식적으로 들여다보고, 작은 단어에서부터 자신의 철학과 이야기를 세워가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각별히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