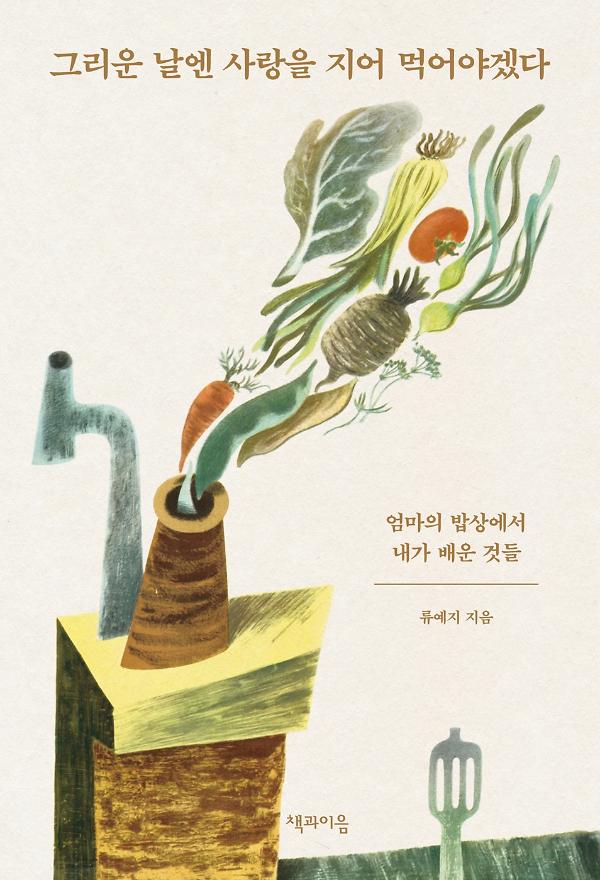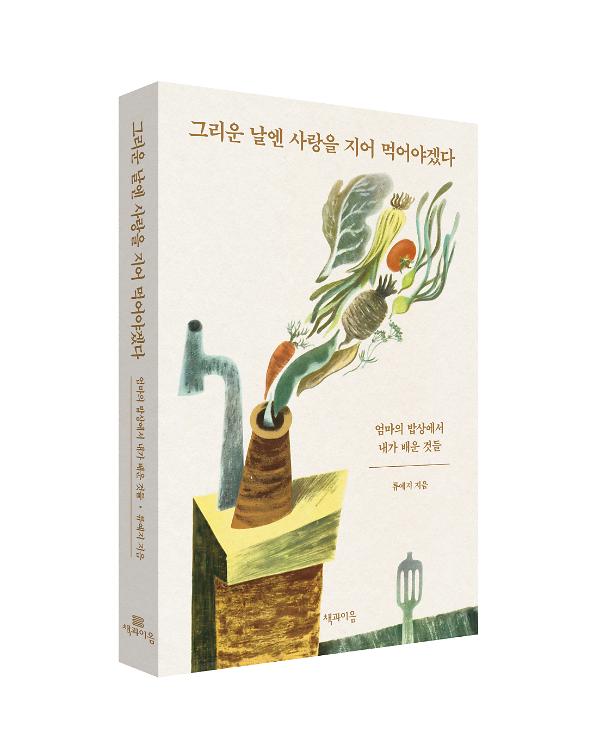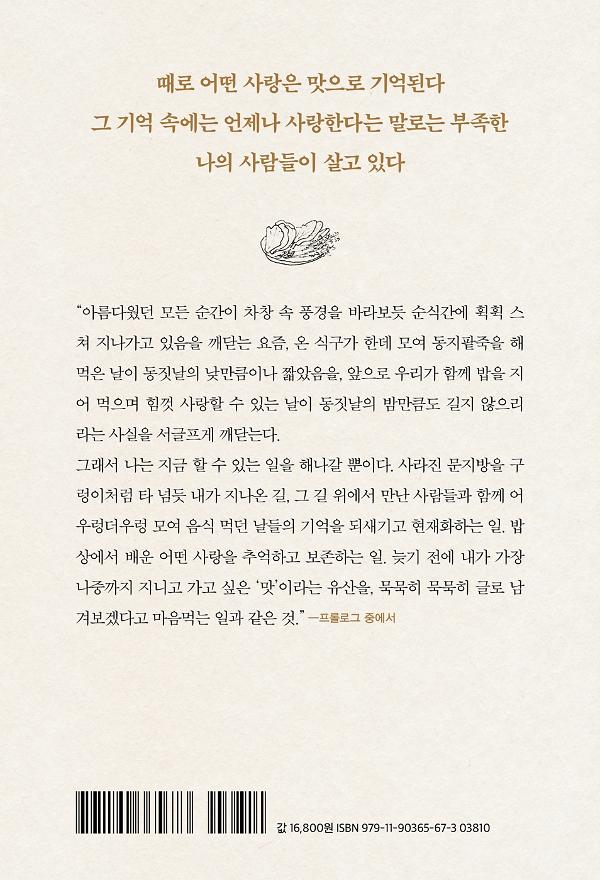인터뷰집 《내가 딛고 선 자리》를 시작으로 음악 에세이집 《어떤, 소라》와 기록 에세이집 《이름 지어 주고 싶은 날들이 있다》를 펴내며 평범한 존재로 살아가는 작은 날들의 가치를 다정하고 감각적인 언어로 기록해온 류예지 작가가 따뜻한 음식 에세이 《그리운 날엔 사랑을 지어 먹어야겠다》로 돌아왔다.
기억 속에 박제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작가는 나새이콩가루국, 오이매깡물국수, 갱시기죽, 배추적처럼 일상의 식탁에서 점점 찾아보기 힘든 향토색 가득한 지역 음식과 양념고추부각, 구운 들기름 김, 잡곡미숫가루, 집 고추장, 감주, 꿀밤묵처럼 만드는 데 지극한 정성이 필요해 이제 더는 잘 해 먹지 않는 음식은 물론, 정구지짠지, 마늘종볶음, 소시지달걀부침, 알타리김치처럼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음식을 하나하나 되살려 그 시절의 맛을 정성스레 재현해낸다.
“육수를 우려내는 데는 바닥 한쪽이 새카맣게 그을린 양은 냄비만 한 게 없었다. 눈을 반쯤 뜬 채, 밀려오는 하품을 쫓아내면서도 엄마의 손은 날랬다. 대가리와 똥을 미리 따놓은 굵은 멸치 몇 마리, 넓적한 다시마를 꺼내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다. 양은 냄비 속 육수가 푹푹 끓어오르며 밭은 김을 뱉어내면, 엄마는 소면 삶을 냄비를 올려 요리에 속도를 붙였다. 소면을 삶는 동안 엄마는 냉장고에 넣어둔 오이를 서둘러 꺼냈다. 텃밭에서 따 온 오이의 크기는 제각각이었다. 그중에서 속을 박박 긁어낸 큼직한 늙은 오이는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고명으로 순식간에 탈바꿈했다.”
—〈내 안에 잠자는 평범한 여름을 불러내고 싶어서〉 중에서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 차려낸 음식에 얽힌 추억은, 나아가 어린 시절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낸 존재에 대한 헌사로 화해 그립고 애달픈 풍경 속으로 우리를 소환한다. 대 식구의 끼니를 차려내느라 늘 고단했을 엄마, 반찬 하나 차려내기 힘든 가난한 날에도 기죽지 않고 텃밭으로 냉큼 달려가 직접 키운 상추를 따 오던 엄마, 자식들이 첫 끼를 해치우기도 전에 다음 끼니로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던 엄마, 서울로 떠나는 자식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들려 보내려고 바리바리 짐을 싸던 엄마……. 사랑으로 차려낸 엄마의 밥상에서 작가가 배운 것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이 많다. 이를테면 사방으로 뻗어나가나는 정구지의 왕성한 생장 속도를 보듬을 때 필요한 정성이나, 모르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듯 마늘종볶음을 먹을 때 이에 힘을 주고 좀 더 쫑쫑거리며 씹게 되는 용기, 비에도 바람에도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쌈 채소를 바작바작 소리 내어 씹는 당당함 같은 것들.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엄마를 그렇게 틈 없이 종종거리며 ‘같잖지’ 않게 살도록 단련시킨 건, 희생으로 점철된 시대를 건너온 엄마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당당히 말하는 자식을 두지 못해서라고 말이다. 내가 엄마를 더는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딸이 되었다면, 엄마는 5종 잡곡미숫가루를 만드느라 바람을 헤아리고 하늘을 살피는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염치없이 맛있는, 알아서 더욱 무서운〉 중에서
세월은 어김없이 흐르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종종거리고도 힘이 남아돌던 젊은 엄마는 사고로 부러진 허리뼈가 잘못 올려 붙으며 바닥에 오래 쪼그려 앉는 동작을 하기 어려워졌고, 덩달아 어떤 음식은 이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목록의 대열에 올라서고 말았다. 이미 사라진 혹은 언젠가는 상실할 소중한 존재에 대한 작가의 애정은 글 곳곳에 엄마의 손맛이 담긴 양념처럼 배어들어 우리를 눈물짓게 한다. 누구나 분명 ‘상실이 전제되기에 더욱 간절한’ 음식 이야기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것이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소중한 존재와 함께한 날들의 기억을 지금 여기에서 현재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한다. 살다가 문득 까닭 모를 허기가 질 때 나를 위로하는 지난날의 소소한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무심코 지나친 평범한 날들이 주었던 기쁨을 가만히 되짚어낼 수 있다면, 부끄럽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한 줌의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이 책 《그리운 날엔 사랑을 지어 먹어야겠다》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렁더우렁 모여 우직한 정성으로 차려낸 음식을 나누어 먹은 소박한 날들의 추억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일깨워주는 한편, 오늘도 세상에 부딪히고 깨지며 홀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용기와 말 없는 위로를 전해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한 가지는 더욱 분명하게 알 것 같다. 내가 기어이 이해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건 바로 이불 가게에서의 해프닝은 벌써 오래전 일처럼 새까맣게 잊어버린 천연한 얼굴로 고춧가루 한 주먹 슬슬 뿌려 알타리를 힘껏 버무리는 엄마여야 할 것이라고. 나이만 먹었지, 바람 든 무를 씹듯 못난 생각을 퍼석퍼석 씹어대며 되새김질하는 딸의 입속에 맛있는 거 한 가지를 더 넣어주기 위해, 부러진 허리뼈를 곧추세운 채 끝내 엉덩이로 기어서라도 부엌을 전력 질주 중인 내 앞의 엄마를, 끝내 사라져버릴 내 안의 한 사람을 알타리를 씹듯 단단하게 꽉 껴안는 일일 것이라고.”
—〈내 앞의 한 사람을 단단히 끌어안는 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