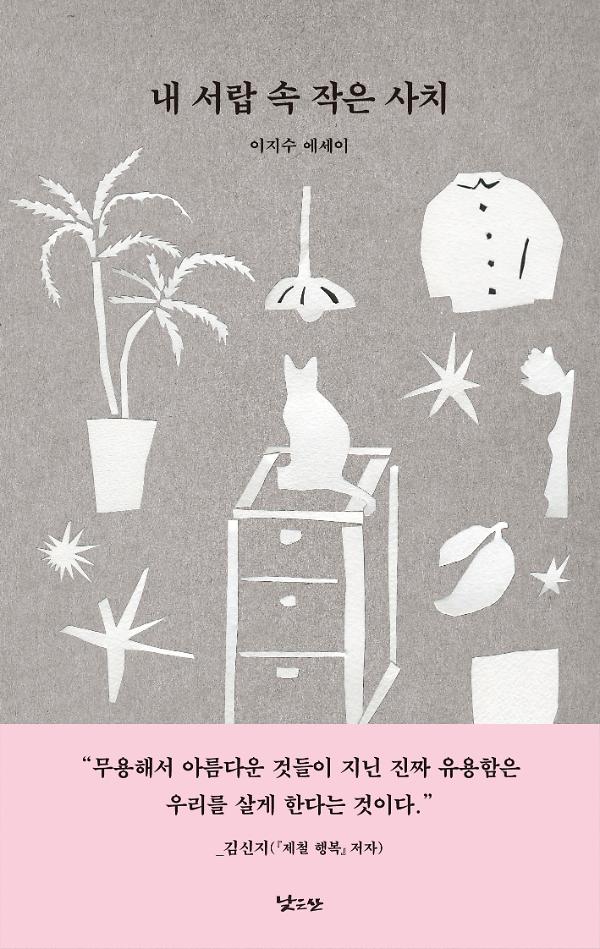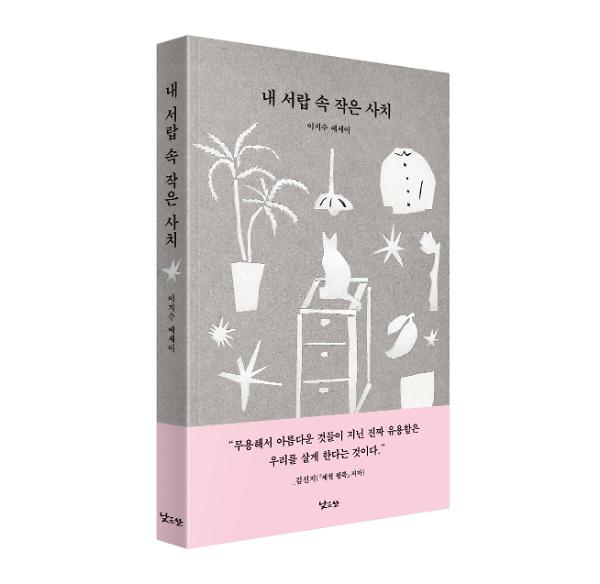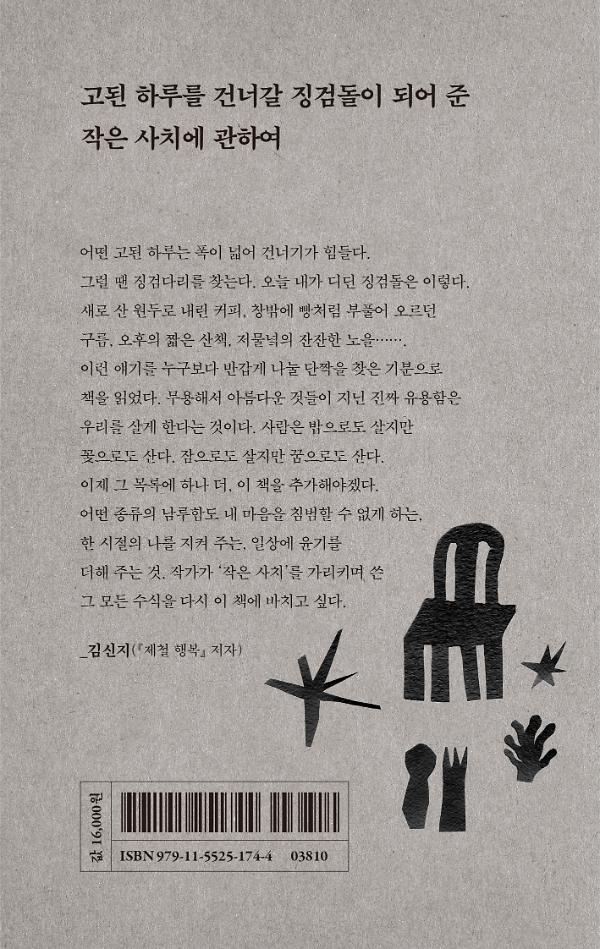“무용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지닌 진짜 유용함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다.”
_김신지(『제철 행복』 저자)
“오늘 하루의 생활 중 단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고된 하루를 건너갈 징검돌이 되어 준
작은 사치에 관하여
사노 요코의 『사는 게 뭐라고』,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등을 우리말로 옮기고 『아무튼, 하루키』 『읽는 사이』 『우리는 볼록볼록해』 등을 쓴 이지수 작가의 신작 에세이가 출간되었다.
『내 서랍 속 작은 사치』는 몇 년 전 한 일간지에 쓴 「사치와 허영과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에서 비롯된 책이다. 이 글에서 작가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출판사 외판원들에게 호쾌하게 지갑을 열고, “늘 어제와 다른 색깔의 방울과 리본”을 언니와 자신의 머리에 달아주고, 모조일지언정 갖가지 액세서리들을 즐겼던 엄마를 떠올린다.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뛰고, 유통기한이 지난 선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작가는 “엄마가 신산한 삶 속에서도 사치와 허영과 아름다움을 선물해 준 역사가 내 안에 확고하게 존재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색색깔의 머리 방울과 리본, 책이 터질 듯이 가득했던 책장, 앨범 속 나와 언니가 입고 있는 고운 옷과 에나멜 구두. 그런 기억들을 자린고비가 천장에 매달아 놓은 굴비처럼 핥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종류의 남루함도 감히 내 마음을 침범할 수 없었다. 나는 과거의 반짝이는 것들을 밟고 그 시절을 건넜다.
- 「사치와 허영과 아름다움」에서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사치의 목록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 책에 담긴 스물아홉 편의 글은 추천사대로 “폭이 넓어 건너기 힘든 하루”에 놓인 요긴한 징검돌들이다. 책갈피, 핸드크림, 의자, 프라이팬, 잠옷…… 띄엄띄엄 놓인 제각각 모양의 돌들을 딛고 작가는 어느 고된 하루, 어떤 고단한 시기를 건넜다. 일상적인 물건들에 깃든 이지수 작가 특유의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시선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의 목록을 헤아려보게 할 것이다.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지만 있으면 좋으니까 굳이 구입하는 것. 그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게 사치품이라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다양한 사람이 나는 부럽다. 그는 분명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 「핸드크림」에서
햇볕에 잘 달궈진 조약돌처럼
오래 손에 쥐고 있고 싶은 이야기
물건에서 시작한 목록은 공간으로, 취미로, 행위로 확장된다. 충동적으로 등록한 피아노 레슨은 “뫼비우스 띠처럼 같은 곳을 맴돌던 나날”을 “미세하게 전진하는 하루”로 바꿔주고, 느직느직 무계획으로 보낸 여행은 “사치스러운 여백의 시간”을 선사한다. 조급증을 누르고 아이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춘 등원길, 이른 아침 피렌체의 한 성당에서 마주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마주하지 못할 강렬한 순간”, ‘나는 이렇게 못 자고 있지만 너는 잘 잤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숙면을 빌어주는 불면의 밤을 작가와 함께하는 동안 햇볕에 잘 달궈진 조약돌을 쥐고 있는 듯한, 이것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곧이어 눈앞에 나타난 광경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의 넓은 홀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 (…)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순간을 잡아 두기 위해 숨을 참는 것밖에 없었다.
- 「알리바이」에서
따뜻하고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웃음을 자아낸다면, 묵직하고 뭉클한 에피소드들은 독자를 잠시 멈춰 세운다. 플라스틱 용기 샤워용품들을 비누로 바꾸고, 동물복지란을 사고, 재사용이 가능한 빨대를 쓰는 등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자신이 발을 딛고 선 장소를 조금이라도 덜 나쁘게 만들려는” 태도가 선택한 사치는 “무해하다”는 말의 무게를 새삼 곱씹어보게 한다. 반려묘 ‘르바’를 떠나보내며 “철저히 계획의 영역 밖에 있”는 죽음을 실감한 작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사치스러운 일이다. 시간과 돈이, 무엇보다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들과 함께하는 삶에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나는 겁에 질려 그 삶을 선택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별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면 더더욱.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15년 전의 나는 그 삶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고양이가 주는 행복을 분에 넘치게 누릴 수 있었다.
- 「고양이」에서
우리에게서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것은
무용해서 아름다운 찰나들
이 책의 에필로그는 각별히 아름답고 서늘했던 글 한 편을 말미로 삼은 것이다. 작가는 이 글에서 “하루를 1초짜리 동영상으로 편집해 기록하는” ‘원 세컨드 에브리데이(1SE)’라는 애플리케이션과 “자신의 하루 중 3초를 선택해 기록하는 안드로이드 ‘양’이 등장”하는 영화 〈애프터 양〉을 소개한다. 6년여의 시간이 단 몇 분으로 압축된 앱에 기록된 영상이 1초씩 망막을 스친다. “건강했던 고양이들, 친구들과의 연말 파티, 제주도에서 만난 강아지, 기고 걷고 뛰는 아이…….” 한편, 영화에서 “제이크와 키라 부부가 입양한 중국계 딸 미카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구입한” ‘양’이 기록한 순간은 이런 것들이었다. “갓난아기 시절의 칭얼대는 미카를 안고 부드럽게 어르는 키라, 걸음마를 시작한 미카, 차를 우려내는 제이크, ‘릴리 슈슈’ 티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회색 벽에 드리워진 수풀 그림자, 햇빛에 반짝이는 거미줄.”
작가는 두 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뒤 자문한다. “지금부터의 여생을 그런 식으로 기록한 뒤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클라우드 어딘가에 남게 될 그 영상은 무엇이 되는 걸까.” 인생은 어쩌면 연속되고 일관된 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에게서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것은 나의 쓸모를 증명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무용해서 더없이 아름다운 찰나들뿐이다. 작가가 던진 질문이 마지막 책장을 덮은 뒤에도 마음속에 길고 선명한 메아리를 남긴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울고 웃고 화내고 안달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진다. 그러면 내 발은 또다시 이곳에 딱 붙어 있지 못하고 어딘가로 자꾸 미끄러진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서랍 속에 작고 단단한 기쁨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안다. 영원의 띠에 흩뿌려 놓으면 거의 보이지도 않을, 먼지처럼 작디작은 알갱이들.
- 「에필로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