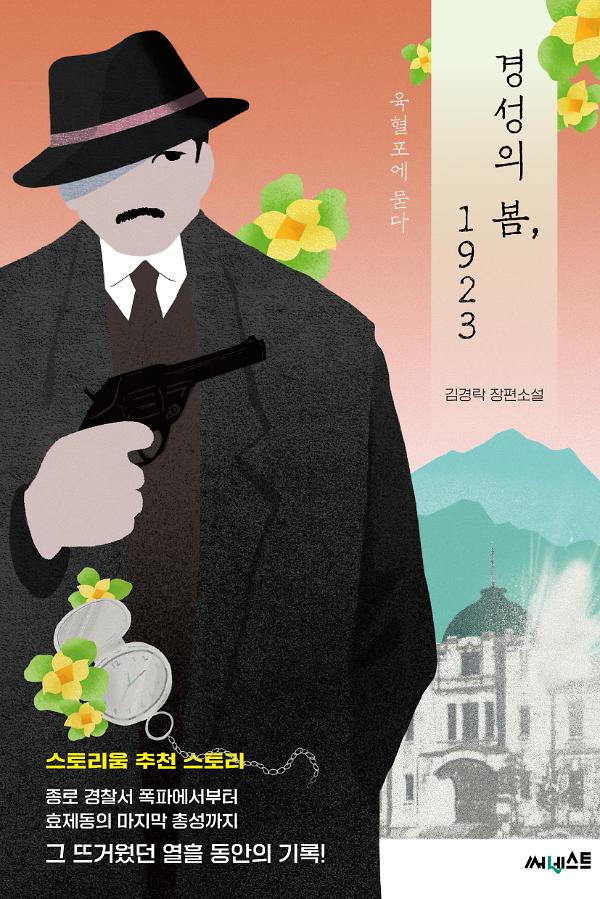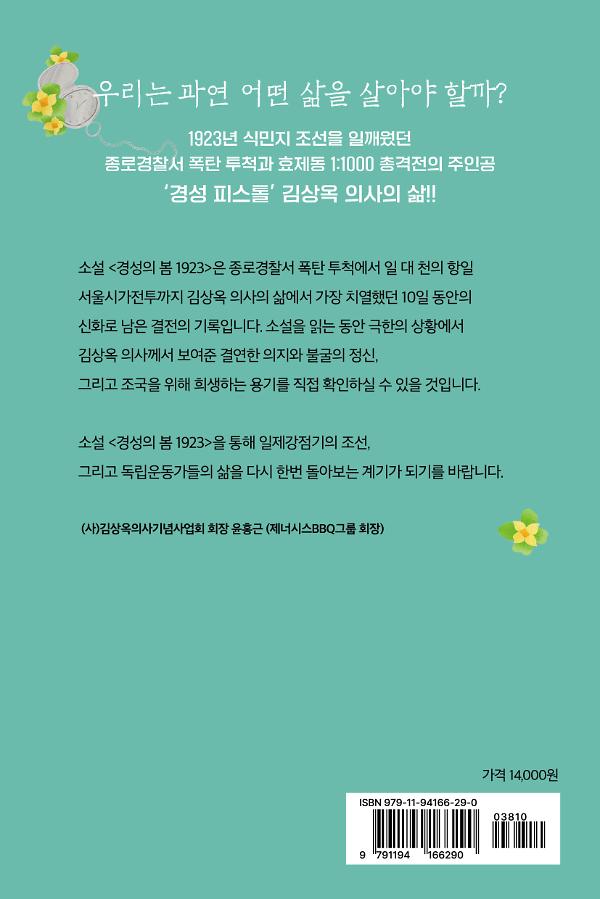한 줄 서평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일에서부터 두 자루의 권총으로 ‘1:1,000 항일 서울 시가전’을 벌여 조선을 뒤흔든 김상옥 의사의 뜨거웠던 10일 동안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소설이다.
종로경찰서 폭파에서 효제동의 총성까지, 10일 동안의 기록
2015년 개봉해 1,2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암살》에는 독립군 남자현 의사를 실제 모델로 한 독립군 저격수 안윤옥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안윤옥’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윤봉길, 김상옥 의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경성의 봄, 1923》은 이 세 분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김상옥 의사의 삶을 다루고 있다. 특히, 김상옥 의사의 길지 않은 삶 중에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경성 시가지에서 일본 군경 1,000명과 맞선 “일 대 천 전투”를 벌인 후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기까지 10일 동안의 기록을 소설로 재구성했다.
소설을 읽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서울’이 치열했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0년 전 34세 젊은 나이로 순국한 김상옥 의사의 삶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할 것인가를 되짚어보게 한다.
종로경찰서 폭파와 “1 : 1,000의 전투”의 의미
김상옥 의사는 1923년 1월 12일 항일 투사들에 대한 탄압과 고문으로 악명 높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종로경찰서는 조선인에게 원한과 분노,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은 억압받는 조선인들의 울분을 해소하고 조선의 민족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10일 후인 1923년 1월 22일에는 일제 군경과 1:1000으로 맞서 싸우다가 34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다. 특히, 이 사건은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는 달리 당시 식민지 지배의 중심이었던 경성, 그것도 경성 한복판에서 무장 항거를 했던 독보적인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분명하다. 1919년 3.1 운동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했던 일본은 이후 ‘문화 통치’라는 것을 내세워 마치 세상이 평화롭고 일본의 통치가 순조로운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김상옥 의사는 조선총독부가 자리했던 경성 한가운데서 10일 동안이나 홀로 일제 군경의 경계망을 무력화하며 경성 시내를 발칵 뒤집어놓았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35년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를 통해 김상옥 의사의 의거는 일제의 문화 통치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당시의 조선 사람들에게 독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자각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일제와 친일파들이 유포시켰던 환상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폭탄 투척과 총격을 펼치며 끝까지 저항함으로써 사람들을 일깨워준 것이다.
2024년 광복절에 돌아보는 김상옥 의사의 삶
돌아오는 2024년 8월 15일은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다. 광복의 그날로부터 거의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일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일본의 정치인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 이는 올해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광복절은 일제강점기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일제의 억압에 맞섰던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희생이 결실을 맺은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동시에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의 희망과 번영을 다짐하는 날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광복절에 김상옥 의사의 의거가 갖는 역사적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이다. 소설 《경성의 봄, 1923》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목숨을 바친 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