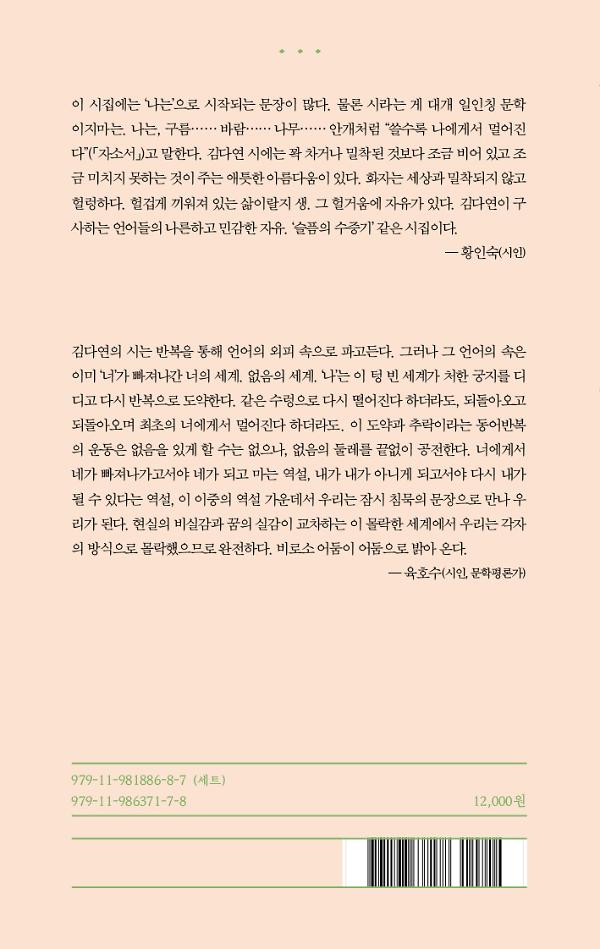“나는 조금 더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무 곁으로 옮겨 가야 할 것 같아”
너에게서 시작되었으나, 너에게서 멀어진,
없음에서 태어나는 말들의 아름다움
2017년 『문학3』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다연 시인의 첫 시집 『나의 숲은 계속된다』가 타이피스트 시인선 004번으로 출간되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목소리를 탐색해 온 시인은 빈칸과 공백과 빈 바람의 언어를 손에 쥐고 우리에게 에코의 목소리를 건넨다. 상실의 정서를 오랜 시간 궁굴려 온 시인의 문장은 어렵지 않은 시어로 깊은 여운을 남기며 독자들을 나직한 숲의 세계로 초대한다.
모든 오늘을 한 문장에 담기 위해
‘너’를 옮겨 적으면서 나를 비껴가는
무언가 쓰고 싶었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밤일 뿐인데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인데
몸에서 새가 울고 강이 흐른다
나는 조금 더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무 곁으로 옮겨 가야 할 것 같아
―「너는 너의 밤을 중얼거리고 나는 나의 꿈을 웅얼거리고」중에서
시인은 무언가 쓰고 싶은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른다. 책상에 앉아 눈을 감고 그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것은 〈시인의 말〉에 쓰인 것처럼, 이미 ‘잃어버린 것’이며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며, 나아가 ‘없음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어떤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기에 시인은 눈을 감고 “텃밭을 가꾸고 방울토마토를 기다리”는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생각한다. 작은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만으로 시간은 다시 흐를 것이고, 그럼으로써 시인은 자신이 쓰고 싶은 무언가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것, 한때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으로 인해 시인의 시간은 멈추었고 그 잃어버림마저 잃어버렸기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계, 그 없음에서 태어나는 말들의 머뭇거림 속에서 빈 바람이 분다.
나는 너로부터 쓸 수 없는
그러나 써야 하는 슬픔을 물려받았다
나는 어떤 모종이었기에 어떤 흙에서도 자라지 못했을까? 허구의 잎. 그림자에 안겨 곤한, 몽상으로부터의 광합성.
빛을 받아 자라나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단 하나의 과오
나를 웃게 한 것이 나를 울게 한다는 것. 나를 울게 한 것은 결국 나라는 걸 알 때까지 울고 우는 것.
―「고독은 나의 사(事)여서」중에서
아픔이 아프지 않다고 하기엔 슬픔이 슬프지 않다고 하기엔 너무 아프고 슬퍼서 끝까지 읽을 수 없어 덮어 둔 페이지에서
(…)
차가운 발을 만지면 들리는 속삭임은
춥다는 말일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일 것이다
―「‘ㄹ’이 사라진 밤」중에서
존재의 상실을 통해 무한한 말들의 탄생을 지켜보던 시인은 그 나날들을 기록함으로써 너의 없음에서 발생하는 말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나직한 목소리로, 한 끝의 부산스러움도 없이, 김다연 특유의 배려와 세심함이 돋보이는 문장들로 숲의 형체를 그려 나간다. 그러므로『나의 숲은 계속된다』는 ‘무’의 언어이자 그리움의 언어에서 시작된다. “너로부터 쓸 수 없는, 그러나 써야 하는 슬픔을 물려받은” 김다연에게 이 세계는 나와 너 사이의 거리이며, 변화와 깊은 사이의 스며듦이며, 적요와 소란 사이에서 발생하는 말들이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현의 울림을 닮은 그의 시는 ‘무’의 아름다움으로, 무엇보다 아름답게 태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