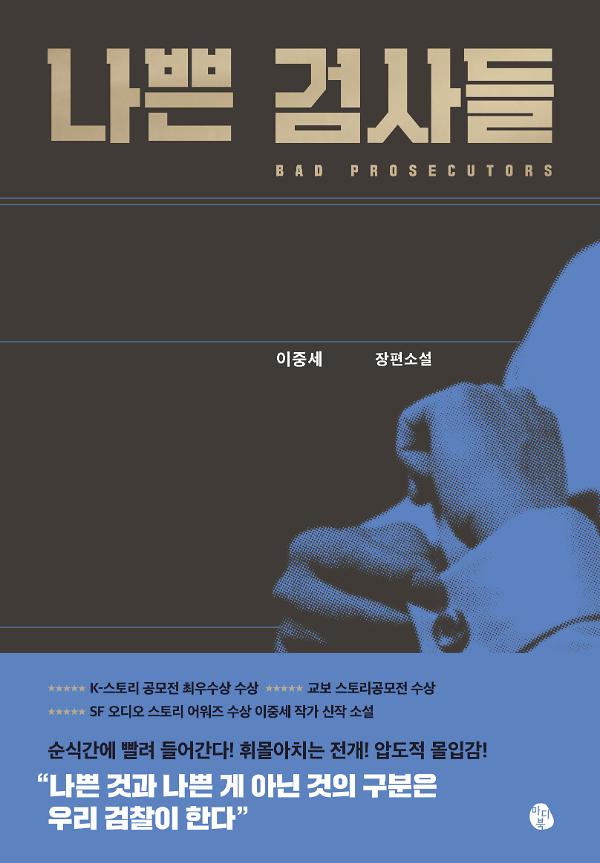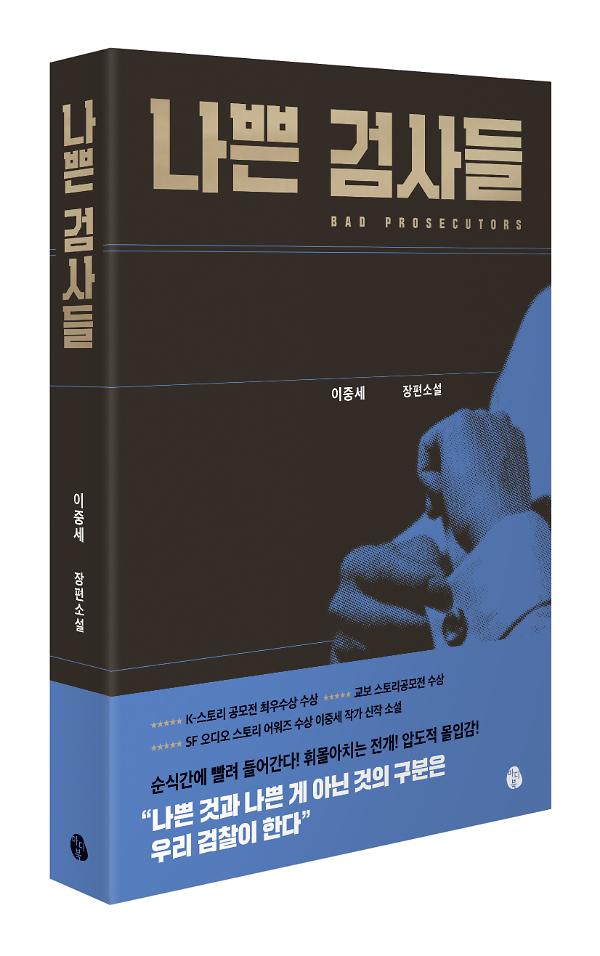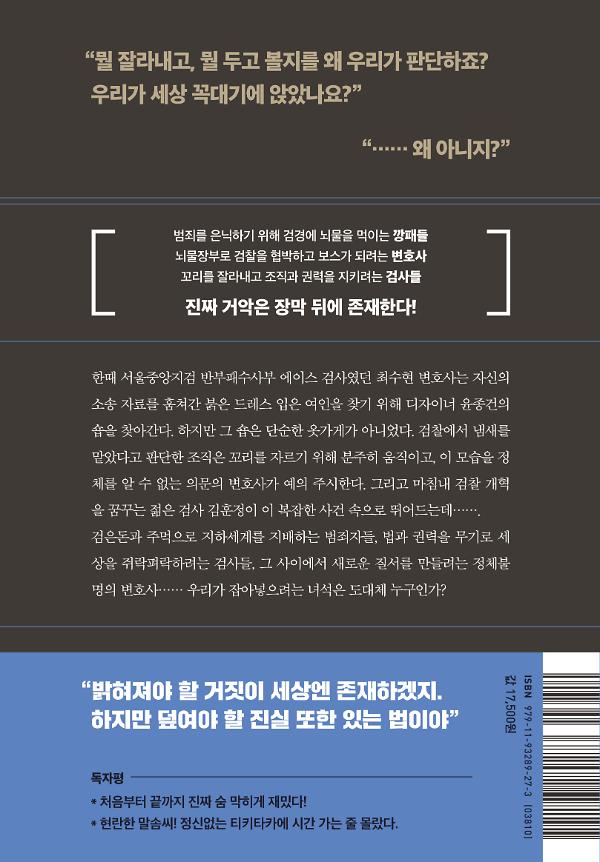“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제2부 김훈정 검사님. 저는 지금 검사님께 장진호가 20년 동안 검찰 고위층에 상납해온 뇌물장부와 여러 사업체를 확장시키며 벌여온 폭력과 협박과 범죄 교사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드리려 합니다. 맞습니까?”
김 검사가 입 떼려 할 때, 누군가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확 잡았다. 수현이었다. 수현이 고개를 내저었다. 한편으로 그는 묻고 있었다. 김훈정이 보고 온 게, 장진호가 20년 동안 검찰 고위층에 상납해온 뇌물장부라는 게 사실이냐고.
“그래요.”
변호사가 수현과 김 검사를 번갈아 보았다. 수현에게도 같은 걸 물을지 곰곰 따져보던 변호사가 김 검사를 바라보았다.
“장진호를 구속시키고, 그 수하들까지 잡아들일 각오로 증거가 담긴 USB를 받아가시는 거, 맞죠?”
김 검사가 손가락을 뻗어 휴대폰 화면을 눌렀다. 녹음은 중단되었고, 변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내민 증거물이 당신을 보증한다 했지?”
그건 사실이었다.
“당신의 정체에 대해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해주겠어. 당신의 증거만을 믿고. 그러니 알량한 협박 따윈 하지 마. 나를 믿고 넘기려면 통째로 믿어. 나도 당신의 증거와 그게 일으킬 부작용까지 통째 받을 테니.”
- 〈제4장. 검은 하이힐을 심은 검사〉 중에서
윤종건은 세탁소 노릇만 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집합소예요. 회장님이 세금이나 밀수나 여러 가지 차명으로 돌리는 자금이 한 덩이고, 채권이나 미술품이나 귀금속까지 엄청나다 이겁니다.”
“단순 빨래방이 아니다? 그나저나 왜 튄 건데.”
윤종건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회장님 꼭지가 완전 돌았어요. 검찰수사관이 왔다 갔다니까 쎄했던 거지. 동맥경화 걸린 사람처럼 퍼덕거리더라고. 숍 당장 닫으라고, 자료 싹 다 폐기하라고 악을 쓰는데……. 이미 들어갈 때 자료 다 모아서 갔어요. 그건 다 넘겼고.”
“복사본 떠놨지?”
“적금이야 꾸준히 부어뒀죠.”
“돌아와서는 자료 폐기했다며.”
“팔 빠져라 파쇄기에 종이 넣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하고 있냐고. 임 실장이라고, 장 회장 밑에 놈이야. 하는 중이라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깜빡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빡이?”
“틱톡틱톡.”
핸들 밑으로 손 가져가는 모양을 취하며 윤종건이 수현을 바라보았다.
“묘한 게 그 양반 탄 차가 저 아래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느낌이 들더라 이겁니다.”
우리 종건이가 약쟁이 생활 수십 년 만에 정수리가 하늘로 뚫려 신묘불측한 예언력을 얻은 모양이었다.
- 〈제6장. 은빛 라이터를 딸깍거리는 깡패〉 중에서
덩어리가 계단으로 급히 내려가는 걸 확인한 백 수사관이 난간 위로 올라갔다. 난간에 매달렸다가 아래층 테라스로 내려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테라스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유리문 하나가 열려 있었고, 건축사무소로 보이는 너른 공간이 펼쳐졌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들과 커다란 도면이 걸린 벽이 오후의 빛 속에 잠겨 있었다.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백 수사관이 위를 쳐다보았고, 고개 끄덕인 수현이 홱 몸을 돌렸다. 토끼몰이 하자는 거로구나.
건축사무소는 고요했다. 백 수사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CCTV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고맙기도 해라. 바깥 출입문은 닫혀 있었다. 잠긴 건가, 닫힌 건가. 나간 것 같진 않았다. 그러면 문고리를 잡을 즈음에 옆에서 덮칠 계획일까나.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 칸막이 뒤에 숨었던 윤종건이 요란한 기합 소리와 함께 와락 튀어나왔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손목을 잡아채고 몸을 굴리면서, 백 수사관이 윤종건을 저리로 냅다 내던져버렸다. 거꾸로 떨어진 윤종건이 끼룩, 딸꾹질을 했다. 찌를 셈이었는지 손에는 검은 샤프가 쥐어져 있었다.
“이 마약사범 새끼께서 내 눈을 후빌라 하셨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윤종건의 접힌 목에서 꾸룩거리는 소리와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흠, 목청 틔우는 소리와 함께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백 수사관이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뒷짐 진 수현이 반가운 미소를 보이며 성큼 들어섰다.
“에고고, 많이 다쳤나 보네.”
- 〈제7장. 보랏빛 행커치프를 착용한 보스〉 중에서
김 검사가 우뚝 멈췄다. 두어 걸음 더 간 성진규 부장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맑아졌다고, 그를 안 지 1년 넘는 기간 중 처음 보는 정직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김훈정 검사에게 들었다.
“결탁이라고, 더러운 협잡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세상은 회색이고, 더 묽거나 더 짙을 뿐이야. 완전한 흰색도 없고, 온전히 까맣지도 않아.”
“검사예요, 우리는.”
“하지만 어떤 칼잡이라도 못 잘라내는 게 존재해. 너무나 뒤엉켜서 암과 장기가 도저히 분리되지 않는 덩어리들이 세상에 널렸어. 때론 잘라내지만, 때론 다독이며 두고 보는 게 우리 일이기도 해.”
“뭘 잘라내고, 뭘 두고 볼지를 왜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가 세상 꼭대기에 앉았나요?”
“왜 아니지?”
성진규 부장이 김훈정 검사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밝혀져야 할 거짓이 세상엔 존재하겠지. 하지만 덮여야 할 진실 또한 있는 법이야. 가라앉을 게 가라앉아야 물이 맑아지잖아. 그걸 누가 휘저으면…… 응?”
- 〈제9장. 호두색 마호가니 책상에 앉은 얼간이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