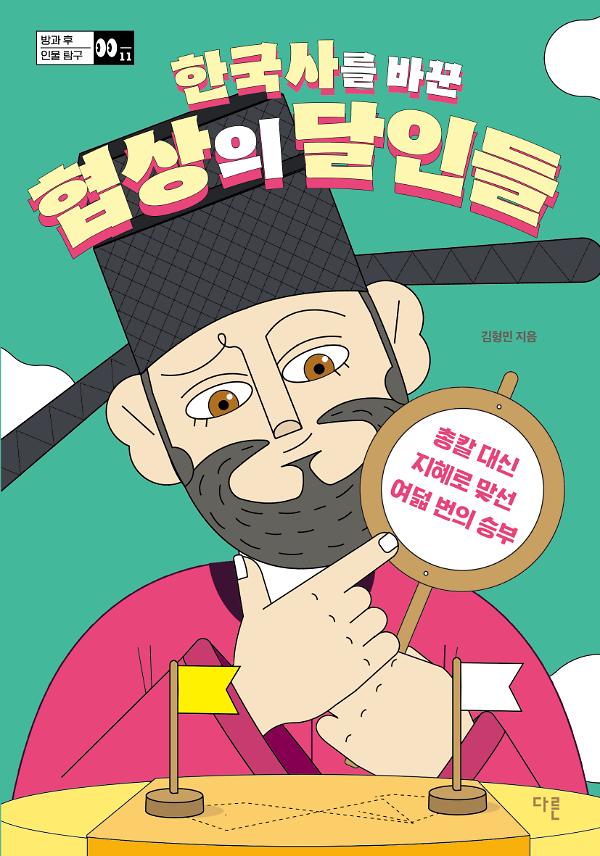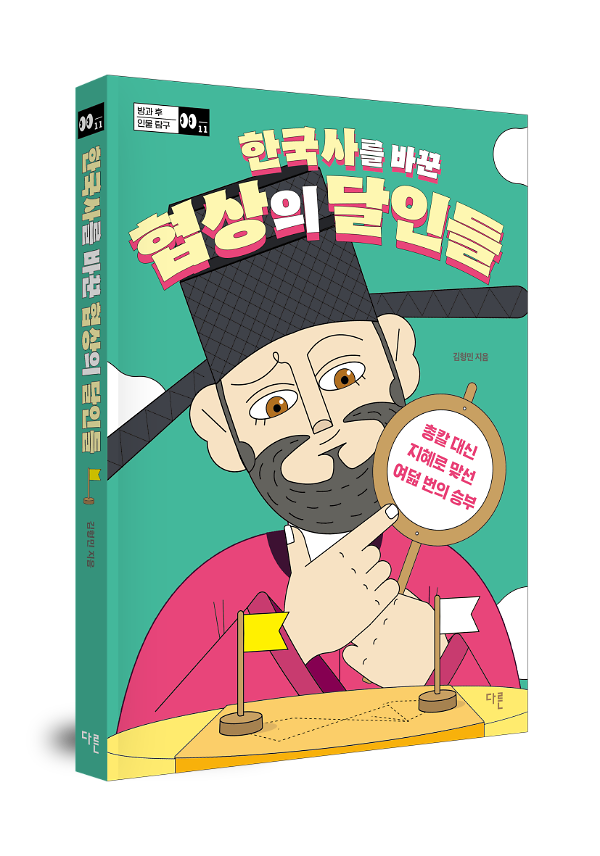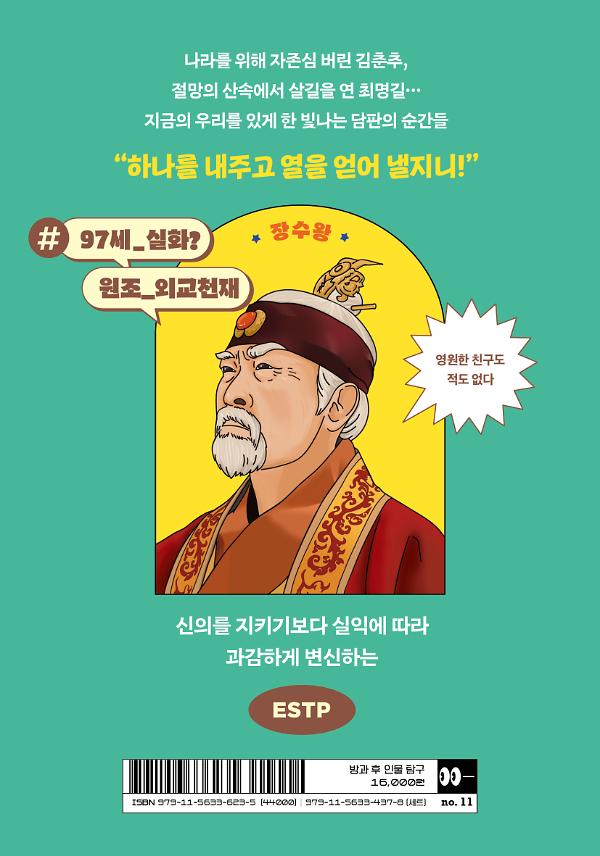장수왕은 북위와 송 모두에게 허리를 굽히면서도 정작 부딪칠 일이 오면 상대방이 ‘어마, 뜨거라’ 할 만큼 단호하게 대응했으며, 이후로도 북위와 송, 그 뒤를 이은 제나라 사이에서 철저한 등거리 외교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등’이란 한자로 ‘같다’는 뜻이지요. 등거리 외교란, 말 그대로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각 나라와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립을 지향하는 외교인 겁니다. 《삼국사기》에서 장수왕의 행적이 주로 대륙의 각 나라에 대한 ‘조공’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 〈눈치 빠른 ‘거리 두기’의 달인 _ 장수왕〉 24쪽
나아가 김춘추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대외교를 펼칩니다. 사대외교란, 크고 강한 나라를 섬기는 외교지요. 그때까지 써 온 고유의 연호를 당나라 것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옷도 당나라 옷으로 입겠다고 약속했고, 자신의 아들을 인질 겸 외교관으로 당나라에 두고 왔지요.
김춘추는 신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했고, 생존의 위협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진덕여왕이 당나라를 찬양하는 노래를 비단에 직접 수놓아 바치는 굴욕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이유겠지요. 귀국길에 고구려 수군에게 적발되어 부하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던 그로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 〈나라의 생존 앞에 자존심은 사치 _ 김춘추〉 42~43쪽
여기서 서희의 말, ‘승부는 강하고 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틈을 잘 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거란군이 강하고 고려군이 약하다 해서 승패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대의 허점과 우리의 강점을 파악하여 상대의 약한 고리를 치고 나간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약하다고 지레 포기한다면 상대의 틈을 볼 여지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지만 주먹을 휘두른 사람의 옆구리는 비게 마련이죠. 서희는 그 ‘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 〈속내를 간파하고 ‘틈’을 노려라 _ 서희〉 59쪽
“네가 바친 말안장에 하늘 천天 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일이냐.”
“만든 사람이 안장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이렇게 됐으니 죄가 큽니다. 하오나…”
설장수는 고개를 조아리면서, 그러나 언성은 높여서 주원장에게 말합니다.
“제가 고려에 귀화한 지도 40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공민왕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의 두세 임금의 경우는 제가 감히 그 지성을 보증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임금은 한마음으로 폐하를 공경하여 감히 태만하지 않습니다.”
함께 온 조선 사람과는 완연히 다른 이목구비의 위구르족 출신 조선 외교관. 설장수가 고려에 귀화한 후 섬겼던 임금들을 언급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외교관으로서 펼쳤던, 고려와 조선 신하로서의 이력을 주원장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 주시오” 하는 호소였지요.
- 〈출신에 매이지 않은 타고난 외교관 _ 설장수〉 86~87쪽
이예는 43년간 40회 넘게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그중에 4회는 통신사로 교토에 파견되어 일본 막부의 쇼군에게 임금의 국서를 전달했습니다. 거친 육로와 험한 해로를 누벼야 했던 당시에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려면 적어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는 거의 20년 동안 나라 밖을 떠돌며 조선의 외교에 헌신한 셈입니다. 그만큼 그는 당대의 일본 전문가이자 최고의 외교관이었고, 조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친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 〈역대 최고의 한일 관계 전문가 _ 이예〉 108~109쪽
“조선에는 무슨 보물이 있소?”
사명대사는 엉뚱한 대답을 하지요.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없고 일본에 큰 보물이 있지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요?”
가토 기요마사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사명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에서 그대의 머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는데 금으로는 천 근이요, 벼슬로는 만 호를 가진 고을 원을준다고 하니 이만한 보배가 어디 있겠소.”
조선 사람들에게는 가장 흉포한 일본군 장군으로 이름 높았던 가토 기요마사 앞에서 ‘당신 머리가 큰 보물’이라고 내지른 셈입니다.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명대사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 〈‘예’와 ‘의’로 적을 상대하다 _ 사명대사〉 123~124쪽
“대감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을 하시오!”
김상헌은 울부짖으면서 최명길이 쓰던 국서를 갈가리 찢어 버립니다. 언뜻 용감하고 장렬해 보이지만 사실상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국서를 찢는다는 것은 외교의 문을 닫아건 채 목숨을 걸고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상헌이 직접 칼을 휘두를 사람도 아니었고, 정작 총칼 들고 청나라 군대로 돌격해야 할 병사들은 오히려 ‘척화신들이 직접 싸우게 하라’고 시위를 하는 판이었습니다.
최명길은 찢어진 국서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찢는 이가 있으면 이어 붙이는 이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못할 바에는 살아서 부끄러움을 견뎌야 하고,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게 해야 했습니다.
- 〈최악의 상황에도 길을 찾는 사람 _ 최명길〉 153쪽
천지를 울리는 만세 소리는 김가진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조선독립만세라니! 대한독립만세라니!”
김가진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정처 없이 누볐습니다. 만세 소리는 벼락처럼 김가진의 어깨를 내리쳤고 번개처럼 온몸을 관통하며 늙은 가슴을 지졌습니다. 김가진이 이미 죽었다고 포기했던 조선은 살아 있었습니다. 김가진이 살았으되 죽어 지내는 목숨이었다면, 죽어 버린 듯했던 백성들은 펄펄 살아 일어났습니다. 나이 일흔넷을 맞은 대한제국 전임 대신은 마음을 고쳐먹고 주먹을 부르쥡니다.
‘아직 내 할 일이 남았구나.’
- 〈가슴에 독립 품고 외세의 풍랑을 타다 _ 김가진〉 185~1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