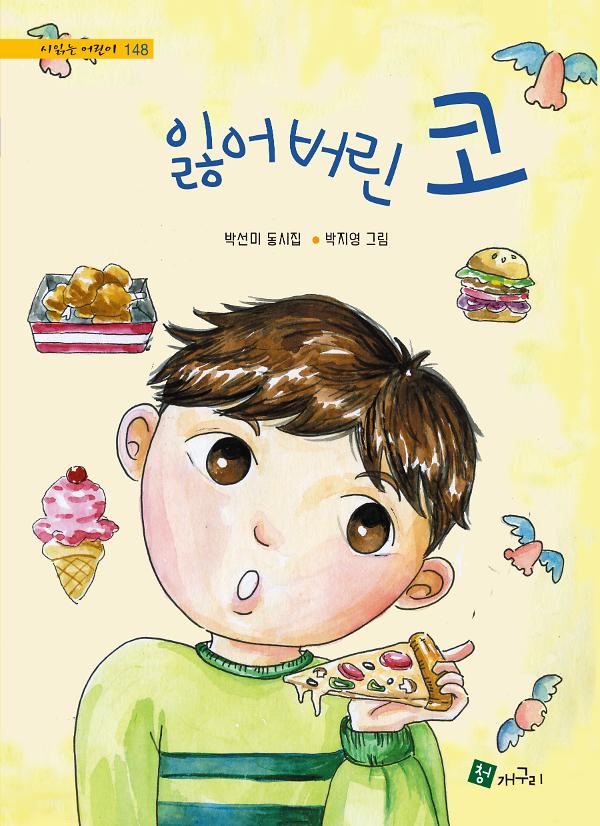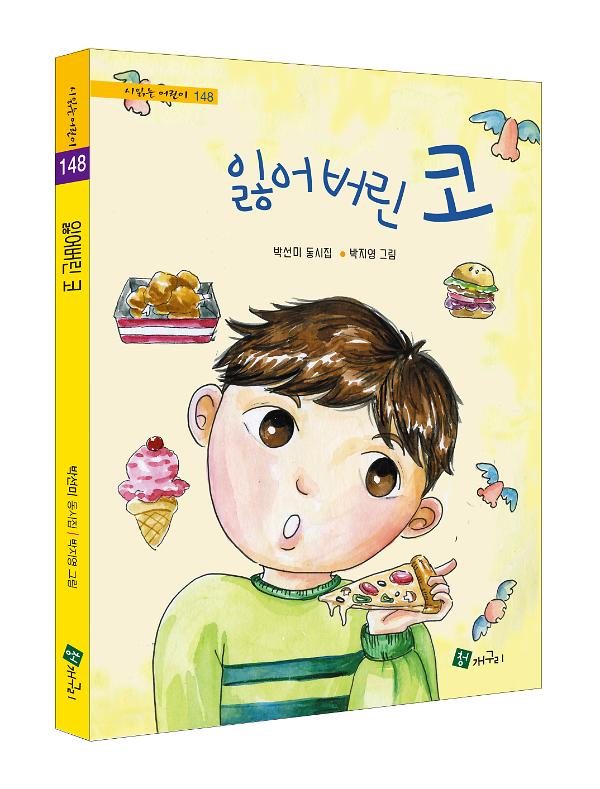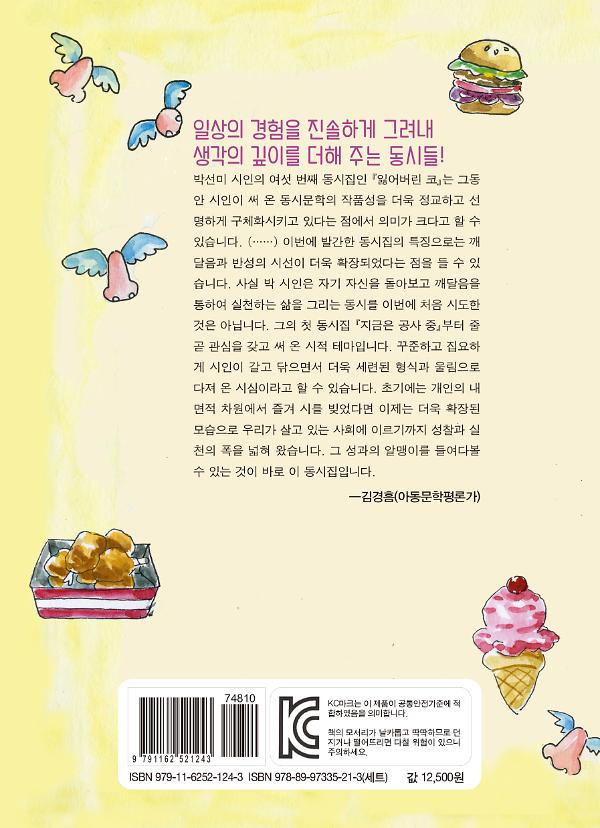일상의 경험을 진솔하게 노래한 동시!
마음을 다독여 주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 주는 동시집!
동심이 가득한 세계로 어린이들을 초대해 온 청개구리 출판사의 동시집 시리즈 〈시 읽는 어린이〉 148번째 동시집 『잃어버린 코』가 출간되었다. 이번 동시집은 부산아동문학인협회 회장이자 중견 동시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선미 시인의 신작 동시집이다. 박선미 시인은 그동안 동시집 『지금은 공사중』 『불법주차한 내 엉덩이』 『누워 있는 말』 『햄버거의 마법』 『먹구름도 환하게』를 펴냈고, 서덕출문학상, 이주홍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펴낸 동시집 『잃어버린 코』를 두고 김경흠 평론가는 “깨달음과 반성의 시선이 더욱 확장되고 더욱 세련된 형식과 울림으로 다져졌다”고 평하고 있다. 그동안 박선미 시인이 추구해온 동시 세계가 더욱 무르익고 한층 깊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동시집에서도 자연이나 사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거나 동심을 새로이 발견하는 시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더욱 현실에 밀착해 사유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데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나 환경 문제를 적극 반영한 시편들이 눈에 띄고, 가족에 대한 애정은 물론 어린 자아에 대한 성찰이 더욱 설득력 있고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자연생태계의 개화 시기 교란을 통해 환경 문제를 짚어본 동시가 눈에 띈다.
벚꽃이 피었다.
봄에 피었던 벚꽃이
가을에 또 피었다.
제 계절도 모른다고
흉보는 사람들에게
누구 탓이겠냐고
온몸으로
묻고 있다.
--「용기」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순리라 하겠다.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가 순리를 따르지 않고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기후와 자연생태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다. 대표적으로 코스모스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곤 했는데, 이 시에서는 벚꽃도 교란이 시작된 모양이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에 또 피었다.”고 한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상기시킬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은 ‘용기’이다. 제철도 모르고 피어난 꽃에게 무슨 용기라는 것일까. 4연에 보면 그 답이 있다. 바로 사람들에게 ‘누구탓이겠냐고 온몸으로 묻’기 위해 가을에 다시 피었다는 것이다. 용기를 내서 제철이 아닌 시기에 다시 피는 행위를 통해 인간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데서 이 시는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절묘하게 환기시킨다.
이외에도 이상기온 현상을 빗대어 생태계 교란을 암시하는 「빨리빨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다룬 「지구 수호자」, 코로나19로 생긴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코」 도 환경 문제에 대해 일침을 놓고 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
가장 환하고
가장 따뜻했던 방이
어둡고
칙칙한 방이 되었다.
할머니처럼
방도 앓고 있었다.
--「할머니 방」
이 동시에는 아픈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할머니가 건강했을 때는 방도 ‘가장 환하고 따뜻했’는데 할머니가 아프니 ‘어둡고 칙칙한 방’이 되었다고 말한다. 화자의 할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움, 쾌유를 비는 마음 등의 감정을 ‘할머니 방’에 이입해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마지막 연의 “할머니처럼/방도 앓고 있었다.”는 비유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적 완결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 짧지만 절제된 감정을 사물에 빗대어 시적 의미를 증폭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독자들에게 화자의 절절한 감정을 간단명료하면서도 강력하게 응축해 전달한다.
이 동시집에는 이처럼 가족애를 다룬 작품이 많이 있는데, 다들 감정선을 절약적으로 응축하면서 독자의 공감을 극대화시키곤 한다. 아픈 엄마를 위해 선행을 하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엄마에 대한 사랑과 쾌유를 염원하는 간절함을 그린 「복」, “우리 엄마/눈은 우는데/입은 웃는다.”라고 장애아에 대한 복합적인 심정을 절묘하고도 절실하게 그린 「아픈 웃음」도 깊은 여운을 주는 작품이다.
두루마리 휴지를
다 쓰고 나니
심지가 남았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지막까지
제 할 일 마친 심지
불쑥불쑥
흔들리는 내 마음에도
단단한 심지 하나
세웠네.
--「휴지심」
이 동시집에는 어린 화자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내용의 작품이 많다.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는 반성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에 이르게 한다. 「휴지심」에서 보듯이 시적 대상인 사물은 화자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힘없는 휴지를 단단히 지켜주는 게 휴지심이듯이 ‘불쑥불쑥 흔들리는’ 자신에게도 ‘단단한 심지’가 필요하다는 반성과 함께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한다. 이외에도 가지치기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욕심도 싹둑 잘라 나무처럼 ‘새봄에는 더욱 근사해’지겠다는 성찰을 하는 「가지치기」가 그렇고, 「혀의 경고」에서는 혓바늘이 돋아 말을 잘 못하는 상태를 말조심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박선미 동시의 시적 대상은 일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적절한 비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면서 독자들에게 뜻밖의 인식을 전해 준다. 사회적 문제이든 가족간의 사랑이든 친구간의 우정이든 간에 박선미의 동시는 어린 화자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겪는 일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들려준다.
이 동시집에 실린 동시들은 어린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과 함께 튼튼한 마음의 힘을 샘솟게 해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