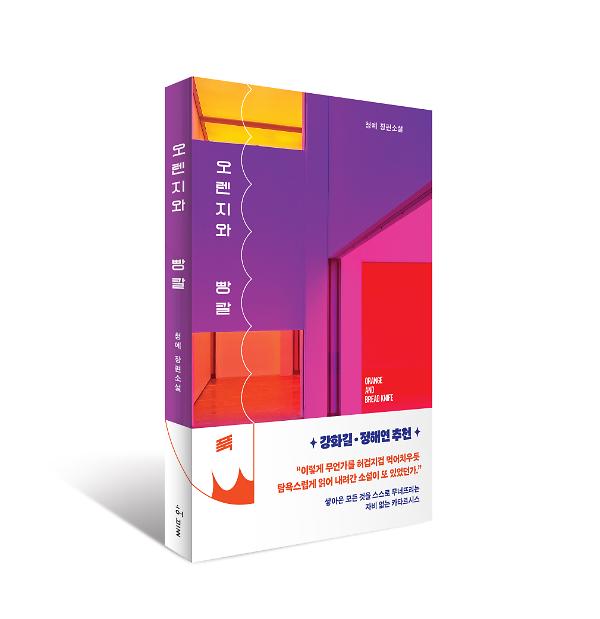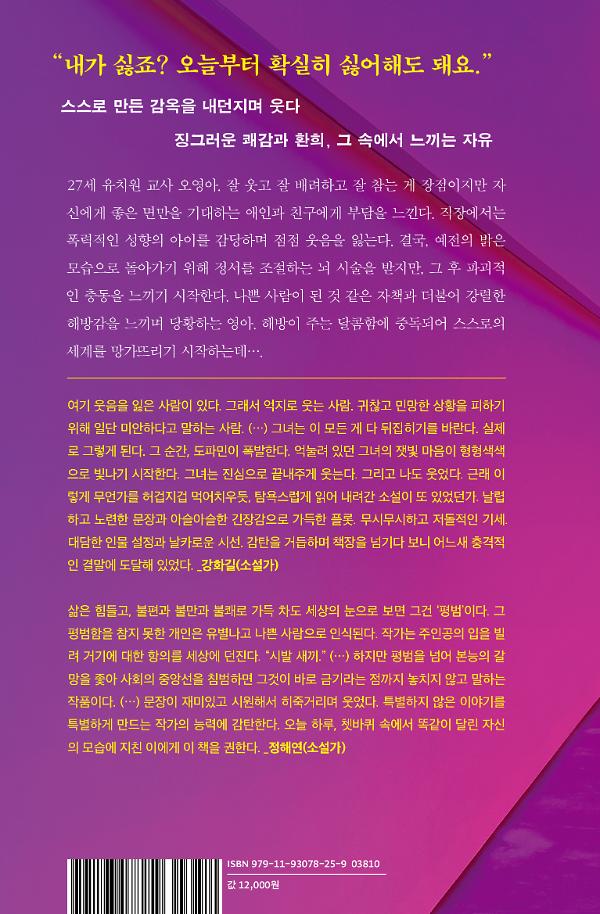웃음을 상실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_23쪽
“친구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만하라고 했지!”
나는 계속해서 지수를 꼭 끌어안은 채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체중을 잔뜩 실은 조그마한 발이 등에 내질러질 때마다 허리가 저렸다. 이 상황을 절대 인간 대 인간 사이의 일로 생각해선 안 됐다. 그랬다가는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며 여섯 살짜리 아이의 관자놀이에 주먹을 꽂아 넣을지도 몰랐다. 인간 대 ‘인간이 되기 작전의 어떤 것’으로 생각해야지만 견딜 수 있었다. 차라리 새끼 외계인 정도로 간주해야 어쩔 수 없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지.
비록 이것이 어른된 자의 오만하고 역겨운 생각일지라도, 어른 된 자이기 때문에 이딴 생각이라도 해서 참을 필요가 있었다.
_25~26쪽
빳빳하게 굳은 목들이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어린 걱정들이 무시무시한 빨간 펜으로 환생해 근무평가서 위에서 춤추는 상상을 했다. 선생님이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요, 선생님이 ‘나를’ 소외시켜요. 두려운 것은 아이들의 손질되지 않은 갸륵한 피해의식이 아니었다. 그 뒤에 존재하는, 어른들의 손질되지 못한 맹목적 믿음이 두려왔다.
“아니야. 선생님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_28쪽
우리는 미래를 위해 좀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선택을, 더 많은 고민을 품는 것이 진정한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하기에 절대 25마트 제품을 소비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대량 생산, 기계 생산, 환경 파괴, 불공정 수출입, 비위행 제조. 그 모든 딱지를 전부 달고 있음에도 25마트의 빵은 나루더의 무가당, 친환경, 비건 빵을 가뿐히 이겼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루터의 식빵은 9,500원이었으니까.
_41쪽
“왜 알면서도 그래?”
“미안해.”
내 사과를 듣자 은주가 웃어주었다. 그녀의 오렌지색 립글로스가 한층 채도 높게 반짝거렸다. 나는 저 오렌지빛 위에 피어난 기쁨을 볼 때만 그녀의 순수한 행복을 확인했다. (…)
그녀의 얼굴을 잘 살피면 안도감도 보였다. 이것에 내가 굳이 과오를 숨기지 않고 무시받길 자처하는 이유였다.
은주는 반성하는 나의 얼굴을 예뻐했다.
_53~54쪽
“조금만 생각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
대화를 멈추고 은주의 회초리 같은 사랑을 되새김질했다.
조금만 더. 나는 고개를 재차 끄덕였다.
조금만 더. 근데 얼마나 더?
_61쪽
어떻게든 악인이 되지 않는 방식만 선택하는 건 마음 안에 용수철을 꾹 눌러두고 손을 떼지 않는 일과 같았다.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튀지 않게끔 스스로를 절제하는 일. 그 결과로 지금의 나는 수원과 마주 보고 누워 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했다.
선량함을 고집하기 위해 지켜온 선택들이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순간, 미래에 남는 건 원하지 않던 삶이라는 모순.
_80~81쪽
그를 향한 마음이 우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밋밋한 정으로 퇴화했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다. 그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여자는 모두 못된 여자일 것이다. 착해빠진 이 남자를, 스스로를 꾸밀 시간에 연인에게 헌신만 하는 이 사내를 품을 줄 모르는 여자는 악당이리라.
나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미약한 온정에 사랑이라는 감투를 씌워왔다. (…)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었다.
자초?
고마워해야 하는 일이라니까, 제발. 오오영아. 제발!
_74~75쪽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킬 때는 주저하지 말고 숨을 쉬자. 타인을 실망시켰다는 절망이 목을 조여 오지 못하도록. 들이쉬고 내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내가 또 네 마음의 허리를 꺾었구나. 이 세상에 오와 열에 맞추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헌신하는 사람을 내가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잘못에 이름표를 붙여줘야 한다면, 오오영아라고 적어야만 했다.
그러니 나는 바뀌고 싶었다.
_19쪽
“사이코패스는 아무나 되는 줄 아나요?”
“남의 불행을 보고 웃는 게 이상하잖아요.”
“잘 살피세요. 그 웃음은 남의 불행을 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주는 건 나의 역할이 아니죠.”
_111쪽
세 번째 링크, 네 번째 링크. 모두 이름 없는 불행이 담겨 있었다.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한 명의 삶을 초월하지 못하는 다채로운 어둠들. 타인의 괴로운 삶을 관음하는 건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타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을 목도하는 쾌감이 일었다. 나쁜 것에는 갈고리가 있다. 평생을 선하게 살고자 애썼던 마음이 삽시간에 묶여 저 아래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카타르시스에 뇌가 절여졌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_107~108쪽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고 싶으면 하세요. 신고든 뭐든.”
발악하며 격분하는 모습을 보고 폭소가 나왔다. ‘거야’에 맞춰 동그랗게 벌어진 입을 향해 고춧가루를 뿌렸다. 300그램이라는 양은 미운 목소리를 내뿜는 입 동굴을 꽉 채우기에 넉넉했다.
“내가 싫죠? 오늘부터 확실히 싫어해도 돼요.”
“뭐?”
“애매한 건 별로잖아요.”
여자의 인중이 허술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_1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