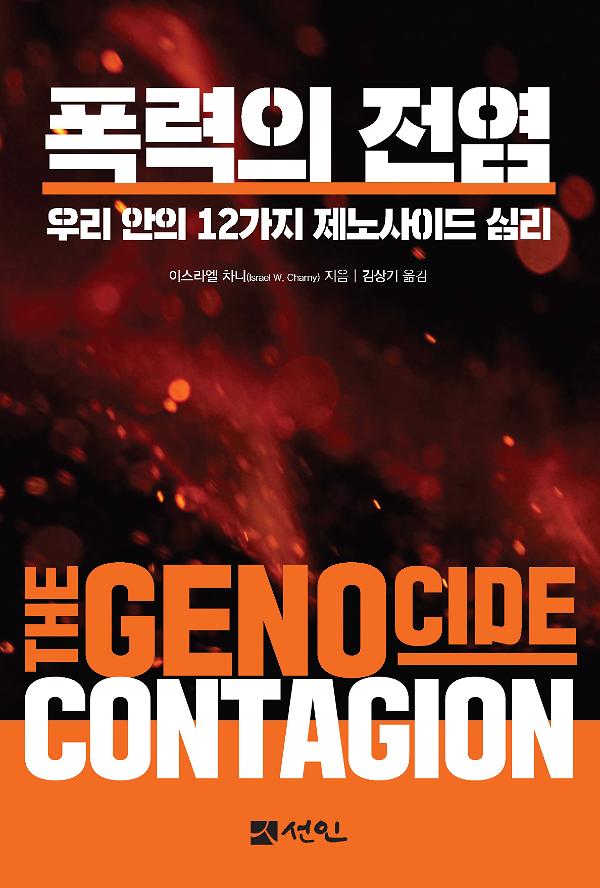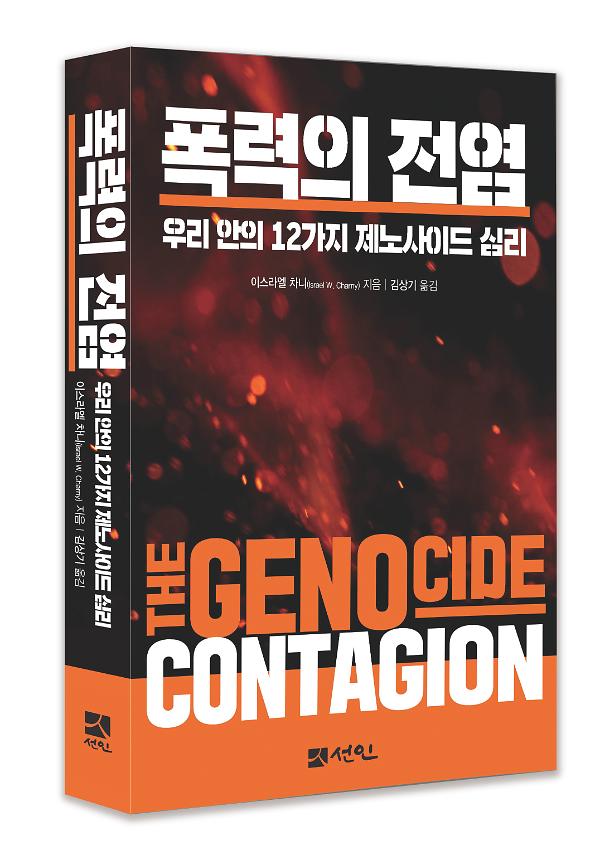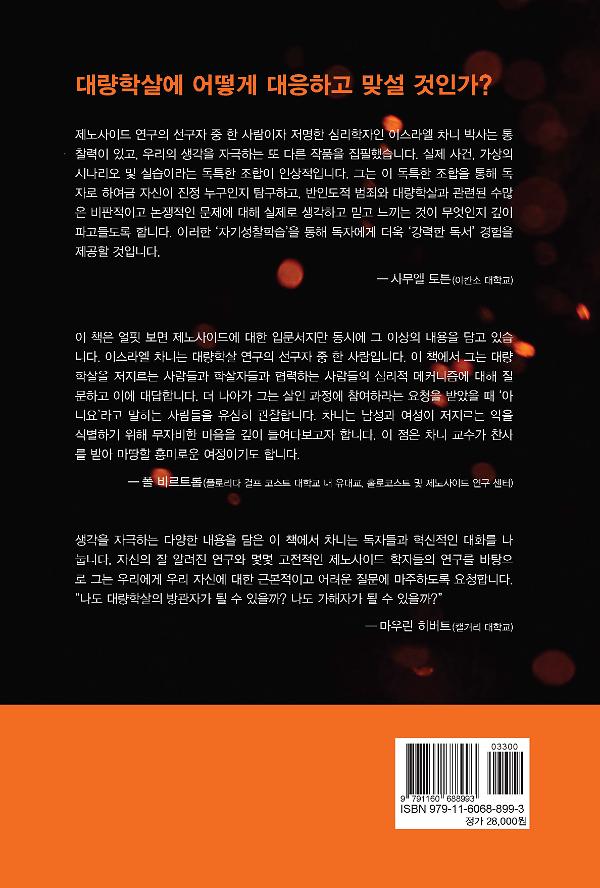대량학살에 어떻게 대응하고 맞설 것인가?
누구나 학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폭력의 12가지 심리적 기초를 해부한 생명윤리 교과서
제노사이드를 고려할 때, 우리는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악의 가해자로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책은 특히 암울한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 중 누가 제노사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이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제노사이드의 모든 경우에 결정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명령을 따랐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동의했거나, 살인자들과 협력했거나, 살인이 일어나도록 방관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책은 또한 명령을 거부하고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도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은 피해자나 박해받는 사람들의 국가적 경험보다는 주로 공격자, 희생자, 살인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제노사이드와 홀로코스트에 관한 다른 책들과 구별된다. 살인자 자신의 감정 심리학과 사고 과정을 밝히려고 시도한다. 가해자들은 끔찍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대량학살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징후가 거의 없었던 이전의 생애 동안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 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학대하거나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을 지시받고 주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의 사고와 정서적 경험의 중요한 측면을 탐구한다.
[이스라엘 차니, 머리말 中]
오늘날 ‘폭력’은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하며, 남의 이야기로 보인다. 왜냐하면 너무나 은밀하고 은폐된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대량학살, 이른바 제노사이드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사는 민주적이고 안정된 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폭력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고, 제노사이드가 남의 나라의 비극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대량학살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폭력의 본질적 속성, 폭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무디기 때문이 아닐까?
‘폭력’이란 관계의 언어이자, 권력의 문제다.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힘의 우위를 갖느냐의 문제다. 힘의 균형이 평화이며 윤리적 상태다. 그러나 힘의 균형이 깨지고 비대칭적 불균형 상태가 오면 필연적으로 폭력적 구조가 발생한다. 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와 수용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방적 힘의 작용에 의한 파괴적 결과”다.
그렇다면 폭력은 우리의 사회적 삶 속에서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책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60년 넘게 20세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대량학살의 폭력을 연구해 온 심리학자이자 제노사이드 권위자인 이스라엘 차니 교수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 가지 분야 학문의 층위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첫 번째는 제노사이드 ‘사회학’이다. 제노사이드 연구가로서 그는 20세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의 역사적 사실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 준다.
두 번째는 ‘심리학’이다. 역자가 느끼기에 이 부분은 이 책의 가장 큰 묘미라 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역사 속에 드러난 제노사이드 현상을 단순히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인간의 보편적 심리 속으로 끌어들여 인간 내면의 본성을 펼쳐 보인다. 마치 제노사이드라는 괴물을 눕혀 놓고, 그 속에서 작동했던 폭력의 심리학적 역학들을 하나씩 드러내는 해부학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해부 결과, 저자는 제노사이드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폭력의 보편 심리학”이라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세 번째는 ‘윤리학’이다. 오랜 기간 제노사이드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온 차니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윤리학자로서의 면모를 숨기지 않는다.
저자는 이 책이 단순히 제노사이드와 폭력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결과물로만 남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독자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용감한 저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제노사이드 사회학에서 출발하여 심리학을 거쳐 생명윤리학 교재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김상기, 옮긴이의 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