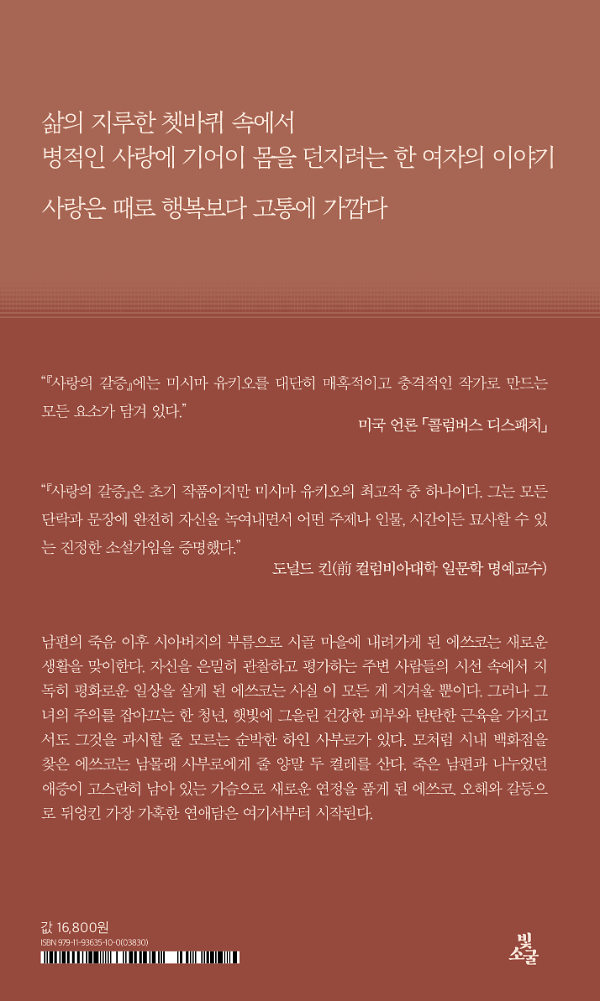“도쿄에서 나고 자라서 오사카라는 도시를 몰랐던 에쓰코는 일류 상인, 노숙자, 공장주, 주식 중개인, 거리의 창녀, 아편 밀수업자, 노동자, 몰락한 가문의 자제, 은행가, 공무원, 시의원, 무성 인형극의 변사, 첩, 인색한 여자, 그리고 신문기자, 기생, 구두닦이들로 가득한 이 도시에 이유 없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에쓰코가 무서워한 것은 도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삶이라는 이 무분별한, 잡다한 부유물로 가득한,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그러면서도 언제나 맑은 감청색을 띤 생활이라는 바다.” _8쪽
“에쓰코는 밝고 쾌활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눈앞의 불쾌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녀의 얼굴은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사람 같았고, 몸놀림도 어린 아가씨처럼 경쾌했다. 남편을 잃은 이 여자는 비로소 ‘인간’이 된 것이다.” _21쪽
“시골 생활에는 단순한 마음이 필요하다. (…) 나도 단순한 마음을 사랑한다. 단순한 몸에 깃든 단순한 영혼만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생각까지 한다. 그러나 이런 마음과 나의 솔직한 마음 사이의 깊은 괴리감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동전의 뒷면이 앞면에 닿으려는 노력만큼 힘든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구멍 없는 동전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것이다. 바로 자살이다.” _26쪽
“화장터까지 가는 동안 그녀가 생각한 것은 이제 질투도 죽음도 아니었다. 조금 전 자신을 덮친 수많은 빛만 생각했다. 상복 무릎 위에서 가을꽃을 고쳐 들었다. 국화가 있다. 싸리꽃이 있다. 도라지꽃이 있다. 밤샘의 피로에 지친 코스모스가 있다. 에쓰코는 무슨 꽃인지 모를 노란 꽃가루로 상복 무릎이 더러워지도록 내버려두었다.” _44쪽
“어쩌면 에쓰코는 물에 빠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걸 마셨을 뿐인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의 권한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마셔버려야 한다. 그게 바닷물일지라도……. ……그러나 그 후의 에쓰코에게도 익사하는 여자의 비통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녀 의 익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갈지도 모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자기 손으로 재갈을 물린 이 여자는.” _76쪽
“그건 개미집 안으로 끓는 물을 붓는 바람에 땅 위로 떠오른 수많은 개미들이었다. 뜨거운 물속에서 몸부림치는 무수한 개미들이었다. 그것을 여덟 살짜리 여자아이가 단발머리를 무릎 사이로 깊숙이 집어넣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다. 양 손바닥을 뺨에 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_78쪽
“나는 남편의 죽음으로 맛보았던 그 지독하도록 격렬한 자각을 다시 느끼고 싶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_94쪽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던 것에 배신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애써 무시했던 것에 배신당할 때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것은 등에 꽂힌 비수다.” _108쪽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찾아내는 능력은 어떤 의미에선 우리의 삶을 사람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삶은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발을 디딜 수도 없는 진공의 구슬이 되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인생의 저울을 속여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보이도록 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더라도 삶은 의복처럼 의식되지 않는 무게이다. 외투를 입는다고 어깨가 뻐근한 사람은 병자다. 내가 사람들보다 무거운 의상을 입어야 하는 것은 내 정신이 우연히 설국에서 태어나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내게 있어서 삶의 어려움은 나를 보호해 주는 갑옷에 불과하다.” _118-119쪽
“괜찮나요?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아직도 도움을 청하지 않을 건가요? 당신은 정신의 배를 너무 혹사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을 스스로 상실한 채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젠 육체의 힘으로만 바다를 헤엄쳐 나가야 합니다. 그때 당신 앞에 놓인 것은 죽음뿐일 거예요. 그래도 괜찮나요?” _178쪽
“물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배수구로 흘러내렸다. 피부에 닿는 공기와 물의 경계가 에쓰코의 살갗을 핥듯이, 간지럽히듯이, 어깨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조금씩 내려갔다. 이 섬세한 애무 뒤에 따끔따끔하게 속박하는 듯한 한기가 몸을 감쌌다. 그녀의 등은 이제 얼음처럼 차갑다. 물이 다소 급하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허리 부근으로 물러나고 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죽음이야.’” _188쪽
“매일 반복되는 현실이 아무리 무미건조하고 가혹해도, 손을 뻗어 페이지를 펼치기만 하면 그곳에 영원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확실히 일깨워 주었다. - 해설: 이시이 유카(소설가)” _2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