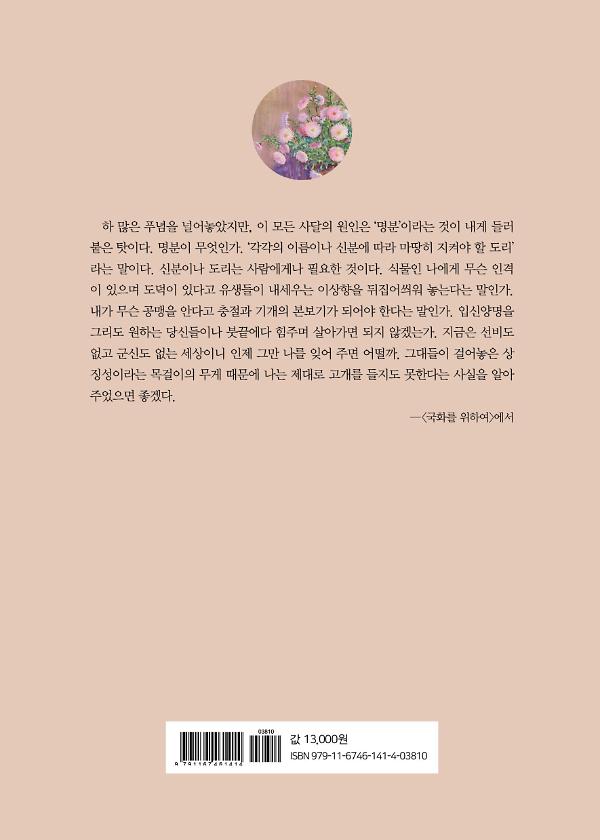마음이 머문 자리
장맛비가 잠깐 그치는가 하더니, 금산 마루가 다시 운무에 휩싸였다. 언덕 너머 보리암으로 향하는 숲길이 안개에 묻혀 아스라하다.
비에 젖어 나뒹굴고 있는 꽃송이가 눈에 밟힌다. 노각나무꽃이다. 누가 동백 사촌 아니랄까. 뚝, 송이째 떨어졌다. 너부러진 낙화 앞에 주저앉는다. 절간으로 향하던 걸음이어서일까. 문득 생과 사, 그 갈림이 화두처럼 마음에 내려앉는다. 죽음, 하나의 소멸은 또 다른 탄생을 의미하나니.
볼 것 천지, 먹을 것 천지, 즐길 것 천지인 보물섬 남해에까지 와서 뭉크러진 꽃 한 송이에 발길이 멈추었다. 갈 길 따위는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그렇게 특별하지도, 그리 귀하지도 않은 꽃 잔해를 붙들고 이리 길섶에 쪼그리고 앉은 이유.
마음이 머문 탓이다. 잠깐의 인연이지만.
-〈작가의 말〉 전문
하 많은 푸념을 널어놓았지만,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은 ‘명분’이라는 것이 내게 들러붙은 탓이다. 명분이 무엇인가.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말이다. 신분이나 도리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식물인 나에게 무슨 인격이 있으며 도덕이 있다고 유생들이 내세우는 이상향을 뒤집어씌워 놓는다는 말인가. 내가 무슨 공맹을 안다고 충절과 기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입신양명을 그리도 원하는 당신들이나 붓끝에다 힘주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선비도 없고 군신도 없는 세상이니 인제 그만 나를 잊어 주면 어떨까. 그대들이 걸어놓은 상징성이라는 목걸이의 무게 때문에 나는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국화를 위하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