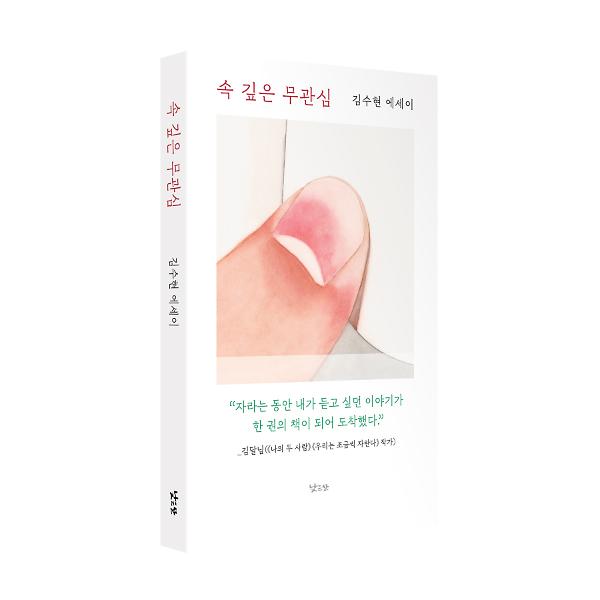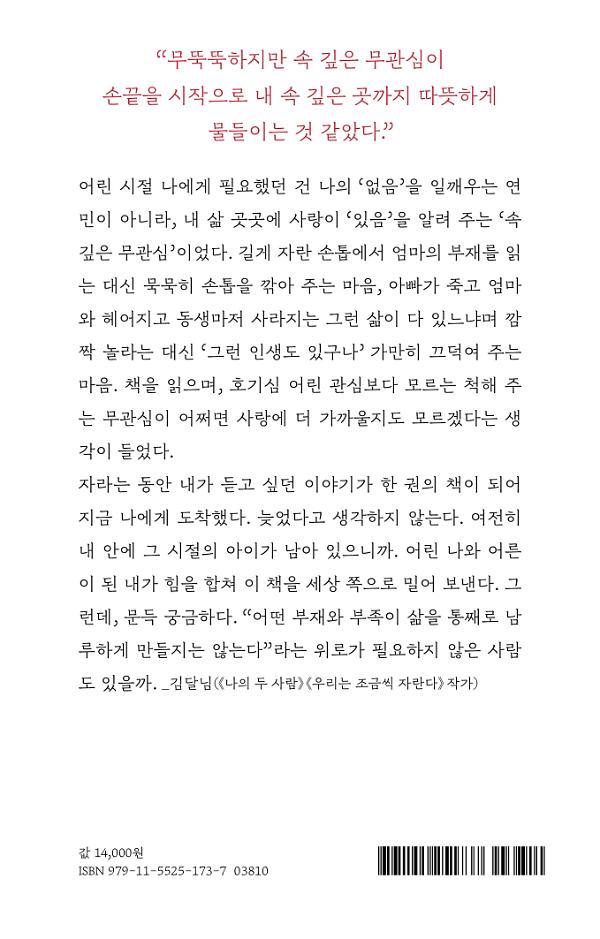“자라는 동안 내가 듣고 싶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되어 지금 나에게 도착했다.”
_《나의 두 사람》 김달님 작가 추천!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무관심이
손끝을 시작으로 내 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물들이는 것 같았다.“
‘불우’라는 닫힌 세계에 반짝이는 틈을 내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와 3년여 같이 살다가 여섯 살에 동생과 함께 할머니에게 맡겨진 뒤 일곱 살에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동생이 입양 가 온 가족과 헤어진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만 요약하면 ‘참 기구한 삶도 다 있다’ 싶을 테지만, 정작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자신의 ‘불우’를 연민하기보다 그 단어의 틈새에서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발견한다.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서 불우는 불행으로 쉽사리 미끄러지지만, 나는 ‘불우’라는 단어에서 처지가 딱한 사람 대신, 아직 닿지 못한 장소, 맺지 못한 관계, 오지 않은 시간을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다. 동트기 전 새벽의 푸른 적막을 고요히 바라보는 얼굴. 곧 떠오를 무지개를 기대하며 빗소리를 가만히 듣는 얼굴. 불우의 세계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 〈프롤로그〉에서
《속 깊은 무관심》은 김수현 작가의 첫 책으로, 엄마 없이 자란 그가 엄마가 되기까지 삶을 채워준 가만한 사랑에 관한 기록이다. ‘조손 가정에서 성장한 자신의 이야기로 첫 책을 낸 김달님 작가는 이 책의 한 대목을 가져와 추천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어떤 부재와 부족이 삶을 통째로 남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 살아가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구멍들 앞에서 막막해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구멍이 숭숭 뚫린 삶을 걸치고도 “따뜻하고 반짝이는” 장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작가의 나지막한 속삭임에 자연스레 몸이 기울 것이다.
사랑이란 어쩌면,
아는 척하는 관심보다 모르는 척해 주는 무관심
나이 육십이 훌쩍 넘은 할머니와 여섯 살 손녀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보살폈지만, 그들의 돌봄은 헐겁고 성겼다. “긴 손톱이나 뒤꿈치가 해진 양말, 때가 채 빠지지 않은 옷소매 같은 사소한 것들에서 엄마의 부재는 쉽게 티가 났다.” 눈이 침침한 할머니는 손톱을 깎아 줄 때면 살점을 같이 집곤 해 손녀는 ‘스메끼리’라는 말만 나와도 소스라치며 방으로 숨어 버리곤 했다. 날카로운 인상에 살갑지 않아 인기 없던 유치원 선생님은 어느 하루, 빈 교실에 어린 수현을 앉혀 놓고 대뜸 손을 잡아챈다. “손톱이 긴 이유를 다 아는 사람처럼” 말없이 손톱을 깎아 주던 선생님과의 짧은 시간을 묘사한 〈손톱 깎아 주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은 교실로 길게 흘러 들어오던 늦은 오후의 햇살처럼 은은한 여운을 남긴다. “내가 자라면서 스스로와 다른 이를 할퀴거나 상처 주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 단정한 손톱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대목에 이르면 어쩌면 사랑이란 아는 척하는 관심보다 모르는 척해 주는 무관심에 가까운 것 아닐까, 하는 산뜻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 책 1부에는 작가의 불운에 화들짝 놀라거나 지레 먼저 눈물을 쏟아 내거나 요란 떨지 않고 ‘속 깊은 무관심’으로 곁을 내주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그저 고갯짓으로 들어 주던 동네 언니, 무슨 일이냐고 캐묻는 대신 침묵으로 울음을 받아 주던 친구, 조카를 안쓰러워하기보다 끊임없이 웃을 일을 만들어 주던 고모, 난처한 질문 대신 달콤한 프림을 건네던 이웃 아주머니…… 덤덤한 반응이 오히려 슬픈 시간을 담담히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엄마가 된 작가가 자신의 아이가 “타인에게 놀라는 얼굴을 보여 주기보다 그저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사람. 호기심보다 이해가 앞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작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너는 너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무엇이 될 필요도,
무엇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도 없다고
책의 1부가 엄마 없는 유년을 채워 준 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2부에는 작가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깜짝 놀랄 때조차 뱉어 본 적 없는 ‘엄마’라는 단어에 자신의 서사를 입혀 가는 과정을 담았다, 아이를 키우는 자신과 자신을 떠난 엄마의 마음을 포개 보면서 그는 ‘엄마’라는 존재, ‘가족’이라는 개념에 입체적으로 살을 붙여 나간다. 가족’이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부모-자식으로 구성된”이라는 조건을 완고하게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흉내 내는 대신 그저 손녀에게, 조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었던 할머니와 고모, 고모부 덕분에 작가는 “더 넓고 유연한 가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부모-자식 관계 밖에서 자란 그가 엄마가 되었을 때 정작 깨달은 것은 “아이는 부모의 사랑으로만 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한 사람의 특성을 오로지 부모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들에게 김수현 작가는 살아오면서 자신이 받은 다양한 “사랑의 출처”를 보여 줌으로써 가족의 울타리를 넓히고자 한다.
10년 이상 알고 지내 온 이들에게 가정사를 고백했을 때, 그중 한 친구가 보낸 짤막한 메시지 하나가 작가에게 뜻밖의 해방감을 안겨 준다, ‘네가 누구의 자녀이고 어떻게 자랐는지가 무슨 상관이겠니. 너는 그냥 너인데.’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명명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그 자체로 귀하다는, 특별할 것 없는 작가의 말이 새삼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은 엄마 없는 딸로 출발한 이야기가 엄마 없는 엄마가 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누구의 무엇도 아닌 ‘김수현’이라는 한 사람으로 걸어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너는 그냥 너인데.
망망대해를 맴돌던 작은 배가 비로소 육지에 닿는 기분이었다. 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간절히 듣고 싶었던 호명은 이것이었구나. 너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너일 뿐이다. 어떻게 호명되더라도 혹은 호명되지 않더라도 너는 너인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무엇이 될 필요도, 무엇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도 없다고. 세상 한가운데서 어떤 색으로든 선명해지고 싶었던 내가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기분이었다.”
- 〈누구의 무엇도 아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