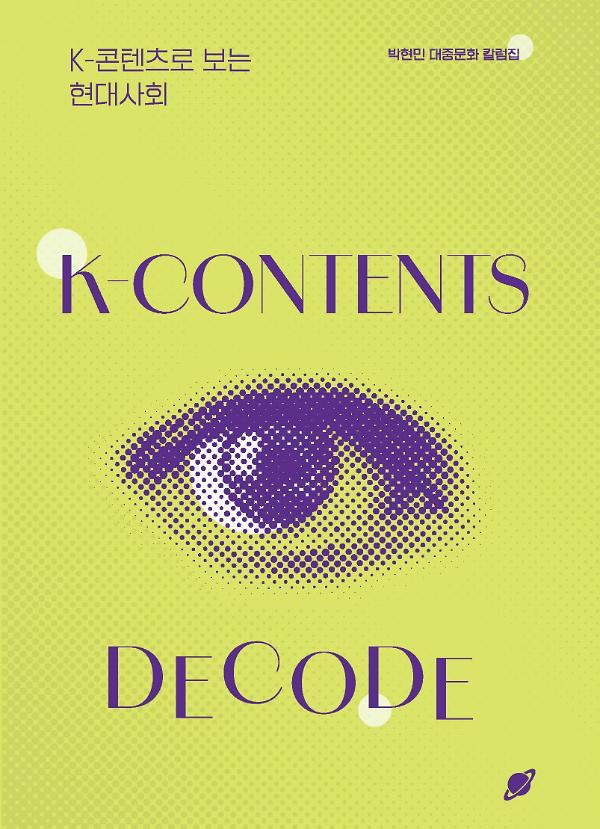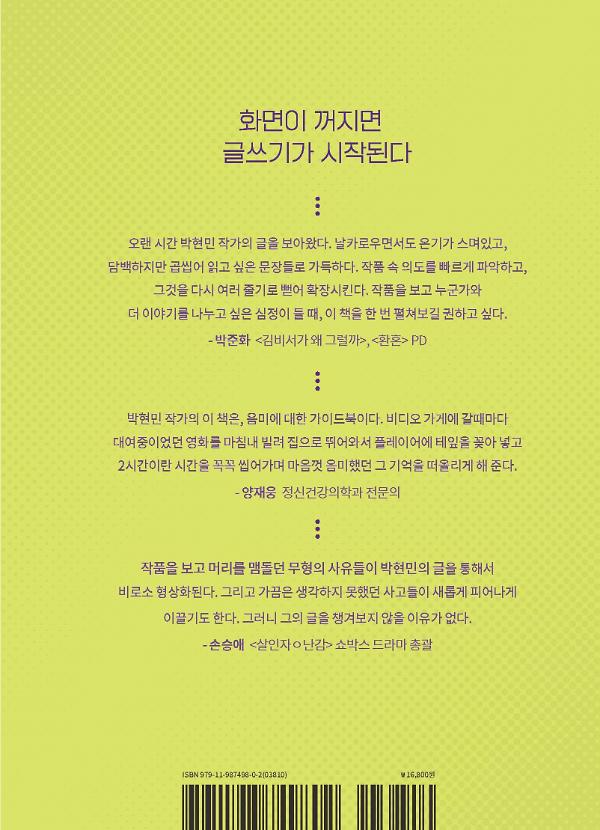…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탄생시키고, 프랑스 철학자인 들뢰즈가 확립한 '시뮬라크르' 개념도 포개진다.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자신의 저서 '시뮬라시옹'에서 가상의 이미지가 실체 자체를 대체하는 상황을 다뤘다.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 익숙한 이 개념은 〈욘더〉에서는 보다 적극적이다. '죽음'을 통해 '원본'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이미 소실됐기 때문. 그런 상황에서 원본의 기억을 탑재한 가상의 존재는, 원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이러한 근미래의 과학 기술에 대해, '욘더' 속 재현의 입장에서 주저하고 고민하게 된다.
-18페이지, 죽음에 대한 색다른 해석 〈욘더〉 중
여성에게 가혹한 사회 족쇄가 채워졌던 조선시대의 면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 부당함의 연속이다. 이는 우리가 확신하는 지금의 모든 사회 통념과 제도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확장된다. 본래부터 당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시대와 사회의 의도적 합의에 의해 인간들이 정의한 일들이 산발적으로 자리할 뿐이다.
-51페이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밤에 피는 꽃〉 중
요즘의 작품은 '돈'을 행복의 최우선 조건으로 설정한다. 돈이 적거나 없다는 것은 곧 인생이 불행함을 뜻하고, 많은 돈이 생긴다는 것은 언제든 행복으로 직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은 '불행'이 아닌 '불편함'이라는 말은,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오히려 불행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처럼 그려진다. 돈이 없어서 자발적 죽음을 택하는 가족이('금수저') 있고,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아이('작은 아씨들')도 있다. 그러니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돈은, 고스란히 '생존' 그 자체다.
-131페이지, 부모를 바꿔 부자가 된다 〈금수저〉 중
〈커넥트〉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로테스크하게 화면을 가득 채우는 선혈 낭자한 잔혹함이나,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초능력 따위가 아니다. 〈커넥트〉는 꾸준하게 '다름'과 '다름을 보는 타인의 시선'을 교묘하게 건드린다. 하동수는 인간은 결코 가지지 못할 자연 치유력을 지녔으나,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저 '괴물'에 불과하다. 건달도 형사도, 아이도 노인도 예외는 없다. 곧장 "괴물"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249페이지, ‘다름’을 ‘괴물’이라 부르는 사회에 대해 〈커넥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