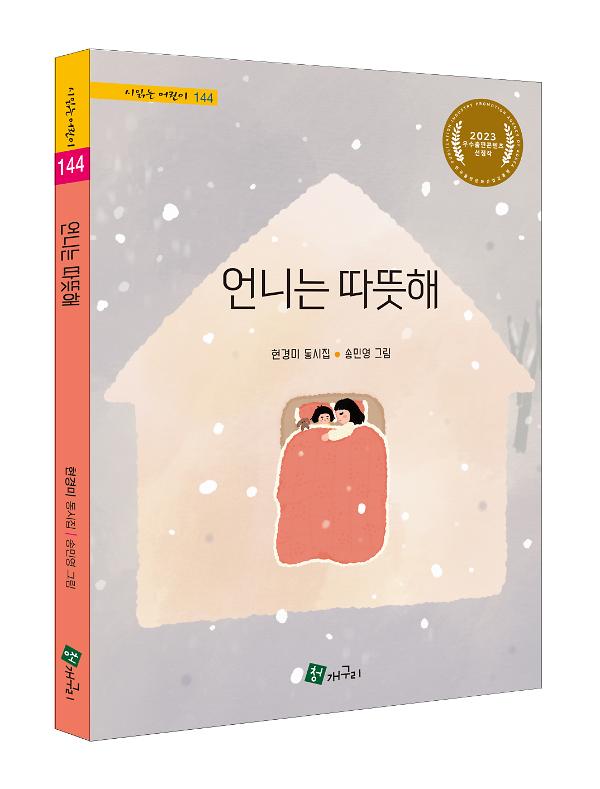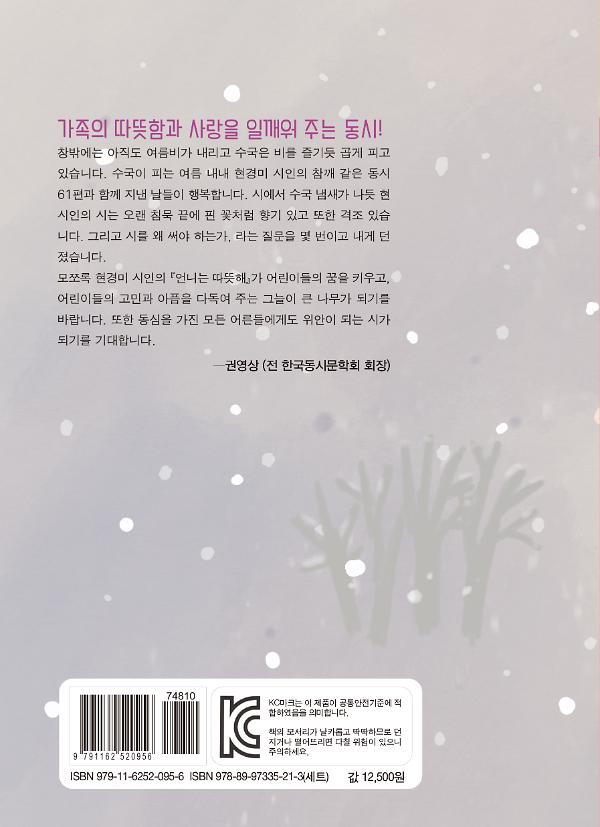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일깨워 주는 동시!
동심이 가득한 세계로 어린이들을 초대해 온 청개구리 출판사의 동시집 시리즈 〈시 읽는 어린이〉 144번째 동시집 『언니는 따뜻해』가 출간되었다. 200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래 16년 만에 처음 펴내는 현경미 시인의 동시집이다.
오랜 침묵만큼이나 여러 해 동안 남몰래 갈고 닦은 탓인지 전편이 고르게 수준 높은 시적 성취를 보여준다. 자연이나 일상 속에서 흔히 보거나 겪는 일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저마다의 특별한 의미를 탁월한 시적 혜안으로 포착해 들려주면서 삶을 관통하는 깊은 성찰을 느끼게 한다. 한참 무르익었다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시인의 진솔한 시세계가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고 편편마다 깊은 시적 감동을 준다.
현경미 시인의 동시를 읽으면서 가장 공감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 일상의 건강함이다. 물론 요즘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다는 건 잘 안다. 「방학이 뭐 이래」에 나오듯이 어학연수니 학원이니 해서 어른 못지않게 바쁜 일상을 보낸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잠시 얼굴 보기조차 쉽지 않다. 더구나 공부에 지치고 성적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보니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경미 동시의 화자들은 일상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중압감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있다. “성적표 든 가방이/무거워/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길”에도 벚꽃잎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팔랑팔랑/박수치며 달려”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받지 못한 박수/한꺼번에 받는다”고 할 정도로 자기 위안적이다(「박수 받는 날」). 이 아이들은 「축구공」에서 “고민도 짜증도/공 속에 불어넣어//뻥~차”버릴 정도로 건강한 내면을 보여준다. 다음 시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너랑 나랑
떡볶이를 먹다가
국물이 옷에 튀었어
갑자기 풉
입안에 있던 떡이 튀었어
침도 튀고
웃음이 튀기 시작했어
깔깔 넘어 가다가
배를 잡고 까르르륵
자려는데 아직
웃음이 살아 있어
히죽히죽
킥킥
키득키득
--「오늘 쉼표」
떡볶이를 먹다가 “국물이 옷에 튀었”다. 이럴 경우 보통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두 아이는 이 상황이 오히려 재미있다. 어쩌면 이 사소한 순간을 작은 일탈의 기회로 삼는 건지도 모른다. 여기서 “튄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면 아이들의 심리를 더욱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 ‘국물이 튄다→떡이 튄다→침이 튄다→웃음이 튄다’라는 연속성 속에 억눌린 일상에서 벗어나 탈출하려는 아이들의 심리적 쾌감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상의 한 단면이 아이들에게는 이처럼 큰 웃음을 주기도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히죽거릴 정도로 건강한 에너지로 다가오는 것이다. 곧, “오늘 하루의 쉼표”로 전환시키는 아이들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일상의 전환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라서 가능한지도 모른다. 별거 아닌 일도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좀더 특별해지고 자꾸 웃음이 나고 재미있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목이 된 “오늘 쉼표”는 바쁘고 힘겨운 학업 중에 잠시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사유의 긍정성과 건강함은 사물을 대하거나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동시집이 지니고 있는 지배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가족을 소재로 한 여러 편의 시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널따란 토란잎 위에서
물방울이 잔다
살랑바람에
토란잎이 흔들릴 때마다
깰 듯 깰 듯
잠자는 얼굴이
금방 세수한 것처럼
말갛다
엄마 품인 줄 알고
잘도 잔다
--「잠자는 물방울」
커다란 토란 잎 위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그린 동시다. 정원이나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인은 평범한 일상의 자연 풍경을 매우 서정적이고도 섬세하게 그려놓았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아니면 짧은 영상을 보는 듯 아주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엄마 품인 줄 알고/잘도 잔다”라고 하였다. 토란잎 위의 물방울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로 치환함으로써 공감력을 극대화시킨다. 곧 어린 독자들은 물방울에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과거 어느 날 엄마 품에 안겨 잠들던 따뜻함을 환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인은 사소한 자연 풍경을 내면으로 들여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다시 내놓는다. 독자들로서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되는 순간이다.
어쩌다 할머니 오신 날
뒹굴뒹굴 아빠도 게임하던 동생도 방문 걸어 잠근 언니도
총, 총, 총 걸어 나와
꽃잎처럼 밥상에 둘러앉는다
어쩌다 한 번
우리집에 피어나는
어쩌다 꽃!
--「어쩌다 꽃!」
위의 시는 가족들 간의 치유의 순간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가족들은 ‘뒹굴뒹굴 아빠, 게임하던 동생, 방문 걸어 잠근 언니’처럼 한 공간에 머물면서도 각자의 관심사에 빠져 단절된 가족의 모습을 보인다. 평소 어느 집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 게 의미심장하다. 이혼 가정인지도, 아니면 엄마가 아프거나 여읜 가정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유독 냉랭하고 허전한 분위기의 가정이다. “어쩌다”가 주는 뉘앙스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 가족들이 “할머니 오신 날”이 되면 전혀 딴판이 된다. “총, 총, 총 걸어 나와” 꽃잎처럼 둥근 밥상에 둘러앉는다. 그제야 비로소 가족답게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는 ‘식구’로 피어난다. 그래서 “어쩌다 꽃!”이라는 것이지만 이처럼 요즘 가족들의 단절과 고립을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라 하겠다.
어찌 보면 요즘 현실의 어두운 면을 담은 내용이지만, ‘어쩌다’일지라도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극복해 가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담고 있어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표제작 「언니는 따뜻해」를 더욱 주목하게 된다. ‘언니와 나’는 참외나 수박의 겉과 속처럼 다르지만,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짜증 부리”는 분란도 겪겠지만 한겨울 추운 이불 속에서 “꼭 껴안고 있”는 언니의 따뜻함을 새삼 느끼면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새로이 깨닫게 된다.
한마디로 이 동시집은 사소한 것들에서 찾아낸 건강한 웃음과 따뜻한 정감으로 무미건조하고 답답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다. 화자들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가 어린 독자들에게도 가닿아 새로운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