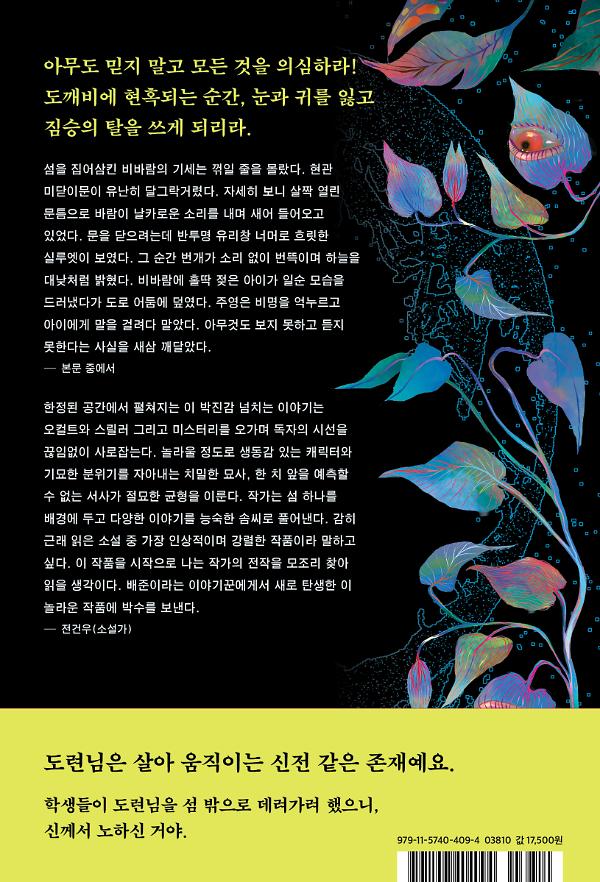눈과 귀가 먼 아이를 둘러싼 두 개의 믿음,
신을 향한 인간의 맹신과 불신이 불러온 재앙
주인공 ‘주영’은 대학 친구인 ‘수현’과 ‘한아’, ‘은솔’과 요트 여행을 즐기던 중 ‘은솔’의 멀미가 심해져 남해의 어느 외딴섬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한다. ‘주영’은 평소보다 심한 뱃멀미에 시달리는 ‘은솔’에게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낀다. ‘주영’ 일행의 요트를 제외하면 고깃배 두 척이 정박해 있는 작은 섬은 외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듯 보였으나, “키가 작은 활엽수와 여름풀로 뒤덮인” 푸르고 포근한 풍경에 안도한다. 그때, 그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무언가를 보고 제자리에 우뚝 선다. 열 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조그만 남자아이가 아지랑이에 반쯤 녹아든 채 걸어오고 있었다. ‘주영’은 미묘한 위화감을 풍기는 아이와 시간이 지날수록 낯빛이 창백해지는 ‘은솔’을 번갈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다. ‘주영’은 그들과 거리가 완전히 좁혀졌는데도 걸음을 멈추기는커녕 뛰다시피 돌진해오는 아이에 일순 몸이 굳는다.
정확히 ‘주영’ 일행의 한가운데에 멈춰 선 아이는 아무리 인사를 건네거나 말을 걸어도 미동이 없었다. 아이를 이리저리 살피던 ‘한아’가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아, 청각장애인인가 보다.” 그녀는 양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내밀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라는 것쯤은 어렴풋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한아’를 쳐다보지 않고 여전히 입을 꾹 다물 뿐이었다. “이 아이, 아무래도 시청각장애인인 것 같은데?” ‘주영’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이 아이가 정확히 그들을 향해 뛰어오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 순간, ‘수현’이 손에 쥔 과자 봉지의 뒷면을 다급히 펼치며 ‘실종 아동란’ 아래 사진을 가리켰다. 실종 아동과 눈앞의 아이는 너무나 닮아 있었다. ‘수현’은 아이의 손바닥을 잡아끌더니 그 위로 글자를 써내려갔고, 얼마간의 필담을 주고받았다.
“지금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모’들이랑 ‘이모부’들인데, 다들 이 아이를 지칭할 땐…… ‘도련님’이라고 부른대. 실종 아동이 맞아. 우리가 데리고 나가자.” 하지만 ‘한아’는 ‘수현’의 등 뒤를 바라보며 이미 늦었다고 대답했다. 아이의 ‘이모’인 듯한 중년 여성들이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동시에 ‘은솔’이 헛구역질을 하더니 방파제 쪽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속에 있는 모든 걸 쏟아냈다. 그녀는 몸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주영’에게 물었다.
“못 느꼈어? 저 아이,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깊은 어둠이 섬에 그늘을 드리웠다. 재앙이 들이닥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비바람이 거센 풍랑을 일으켰으며, 한 차례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거대한 태풍이 섬을 집어삼켰다. ‘주영’ 일행이 절대 섬 밖으로 나갈 수 없으리라는, 저주 같았다.
도깨비의 것을 탐내는 외지인들과
도깨비의 것을 지키려는 섬사람들의 숨 막히는 대립
아이가 실종 아동이 아니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 ‘수현’과 ‘주영’은 결국 아이를 데리고 몰래 섬 밖으로 나가려 한다. 그러나 어디선가 물귀신처럼 나타난 섬사람들에 의해 가로막히고, 그대로 ‘주영’ 일행은 연행되어 마을회관으로 들어간다.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는 죄책감에 ‘주영’은 고개를 조아리며 어떤 벌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외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쪽은 섬사람들이었다.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화를 삭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화를 내기 전에 너무 궁금한 거야. 멀쩡하게 생긴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막돼먹은 일을 벌인 거야?” ‘수현’은 대답 대신 ‘실종 아동란’이 적힌 과자 봉지를 내밀었다. 그녀는 아이를 처음부터 데리고 있었다는 섬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어투로 그들을 자극하는 말을 내뱉었다. 그 옆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온몸을 떠는 ‘은솔’이 수현을 말렸으나, 그녀가 계속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자 ‘은솔’이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쳤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자극하지 말라고…….” 울먹이다시피 ‘수현’을 말리는 ‘은솔’을 보고, ‘주영’은 직감했다. 아니, 확신했다. 일이 단단히 꼬였다는 것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태풍이 멎을 때까지 마을회관에 머물게 된 ‘주영’은 귓속을 찢어발기는 천둥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리고 “번개가 소리 없이 번뜩이며 하늘을 대낮처럼” 밝힌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한다. 귀신에 홀린 듯 혼이 나간 ‘은솔’이 짐승의 소리를 내며 ‘수현’ 위에 올라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섬사람들이 ‘은솔’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힘은 가히 대단했다. 불안한 예감을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 ‘귀신’을 보는 ‘은솔’이 정말 무언가에 빙의된 듯 ‘수현’을 죽이려 한 이 사건은, 앞으로 ‘주영’ 일행에게 펼쳐질 미스터리하고 기이한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주영’ 일행 앞에 잘 차려진 음식이 놓이자마자 독실한 크리스천인 ‘한아’는 식전 기도를 올리지도 않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댔다. 다섯 공기째 먹는 ‘한아’의 걸신들린 듯한 모습에 불쾌해진 ‘수현’이 핀잔을 주자, ‘한아’는 일순 정색하더니 말했다. “왜, 먹는 거 가지고 지랄이야.” 지금껏 알던 ‘한아’와 전혀 다르게 돌변한 모습에 셋이 당황해 멈칫거리는 사이, 갑자기 ‘한아’가 화장실로 달려가더니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영’은 또 다른 소란에 잠에서 깨고, ‘한아’에게 심하게 구타당하는 ‘수현’을 목격한다. 어젯밤에 이어서 오로지 ‘수현’만을 노리는 무언가와 이유 모르게 죽어나가는 짐승이 늘어나자 마을 이장은 ‘주영’과 ‘수현’을 어느 저택으로 초대한다. ‘도련님’이라 불리는 아이가 사는, 웅장하고 을씨년스러운 그 저택으로.
“우린 무당이에요. 이 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도련님은 이 섬에서 모시는 도깨비를 받들기 위한 신체神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신전 같은 존재예요.”
‘주영’은 그제야 여태껏 벌어졌던 일들이 하나씩 이해되었다. ‘수현’도 더는 반발하지 않고 순순히 이장의 말에 순응했다. 마을회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영’은 아이를 건들지 않겠다는 ‘수현’의 말을 떠올리며 물었다. “아까 한 약속, 진심이지? 이제 아이 포기하는 거지?” 수현은 코웃음을 치며 단번에 답했다. “아니.” 어떤 말을 하든 ‘수현’을 말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들은 함께 저택에 몰래 들어갔고 잠에서 깬 섬사람 두 명을 마주친다. 소식을 듣고 저택으로 몰려온 섬사람들은 집 안에 낭자한 핏자국과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섬사람들 그리고 아이를 인질 삼아 칼을 들이밀며 악을 쓰는 ‘수현’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최선을 다했다는 듯,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듯 이장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그간 소홀했나 봐……. 그러니 이런 망조가 들지.
만약 학생이 직접 도깨비에 씌면, 그땐 믿어줄래?”
차갑게 식어버린 얼굴로, 이장은 알 수 없는 미소를 띠었다. 그리고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는 새벽, 죽은 팽나무가 놓인 신의 제단 앞에서 도깨비를 부르는 굿이 시작되었다. 과연, 그들은 노한 도깨비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잊지 마. 죽을 수도 있어.
도깨비를 거스른다는 건 그런 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