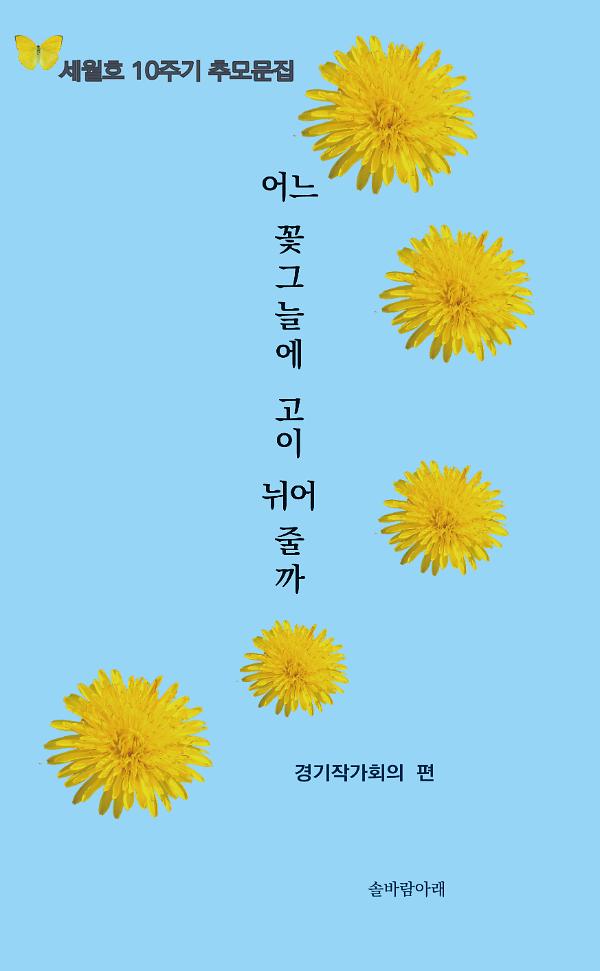손바닥선인장처럼
김 문
어느덧 십 년, 얼굴에 바람 때가 까맣게 앉은 남자
세월호 참사 바람의 세월이었다고
자식을 도둑맞고 온몸은 텅 빈 호루라기가 되었다
어떤 절규 어떤 물음도 짐승의 포효에 그쳤으므로
공중을 떠도는 풍선처럼 바람에 의탁했다
그날 2014년 4월 15일,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잠도 안 자고 카톡하고 통화하고 신이 난 고2들
풋사과 구르는 소리가 집안을 소란케도 했지
인천항에서 저녁 6시 출항할 배가 안개로 인해
밤 9시가 되어서야 배는 떠났지
갑판에다 여객실 증축하여 정원초과한 배
1,2층 화물칸 차량 180대로 30대 초과한 배
화물 675톤 적량에 1,157톤 적재한 배
배의 무개 줄이려고 평형수 뺀 배
가라앉는 배 안에서 당황하고 참담했을 나의 고2들
다다를 곳 없는 물의 계단이 네 몸을 오르고 또 오를 때
눈 속까지 차오르는 짠물에 숨 막히고 두려운 순간들
생의 끄트머리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체념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너희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온다
지난겨울 예식장 옥상정원에서 봤지 여기저기
화분마다 데친 야채처럼 누워있는 손바닥선인장들
애고 얼어 죽었네 했더니, 봄이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천년을 산다고 천년초라고 한단다
한겨울은 죽은 몸처럼 누웠다가
봄이면 살아나는 손바닥선인장 노란 꽃 핀다
끝내 돌아오지 않은 다섯 명의 고2들아
어디서든지 손바닥선인장처럼 천만년 살거라
섭리란 원래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것
어느 세상에서든지 천년초처럼 오래오래 살거라
아비가 간다
슬픔의 나이테를 온몸에 둘둘 감고
바람을 가르고 비를 맞고 눈을 헤치며 간다
너를 응시하고 너를 읽고 너를 쓰며 간다
네가 기억하는 길이란 길을 다 걸어간다
너를 만나는 그곳에서 어미고 아비다
어느 황량한 벌판이어도 좋고 그늘 하나 없는
막막한 사막이면 어떠랴
생이 온통 고름으로 범벅된 물음표인 것을
물속의 꽃봉오리
김 송 포
꽃은 입을 다물었다
침묵하였다
꽃을 밟았다
환하게 피우려다 꿈틀하던
비운의 꽃인가요 저격인가요
그랬다 저항하지 않던 입은 싸우려 하지 않았다 울음을 터트렸을 때 이미 늦었다는 통한에 칼을 들었을 것이다
어쩔 줄 모르고 침몰당한 함성
굳게 입을 다문 모란이 얼마나 겹겹이 포개어 토했을까요
지나가던 여우도 사슴도 고양이도 꽃 앞에서 모른 척 지나가더니
몸을 틀어 소리 지른 비명은 물방울에 갇혀 거품만 올라오고
노란 리본
서 덕 석
출근길 열차에서
책가방에 달린 노란 리본을 본다
무겁지, 여기 내 무릎 위에 놓으렴
웃으며 괜찮다고 사양하는 것을
냉큼 끌어당겨 안는다
10년 전의 세월호를 아직도 잊지 않고
때 묻은 리본으로 기억해 주는
또래들의 고운 마음이
책가방의 무게로 전해지면서
맹골수도에서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거꾸로 돌리는 필름처럼 물 위로 떠올랐다
아무것도 해 줄 길이 없어
그저 눈물짓고 서명하며 노란 리본을 달고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으며
잊지 않고 진실을 건져 올리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던 그때로 돌아가 본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또 다른 참사를 되풀이하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팔자도 참…
한숨을 내쉬는데 덜컹거리며 열차가 선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아이에게 가방을 건너 주며
손목에 찬 노란 팔찌를 슬쩍 보여준다
잘 가렴, 기억해 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