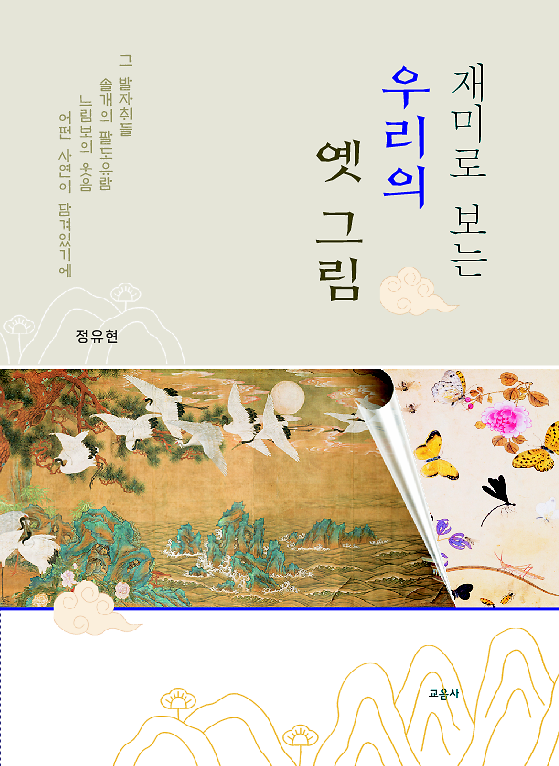묵향(墨香)으로 번진 매화
TV 속에서 남쪽지역의 매화들이 활짝 웃고 있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매화를 보러 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매화 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산청의 삼매(三梅)와 전라도 선암사의 고매(古梅)를 빼놓을 수 없듯, 매화를 사랑했던 시인이 떠오른다. 그는 잠깐 피고 지는 매화를 보기 위해 눈 덮인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고 한다. 요즘이야 묘목 재배가 발달되어 봄이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매화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추위를 아랑곳 않고 험한 설산(雪山)으로 찾아 들어간 걸 보면, 귀한 꽃임에는 틀림없었나 보다.
시인 맹호연(孟浩然)은 본래 후베이성 샹양현(湖北省襄陽縣) 출생이었다. 녹문산에 살다가 40세에 고향을 잠시 떠나 장안에서 머무는 동안 당대에 유명했던 왕유와 왕창령 등 여러 시인과 교유하였다고 한다. 이백과 두보처럼 그도 역시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주옥같은 시를 남긴 인물이다. 후대 문인들은 매년 맹호연과 관련된 시를 짓고 읊는 풍습이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의 고결함을 기리는 작품은 시뿐 아니라, 그림까지 쏟아져 나와 더욱 유명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다.
조선의 묵객들도 마찬가지였다. 겨울 소재 중에 설중매(雪中梅)에 대한 작품을 앞다투어 다작을 내놓았다. 진경산수화를 잘 그렸던 유명한 작가 정선 역시 「금강산도」처럼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맹호연과 관련된 작품을 여러 점 남겼다. 그중에서 「파교설후도」를 선정해서 소개하려는 것은 다른 작품과 좀 색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다.
겸재 정선(謙齋 鄭敾) 「파교설후도(灞橋雪後圖)」 이홍근 기증. 지본수묵 52.2 x 35.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작품은 「파교심매도」라고 부른다. 화면 왼쪽 위에 적힌 ‘눈 온 뒤 파교에서’라는 화제를 통해 앞서 언급했듯 중국 당나라 시인 맹호연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속의 주인공이 파교를 건너는 장면이다. 파교는 지금의 중국 산시성 그러니까 당나라 수도 장안(長安) 동쪽에 있는 파수에 설치된 다리의 이름이다. 누구를 전송할 때, 장안 사람들은 이 다리까지 나와서 버들가지를 꺾어주며 송별했다는 설과 함께 주변 경관 또한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 그림은 채색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먹으로 시작하여 먹으로 마무리한 작품이다. 보통 크기의 서예 붓질로 휙휙 옆으로 긋고, 내려긋자 새하얀 설산과 다리가 되고, 묵의 농담(濃淡) 붓질 몇 번에 의해 선비의 흰 두루마기(白描)가 되고, 나귀의 검은(沒骨)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추위 속에 명시를 품고 기대에 부푼 듯 앞만 보고 가는 주인공과 주변 경관이 잘 조합된 그림이다. ‘쓰윽 쓱싹 쓱싹 쓱쓱’ 눈 덮인 세상을 만들어 나귀 탄 선비의 모습까지 단숨에 끝낸 후, 좌측 상단에 행서체로 ‘파교설후, 겸재’라고 써 놓았다. 참으로 그리기 쉬운 그림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도의 필력이 아니면, 쉽사리 나올 수 없는 능수능란한 솜씨란다.
지금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위태로워 보인다. 나귀가 내딛는 발밑은 푹 꺼질 것 같고, 그 앞은 미끄러운 언덕길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오른쪽의 기이한 바위 절벽 배치 역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왼쪽은 날카로운 부벽준(斧劈皴)으로 쓱쓱 그어댄 각진 산봉우리로 이어진 비듬한 산자락에 적벽이 살짝 걸쳐 있는 듯 다소 불안정한 느낌이다. 잔뜩 찌푸린 하늘마저 분위기를 조화롭게 잘 드러낸 산수화다.
화면 속을 보면, 나귀 한 마리와 함께 먼 길을 떠나는 선비 즉, 맹호연뿐이다. 그동안 중국을 비롯해 수많은 작가들이 전후(前後)로 그려왔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작품이다. 얼핏 대하면 맹호연의 도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눈여겨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전자는 대부분 인적 없는 설원에서 시공의 흐름 속에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한 듯 쓸쓸한 느낌이었다. 그와 함께한 시동 2명 역시 선비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담아냈다. 후자는 대부분 눈 속의 찬바람을 맞으며 선비가 걸어가는 모습과 나귀에 앉아 산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1명의 시동은 부실한 입성으로 그 뒤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눈에 젖은 언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리는 시동을 담아냈다.
여기서는 시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동반했던 시동들은 유형에서 사라지고, 매화를 찾아 다리를 건너가는 선비 뒷모습만 묘사했다. 이는 자칫 신분 격차로 거부감을 느낄세라 감상자의 마음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위 속에 동동거리며,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작가는 시동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이다. 작가의 여유로운 붓놀림은 그의 인격까지 엿보여 이색적으로 보인다.
매화는 이른봄 눈 속의 전령이다.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강인함과 경이로움 그 자체가 문인 사대부들에게 매료되었던 꽃이다. 설중매에 고고한 품성을 지닌 은둔 처사의 사연이 가미되자 수많은 묵객들에게 아름다운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고결함을 기리는 매화가 사군자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맹호연의 매화 사랑이 한몫을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