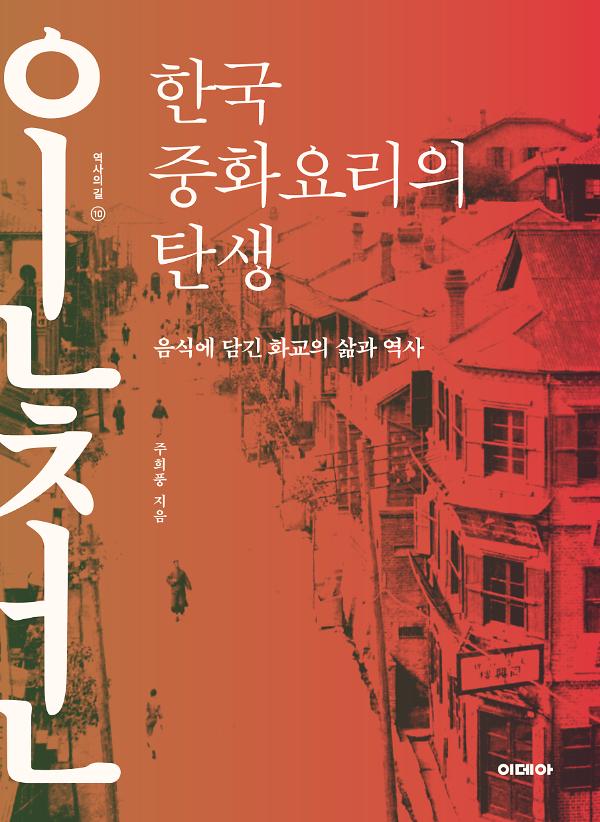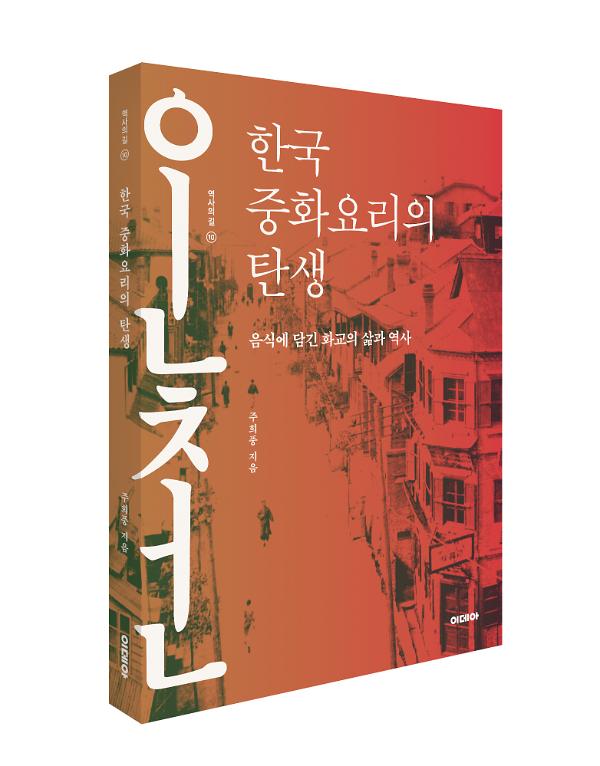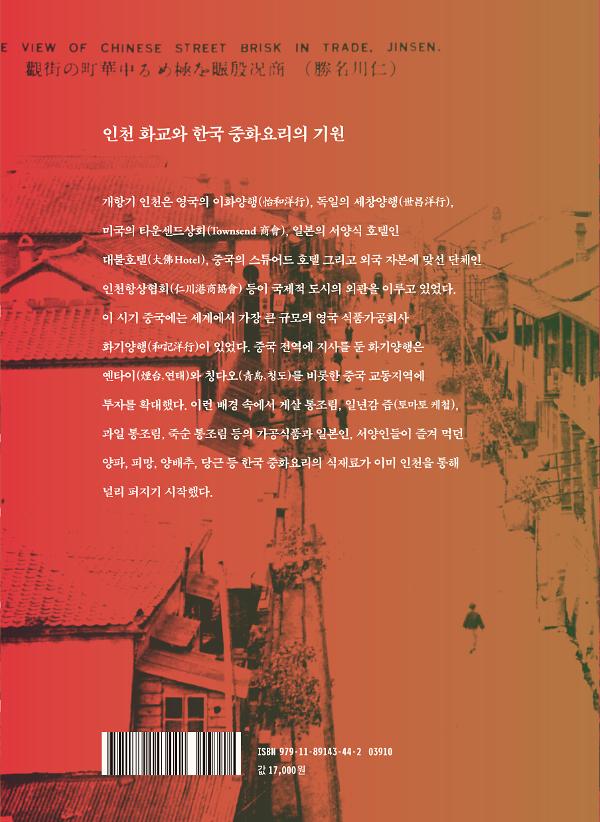짜장면은 인천 부두노동자의 값싼 음식이 아니었다?
재한 화교 연구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중화요리의 역사적 기원
경계인으로서의 굴곡진 삶을 살아온 인천 화교의 역사, 음식과 함께 풀어내
한국인이 하루 평균 소비하는 짜장면이 무려 600만 그릇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일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짜장면. 이 짜장면의 기원을 두고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개항기 인천, 중국인 부두 노동자가 끼니를 때우던 값싼 국수 요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과연 그럴까?
이 책은 재한 화교 3세 출신 연구자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짜장면, 짬뽕을 비롯한 ‘한국 중화요리’의 역사적 기원을 짚어본다. 기존 한국학계의 논의와는 사뭇 다른 주장을 여러 사료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내는데 먼저 짜장면부터 결론 내리자면, “짜장면은 값싼 요리가 아니었다.”
부두 노동자의 끼니는 ‘호떡’
먼저 중국인 부두 노동자의 끼니는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베어 물기 힘들 정도로 딱딱하게 구운 호떡”의 일종인 ‘강터우’라고 주장한다. 강터우(槓頭)는 ‘짐꾼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강’은 지렛대를 뜻하는 한자어 ‘공(槓)’의 중국 발음이고, ‘터우’는 우두머리 ‘두(頭)’의 중국 발음이다. 긴 지렛대 양쪽에 바구니를 달아 짐을 나르던 중국인 노동자(짐꾼)들이 즐겨 먹던 음식에서 유래했다. “(부두에서) 선적과 하적에 관한 한·중·일 간의 이권 다툼은 물론 짐꾼들끼리의 다툼 또한 대단했다고 한다. 이런 다툼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강터우다. ‘강터우 몇 개?’가 바로 하루 임금이자 선택의 기준”(82쪽)이었다.
강터우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천 화교학교의 점심 단골 메뉴이기도 했다. 다만, 고기나 야채, 설탕이 들어간 호떡에 비해 “제일 인기 없는” 호떡이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짜장면의 기원은 무엇일까? ‘중국 산동 출신 노동자들이 먹던 값싼 음식, 인천 차이나타운의 공화춘에서 시작’이라는 ‘설’과 거리를 둔다. 저자는 짜장면의 기원을 베이징의 한 다관(茶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짜장면은 중국에서는 민국(民國, 1912년) 이후 베이징의 한 다관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짜장면의 베이징 탄생설은 중국에서는 기정사실이다. 작가이자 중국인민대회당 수석요리사였던 우정거(吳正格)는 《중국 경동 요리계통(中國京東菜系)》에서 “짜장면을 먹고자 하거든 짜오원(灶溫)으로 가라(要吃炸醬麪, 得到灶溫去)”고 했다. 짜오원은 민국 초에 개업한 식당(다관)이고, 다관 손님들에게 자주 짜장면을 내놓았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곳에서 짜장면을 제일 먼저 만들어 판 것으로 보고 있다.”(7쪽)
이 밖에도 중국의 문인 루쉰(魯迅, 1881~1936)의 소설, 중국의 극작가 라오서(老舍, 1899~1966)의 연극, 북한의 고고학자 도유호(都宥浩, 1905~1982)의 기록을 통해 짜장면의 베이징 기원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저자는 “짜장면은 중국 산둥 지역의 가정식이 아닌 베이징 다관에서 팔던 고급 국수 요리이고, 짜장면이 생겨난 시기는 1912년 전후다. 게다가 당시 국수는 지금처럼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잔치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것을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 부두 노동자가 값도 싸고 간편하게 먹었다고 하니,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잰’격”(10쪽)이라고 분석한다.
짜장면보다 울면
개항기 인천은 영국의 이화양행(怡和洋行), 독일의 세창양행(世昌洋行), 미국의 타운센드상회(Townsend 商會), 일본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大佛 Hotel), 중국의 스튜어드 호텔 그리고 외국 자본에 맞선 단체인 인천항상협회(仁川港商協會) 등이 국제적 도시의 외관을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국 식품가공회사 화기양행(和記洋行)이 있었다. 중국 전역에 지사를 둔 화기양행은 옌타이(煙台, 연태)와 칭다오(靑島, 청도)를 비롯한 중국 교동지역에 투자를 확대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게살 통조림, 일년감 즙(토마토 케첩), 과일 통조림, 죽순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과 일본인, 서양인들이 즐겨 먹던 양파, 피망, 양배추, 당근 등 한국 중화요리의 식재료가 이미 인천을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 식재료 덕분에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고급 중화요리점이 번성했다.
이 때의 메뉴중 하나가 짜장면이었으나 ‘다루몐(打滷麪)’이라 불렸던 당시 중국식 우동이 훨씬 인기가 많았다. 걸쭉한 국물의 다루몐이 바로 화교 사회에서 ‘원루몐(溫滷麪)’이라고 부르는 울면이다. 중국인이 원루몐을 좋아했던 반면, 한국인은 맑은 국물을 더 선호해서 중화요리점의 대표 음식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은 사뭇 흥미롭다.
이밖에도 짬뽕의 유래와 더불어 지금 ‘짬뽕의 전성시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화요리점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메뉴가 되었는지, 반면에 다양한 메뉴에 존재하던 중화면류들은 왜 사라졌는지도 살펴본다. 탕수육, 양장피, 라조기, 유산슬, 부추잡채 등과 같이 지금도 대중적인 중화요리는 물론, 중국식 닭튀김인 ‘짜바께’부터 용호투, 덴뿌라, 짜춘권, 해삼 쥬스 등 고급 중화요리점과 화교의 잔치 음식에서 생겨나 우리 곁에 왔다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중화요리의 탄생과 소멸을 쫓다보면 어느새 허기가 질 정도이다.
한국 중화요리의 뿌리, 인천의 화교들
저자는 또한 한국 중화요리의 근간을 이루는 화교의 삶을 ‘중국 음식’과 버무려낸다. 개화기, 식민지 조선을 거쳐 한국으로 중국 식자재를 들여온 화상(華商), 낯선 땅에서 중국 식자재를 심고 키워낸 화농(華農)이 화교로서 정착하는 과정도 세밀하게 그려낸다. 그들의 중심에는 음식, 중화요리가 늘 함께했다. 질시와 멸시, 녹녹치 않았을 화교의 삶과 역사 또한 저자는 덤덤하게 기록한다.
음식인문학을 연구하고 집필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주영하 교수는 “당사자인 화교 3세가 쓴 이 책은 내부자의 시선이 듬뿍 담겨 있어 새롭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과 짬뽕의 역사에 관한 저자의 시선은 기존 한국 학계의 논의와 다르면서도 근거로 삼은 사료는 오히려 명확하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 중화요리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나는 한국 화교를 만나 음식 이야기를 나눈 적이 제법 있지만, 매번 인터뷰 도구를 챙기고 돌아설 때면 그들이 무언가 다 털어놓지 않고 있음을 직감하곤 했다. 나는 그 이유가 150년 가까이 된 한국 화교의 역사가 품고 있는 한국인의 오해와 질시, 그리고 그들이 체감한 경계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화교가 나에게 털어놓지 않았던 한국 중화요리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들은 기분이다.”라며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