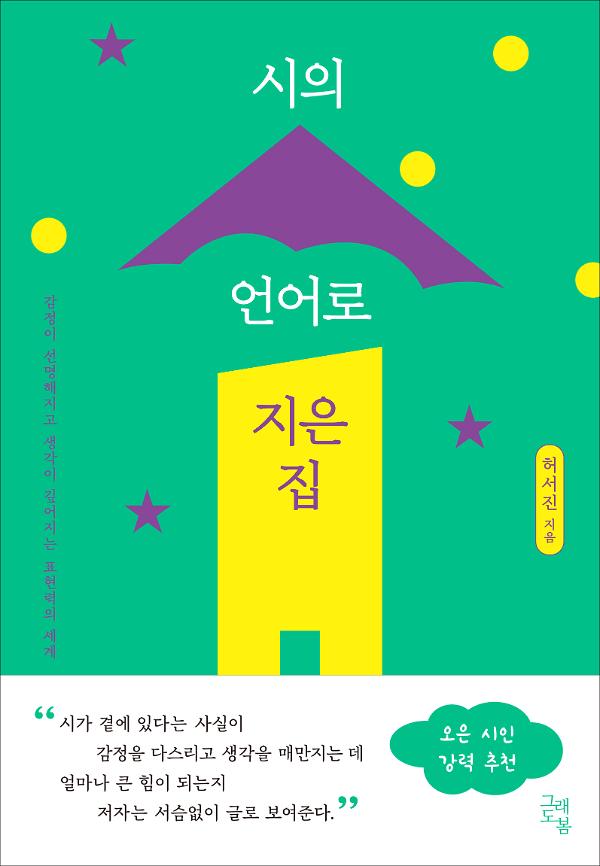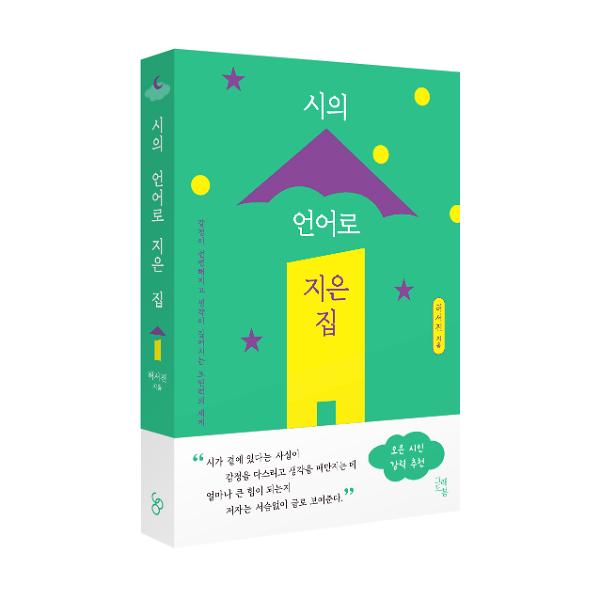〈참 좋은 당신〉은 ‘참’에 대한 애정 덕분에 단번에 좋아하게 된 시입니다. 응달지던 화자의 뒤란에 사랑을 채워준 당신. 어둠을 건너왔다는 것으로 볼 때 당신 또한 삶의 어려움을 겪어왔겠지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자만이 만들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의 빛으로 내 앞에서 환하게 웃어주는 당신. 그런 당신은 “참/좋은/당신”이라는 한 마디로 귀결됩니다. 이 시의 시행 배치에는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시인은 의도적으로 ‘참’이라는 한 글자에 한 행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한 행에 ‘참’ 한 글자만 배치해 마치 당신을 향한 마음에 거짓은 조금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에서 ‘참’이 빠지면 어떨까요. ‘아, 생각만 해도 좋은 당신’이라는 표현은 딘지 부족한 느낌입니다. ‘정말 좋은 당신, 아주 좋은 당신, 너무 좋은 당신’도 왠지 아쉬워요. ‘참’ 하고 입을 꼭 다물었다가 ‘좋은’ 하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릴 때 그 발음에까지 사랑이 담뿍 담긴 느낌입니다. _34-35쪽
시와 마찬가지로 아이와의 대화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표현력을 기른다는 것은 행위를 나열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는지 어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는 행위를 전달하기보다 어떤 밥을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지 늘어놓는 것, 놀았다는 행위를 전달하기보다 어떤 친구와 어떤 놀이를 했으며 그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털어놓는 것이 바로 표현력이 뛰어난 아이들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_42-43쪽
어휘가 부족하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을 다시 정확하게 바꿔보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어휘가 부족해도 몸의 허기를 채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의 허기는 깊어지지 않을까요? _68쪽
이 시대를 일컬어 종종 ‘차별과 혐오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남녀와 세대, 지역과 인종 등과 같은 묵은 문제를 넘어 노인과 아이, 비정규직, 외국인 등 더 세분화된 대상에까지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어쩌면 이제껏 인지하지 못했던 차별과 혐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화해와 연대의 시대가 올까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감정이 ‘동정(바로 공감)’이 아닐까 해요. 상대의 어려움을 내 것처럼 느끼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한다면 차별과 혐오가 설 자리는 없을 테니까요. _87쪽
저와 아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사랑의 암호가 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충전 좀 해줘.”
“우리 이상한 내기 할까?”
제가 할 말이 있다고 부르면 아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말해요. “사랑해지?”라며 웃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사랑해!”라며 너스레를 떨어요. “충전!”을 외치면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이상한 내기’를 하자고 하면 아이와 저는 서로를 세게 끌어안아요. 이상한 내기는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세게 안아주는 겁니다. 져도 기분이 상하지 않아서 이상한 내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는 늘 아이에게 지고 맙니다. 이 세 암호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자 행동이에요. 일부러 약속하진 않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굳어졌어요. 이 암호들 덕분에 저희는 날을 세우다가도 서로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_113쪽
‘미안해’는 관계를 지키는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한 상황은 당연하게도 갈등이나 실수, 잘못 등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가장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미안해’입니다. 물론 ‘미안해’에 진심이 빠져 있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겠지요. 비아냥거리거나 무책임한 태도의 ‘미안해’는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에도 진심이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미안해’만큼은 진심을 넘치도록 꾹꾹 눌러 담아야 해요. 진심이 담긴 ‘미안해’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오래 묵은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기도 하고,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없던 일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_154쪽
〈깊은 물〉은 저를 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깊고 넓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의 짜증쯤은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짜증을 내는 마음이 더 힘들지’ 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엄마가요.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네가 짜증을 내니까 엄마도 짜증이 나잖아’ ‘네가 이유도 없이 짜증을 내니까 엄마도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 아이의 감정에 고스란히 휩쓸리는 얕고 좁은 엄마였어요. _171쪽
아이가 죽음을 물을 때 피하지 않고 대화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변수가 없다면 아이보다 제가 먼저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난 자리에서도 아이는 생을 이어갈 테고 그게 언제든 저의 부재를 생각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차오르겠지요. 지금 제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러는 것처럼요. 그때 아이의 마음이 슬픔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사랑받았던 기억과 감각으로 몸은 곁에 없지만 마음만은 항상 곁에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그 믿음을 버팀목 삼아 충분히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살아가기를. _246-247쪽
아이가 잠든 밤이면 글을 썼습니다. 책도 읽었어요. 애써 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잠든 밤이면 식탁을 나의 공간으로 삼았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던 것은 무엇이었지?’ ‘나는 어떤 삶을 원했지?’ ‘나에게 소중한 가치는 어떤 거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질문도 있었지만 아직 오리무중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스스로에 관해 묻고 답하면서 비로소 내가 나를 돌보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_29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