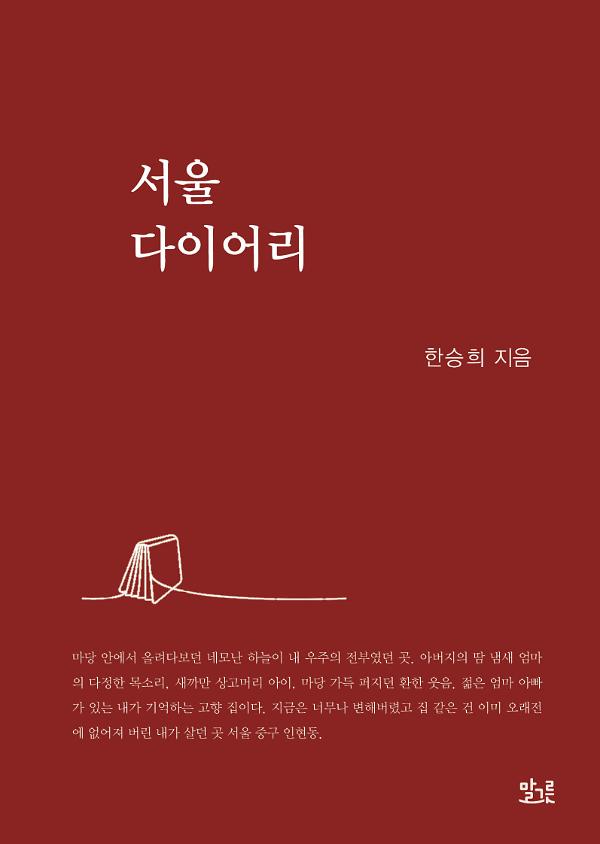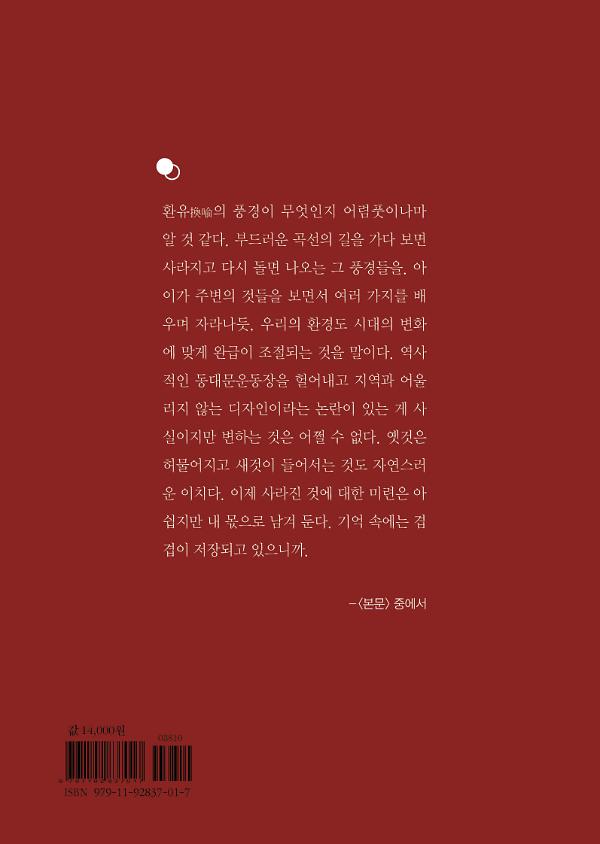눈을 감고 잠시 서 본다. 양팔을 뻗으면 닿을 듯 손금처럼 퍼져 있는 좁은 골목길 고샅마다 숨바꼭질 구슬치기하던 어린것들의 웃음이 들리는 듯하다. 낡은 속옷들과 양말 짝들이 허공에 매달려 펄럭이던 풍경도 떠오른다. 골목을 깨우던 두부장수의 종소리. 저녁이면 힘든 하루를 보낸 식구들을 불러 모으던 깻잎 조림 냄새도 코로 스며드는 듯하다. ‘아이스게~기’를 외치던 정다운 목소리도, ‘찹쌀~알 떡’ 하던 구성진 목소리도 어스름한 골목 저쯤에서 새어 나올 것만 같다.(p.16)
-〈그리운 인현동〉 중에서
지금까지 많이 길을 잃고 헤맸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뒤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빙 둘러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종점에서 내린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 준 아저씨 같은 귀인이 있다면 사는 게 좀 더 수월했을까. 내 인생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삶이 더 편안했으려나. 나이가 들면 사는 일에 익숙해지고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삶의 길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p.30)
-〈집으로 가는 길〉 중에서
순간 바람이 불어와 도토리가 널빤지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
“우두둑 쾅.”
생각보다 큰 소리에 깜짝 놀랐다. 도토리 하나가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아얏!”
부처님이 내리친 죽비인가! 올려다보니 나뭇가지 사이로 번져오는 황금빛 가을볕이 얼굴을 간질인다. 나뭇잎 사이를 타고 오는 선선한 바람이 내 귀에다 속삭인다. 애써 외면했던 나의 가여운 스무 살을 껴안아 주라고, 애달파서 더 아름다운 청춘이었다고, 힘겨워서 자랑스럽다고, 꿈은 그렇게 도달해야 보석이 되는 것이라며 어깨를 어루만지며 스쳐 지나간다. (p.73)
-〈정릉 경국사를 찾아서〉 중에서
‘빙빙 돌아라. 빙빙 돌아라. 나를 멀리멀리 보내 다오’
그날 나는 작품을 내지 않았고, 지금까지 내 기억 속 뚝섬유원지에는 회전그네만이 돌고 있다. 가끔 생활에 지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기억 속 회전그네에 앉아 오즈의 마법사 나라로 날아가는 나를 만난다. 만약에 그때 글을 잘 써서 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과 달라져 있을까.
(p.116)
-〈한눈팔기〉 중에서
이게 내 이름이구나. 내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눈물까지 흘리는 어르신들. 짝꿍이 말도 없이 지우개를 가져다 썼다고 삐지고, 친구가 받아쓰기를 자꾸 훔쳐본다고 귀엣말로 이른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을 내리깔고 딴청을 부린다. 보청기를 안 끼고 와서 들리지 않는다고 둘러대거나 안경이 없어 침침해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 댈 때는 영락없는 1학년 학생들 모습이다.
교실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정자야, 순심아’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처음엔 어색해서 서로 쭈뼛거렸다. 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인 한 어르신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난 김윤덕이야. 너네 이름이 뭐니?”
까르르, 깔깔깔 웃는 소리가 천장을 뚫고 메아리쳤다. (p.154)
-〈지금, 화양연화〉 중에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 엄마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 스카프를 한 것이 아니었다.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스카프를 하셨던 것이다. 내가 지금 서둘러 외출할 때 스카프 한 장으로 눈가림하듯이. 엄마는 자신의 남루한 삶을 감추기 위한 소품으로 화려한 스카프 한 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쩌면 엄마는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까지도 모두 한 장의 스카프로 가리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스카프를 하고 있을 때 엄마는 언제나 구김살이 없고 당당하게 보였으니까.(p.200)
-〈엄마의 스카프〉 중에서
약국 유리창 너머는 시장이어서 항상 시끌벅적했다. 힘겨운 생활이었지만 열심히 사는 이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다. 날마다 드잡이가 벌어졌고 막걸리 한잔으로 만족해하는 껄껄거리는 웃음도 있었다. 무엇이 삶의 동력이 되는지 어렴풋이 알아갔던 것도 그때가 아닌가 싶다.
약국 일이 끝나고 내 방으로 올라가면 서울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일깨웠다. 조그만 옷 보따리 하나 달랑 있는 좁은 방이 내 현실이었지만 보이지는 않아도 가까운 곳에 끊임없이 파도가 들썩이는 넓은 바다가 있었다. 그 바다는 내 미래요 희망이었다. 가끔씩 울리는 뱃고동 소리는 하루빨리 도시 서울로 가라는 재촉과도 같았다. 그러나 나를 태우고 갈 배를 볼 수 없어 불안하고 초조했다. 꿈과 희망을 움켜쥘수록 남루하고 초라해지던 시절이었다.(p.261)
-〈끝나지 않은 항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