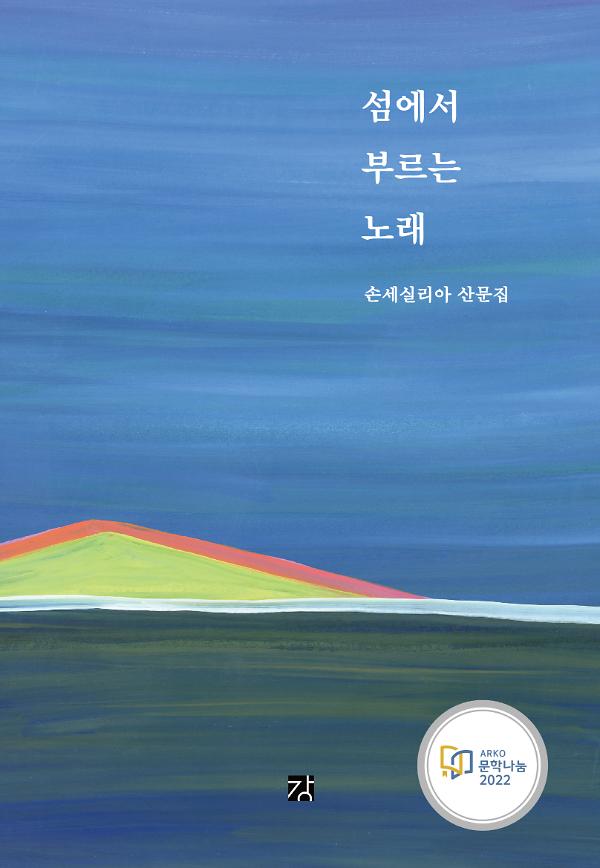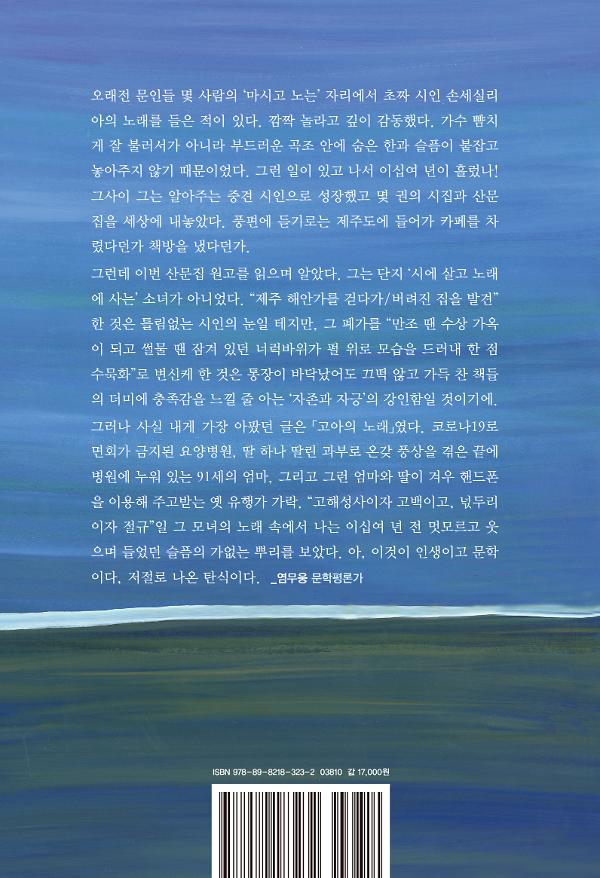제주 해안가를 걷다가
버려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 어떤 이끌림으로
빨려들 듯 들어섰던 것인데요 둘러보니
폐가처럼 보이던 외관과는 달리
뼈대란 뼈대와 살점이란 살점이 합심해
무너뜨리고 주저앉히려는 세력에 맞서
대항한 이력 곳곳에 역력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생도 저렇듯
담담하고 의연히 쇠락하길 바라며
덜컥 입도(入島)를 결심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이런 속내를 알아챈
조천 앞바다 수십 수만 평이
우르르우르르 덤으로 딸려 왔습니다
어떤 부호도 부럽지 않은
세금 한 푼 물지 않는
—「바닷가 늙은 집」 전문
“여차저차 인연으로 맞춤한 집을 만났으나 말이 집이지 실제는 붕괴 직전인 폐가였다. 오랜 세월 인간들로부터 홀대받아 상처투성이인, 그런 집에 한눈에 홀렸으니 숙명일 테다. 잔디와 꽃나무를 식구로 들이고, 기둥을 보강하고, 파손된 문짝을 교체하고, 바다로 향한 현무암 집담을 낮추는 등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돌멩이 하나, 마룻장 한 쪽 버리지 않았다. 백 년 누옥의 자산이며 역사이니 무엇으로든 재활용하려 했다. 마당의 주춧돌은 집담으로 거듭났고, 마룻바닥은 탁자로 재탄생되었다.
수시로 체온을 나누고 말을 걸고 눈을 맞추길 10여 개월, 집이 비로소 집다워졌다. 잔디는 제법 초록초록하고 다년생 풀꽃인 가자니아는 열 몫을 해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썰물과 밀물의 변화, 숭어의 도약, 까치복과 저어새와 바다직박구리와 가마우지와 갈매기의 군무, 이 땅 어디보다 아름다운 저녁놀과 그 밖의 것들도 덩달아 활기를 찾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을 내게 보낸 건 누군가의 섭리임을, 내가 이곳을 찾은 게 아니라 집이 나를 불러들였음을.”(18~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