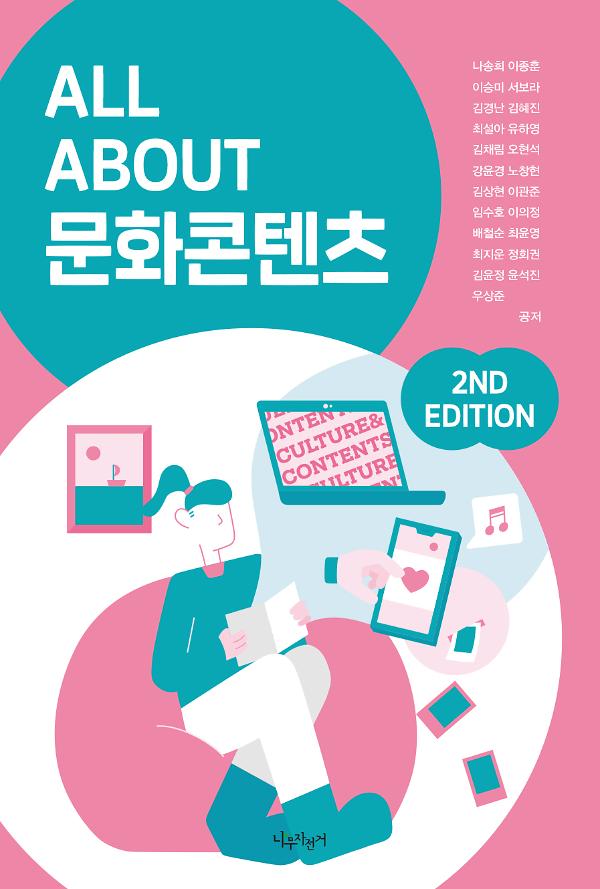01 문화와 문화콘텐츠
01. 문화의 고전적 개념
01-1. culture
크로버와 클럭혼(A.L. Kroeber & Clyde Kluckhohn)은 “오늘날 인류학에서 말하는 ‘Culture’의 개념은 1750년까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관념은 1850년대 독일에서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경작(Cultivating)’이나 ‘향상(Improvement)’과 같은 오래된 의미와 그 후에 새로 형성된 의미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뿐 아직 고정된 의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Kroeber, A. L. & Kluckhohn, C.,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1952.; 박종한, 「문화의 정의: 하나의 통합적 정의를 찾기 위한 두 번의 거대한 도전」, 중국어문화논집 제76호, 중국어문화연구회, 2012. 10., p.451., 재인용.
고 했다.
‘문화’의 여러 정의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의 정의이다. 그는 ‘문화, 즉 문명이란 민족연구라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과 습관들의 복합적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E. B. Tylor, Primitive Culture, 1871.; 원문은 “Culture or Civilization, taken in its wide ethnographic sense, is that complex whole which includes knowledge, belief, art, morals, law, custom, and any other capabilities and habits acquired by man as a member of society.”
타일러가 그의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 1871년)』 서두에서 언급한 이 정의는 문화에 대한 학문적 정의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크로버와 클럭혼은 “영어의 ‘Culture’라는 단어가 오늘날과 같은 인류학적인 개념을 갖는 것은 타일러의 1871년의 저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1871년을 문화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Scientific Concept)이 탄생한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 Kroeber, A. L. & Kluckhohn, C.,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1952.; 박종한, 「문화의 정의: 하나의 통합적 정의를 찾기 위한 두 번의 거대한 도전」 중국어문화논집 제76호, 중국어문화연구회, 2012. 10., p.451., 재인용.
이라고 평가하였다.
19세기 말엽, ‘문화’의 개념이 학술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문화의 정의가 안전이나 진보,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타일러의 정의에서도 문화(Culture)와 문명(Civilization)은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다루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매슈 아널드(Matthew Arnold)는 『Culture and Anarchy, 1873년』에서 ‘Culture’는 더욱 발전된 기술이나 제도, 인식, 태도 혹은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했다. 이 책은 2016년 한길사에서 『교양과 무질서(윤지관 역)』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매슈 아널드는 ‘문화가 추구하는 완전함이 종교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 Matthew Arnold, Culture and Anarchy, Bristol, Thoemmes Press, 1994, p14
을 강조하면서 ‘문화는 부유함과 산업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내는 최고의 가치이고, 현재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누구나 바라는 바와 같이 타락으로부터 미래를 구할 것’ Matthew Arnold, Culture and Anarchy, Bristol, Thoemmes Press, 1994, p20
이라며, 문화를 완전함 그리고 완전함으로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타일러나 아놀드 등이 논의한 초기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오늘날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첫째, 타일러와 아놀드가 제시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모두 서양 문화를 다른 문화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는 서구제국주의 관점을 담고 있다. 언뜻 타일러의 정의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본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로 보이지만, 이 정의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진화론의 관점을 담고 있다. 당시 진화론은 여러 타 문화들이 서양 문화의 양상으로 가는 것을 진화의 발전 단계로 보고 있었다.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 『원시문화』는 서양 문화에 도달하기 전 단계의 문화를 말한다. 아놀드 역시 서양의 엘리트 문화를 가장 진보한 문화로 보고, 이외의 여러 문화를 완전성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문화는 서양 문화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에 따라서 순서대로 우열을 나눌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타일러와 아놀드의 이해는 모두 문화를 완성이나 완전성의 지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절대적 진리나 이상적 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근대적 이성주의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가 다양성과 자율성의 가치를 담고 있고, 수직적 우열보다는 수평적 다양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현대적 문화의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셋째, 타일러의 정의를 객관적 이해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의 정의는 인간과 연관된 거의 모든 것을 ‘문화’로 포괄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과 관련한 것 중 문화가 아닌 것이 없게 되어 문화의 개념 정의와 구성, 범주의 설정이 매우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하면, 결국은 딱히 문화라고 정의할 것이 없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01-2. 문치교화(文治敎化)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한자 문화권에는 Culture라는 말이 쓰이기 훨씬 이전부터 ‘문화’라는 말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문화’를 쓰고 있다.
‘세종장헌대왕(世宗莊憲大王)께서 선왕의 모유(謀猷)를 그대로 따라서 문화(文化)를 크게 선양(宣揚)하시어 역사를 수찬(修撰)하면 모름지기 해박(該博)하게 갖추기를 요한다’
(世宗莊憲大王遹追先猷, 載宣文化, 謂備史須要該備) -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5일(1451년) 1번째 기사
‘선비를 배양하는 것은 장차 인재(人才)를 작성(作成)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동방(東方)에서 처음 관학(館學)을 설치했을 때는 문화(文化)가 성대하지 못하여 열성조(列聖朝)에서 혹은 1백 명으로 한정하기도 하고 혹은 수백 명으로 한정하기도 한 것은 그 형세가 절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요 그 액수(額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는 문교(文敎)를 크게 천명하시어 과제(課製)와 순강(旬講)을 행하여 일세(一世)를 풍동(風動)시켰으므로 사방에서 유학(遊學) 온 선비들이 의젓하게 반재(泮齋)에 가득하게 되었으니, 아! 성대합니다.’(養士之方, 將以作成人才也。 惟我東方, 初置館學之時, 文化未盛, 列聖朝或以百人, 或以數百者, 其勢自不得不然, 而非所以定其額數也。 今我殿下, 丕闡文敎, 課製旬講, 風動一世, 四方遊學之士, 于于然盈溢泮齋, 猗歟盛哉。) -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1월 4일(1781년) 1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5일.png><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1월 4일.png>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일본이 서양의 컬처(Culture)를 ‘문화’로 잘못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서 문화란 말은 ‘가르쳐서 계몽시키자는 뜻’으로서 정체된 개념이 아닌데 일본이 서구의 기술을 단순히 문화로 번역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문화는 노래하고 시를 쓰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으로 깨우치게 하는 ‘문치교화(文治敎化)’의 의미라고 번역어 이전의 ‘문화’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한다.” 부산일보 류준필 문화보 2008.8.9 기사 참조.
언론인 장지연이 1900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약지폐(文弱之弊)」라는 글에서도 ‘문치(文治)’를 읽을 수 있다. 여기에서 ‘문’은 정치제도로 큰 국가에서 가족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모인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문’이 없으면 인간 사회는 성립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 ‘문’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으로 나라의 융성은 ‘문치’에서 유래하고 나라의 멸망은 ‘문폐’에서 비롯한다. 장지연이 말한 ‘문’이란 결국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서 덕치와 교화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류준필, 「‘문명’·‘문화’ 관념의 형성과 ‘국문학’의 발생-‘국문학’이라는 이데올리기 서설」, 민족문화사연구 제18권,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01년, pp.8-9.
따라서 ‘문치’는 ‘법치’, ‘덕치’와 같이 백성과 나라는 다스리는 정치의 근본원리나 방향, 방식을 말하고, ‘문’을 토대로 정치를 펼친다는 의미이다. 장지연의 설명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풀어보면,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전통적인 ‘문화’의 의미는 인간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질서나 제도 혹은 교양으로서 인간다움과 그것을 정비하고 하는 노력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 ‘문교’, ‘문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동양의 전통에서 ‘문화’란 이념, 정치 제도, 예악과 같은 일상에서 ‘문’이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언어문화학 교수인 박종한은 영문 ‘Cultue’의 번역어로서 ‘문화’와 고전 한자 ‘文化’를 함께 검토하며, “‘문치교화’의 줄임말인 ‘문화’는 문치교화 및 예약 전장제도(典章制度)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의 ‘문화’와는 현격히 다르고, 지금의 ‘문화’라는 말은 일본 메이지 시대에 영문 Culture의 번역어로 쓰였고, 그것이 중국과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종한, 「문화의 정의 : 하나의 통합적 정의를 찾기 위한 두 번의 거대한 도전」, 중국어문화논집 제76호, 중국어문화연구회, 2012. 10., p.446.
라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문화’의 의미와 개념에 대한 고전적 논의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문화’라는 말이 영문 Culture의 번역어인지, 혹은 한자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문치교화’의 준말인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Culture의 의미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는 ‘문치교화’의 ‘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의 용례에는 다양한 의미가 중첩되고, 혹은 모순되게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02. 문화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
크로버와 클럭혼은 ‘문화’에 대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엄밀한 정의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저술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1952)」에서 166개의 문화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들은 문화에 대한 정의를 기술적, 역사적, 규범적, 심리학적, 구조적, 발생적, 불완전 정의로 나누어 살펴보고, 하나의 통일된 문화의 정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명시적인 정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약 50년 뒤인 2006년 볼드윈(John R. Baldwin) 등이 저술한 책 『Redefining Culture(Perspectives Across the Disciplines)』에서 난립하는 여러 문화에 대한 정의를 통합하고자 문화의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볼드윈 등은 크로버와 클럭혼의 연구를 참고하여 313개의 문화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고 내용에 따라 7개의 대그룹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면서도 ‘문화’라는 단어를 어떤 문맥에 집어넣더라도 의미가 통하는 하나의 고정된 정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복잡하면서도 종종 서로 경쟁하는 정의들을 두루 아우르는 단 하나의 정의를 찾으려는 노력은 어떤 것이든 완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박종한, 「문화의 정의: 하나의 통합적 정의를 찾기 위한 두 번의 거대한 도전」, 중국어문화논집 제76호, 중국어문화연구회, 2012. 10.
‘문화’라는 용어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다의성은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지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문화가 몇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사고의 체계와 몇몇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화를 가장 복잡한 2~3개의 단어 중 하나’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87
라고 말했다.
John R. Baldwin, Sandra L. Faulkner, Michael L. Hecht, Sheryl L. Lindsley이 공저하여 2006년 발간한 책(Redefining Culture:
Perspectives Across the Disciplines) 표지
이처럼 거의 한 세기에 걸쳐 ‘문화’의 개념을 선명하게 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문화’가 무엇이라는 명징한 정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고 학문적 정의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상에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화’라는 말을 수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일상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말 그대로 문화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왔다. ‘문화’의 개념에 대한 최근의 이해들에서 고전적인 시선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대적인 이해의 특성을 추려볼 수 있다.
주디 자일스(Judy Giles)에 따르면, 초기의 문화연구를 주도한 호가트(Richard Hoggart)에게 있어 문화는 ‘특정한 시대, 특수한 집단의 문화를 구성하는 모든 활동, 실천, 예술적․지적 과정 그리고 생산물’ 주디 자일스 외 저, 장성희 역, 「문화학습」, 동문선, 2003. p.33.
이었다. 호가트의 이러한 이해는 구체적인 문화의 결과물과 그 결과물의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나 배경, 기반을 함께 뭉뚱그려 ‘문화’라고 일컫는 것으로 추상적인 관념과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이다. 주디 자일스는 문화의 의미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8세기부터 경작이란 의미로서의 문화는 특별히 인류의 정신적ㆍ도덕적 진보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문화의 이러한 의미는 이 용어가 지닌 다른 의미들과 달리 최종 생산물을 암시하는 한 과정이라는 생각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문화라는 용어는 오페라ㆍ공연ㆍ문학ㆍ드라마 그리고 회화와 같은 실제 생산물들을 의미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대중문화는 종종 텔레비전ㆍ할리우드ㆍ잡지ㆍ3류 소설과 신문들을 의미하는데 사용한다. ‘빅토리아조 문화’라는 용어는 이미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자료들의 집합체를 암시한다.” 주디 자일스 외 저, 장성희 역, 「문화학습」, 동문선, 2003. p.21.
주디 자일스의 이 설명은 과거에 ‘문화’라는 말은 문화와 그 결과물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칭하였다는 말이다. 이처럼 과거 ‘문화’라는 말에는 어떤 구조나 체계, 의미, 혹은 사유방식이나 인간사이의 관계와 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지시와 예술품이나 행동, 어떤 현상과 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의 산물을 통칭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었다. 지금도 관습적으로 이러한 중층적 의미는 일상에도 통용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문화생활이나 문화활동을 한다’고 표현하거나, ‘문화계에 종사한다’고 할 때의 문화는 대부분 문화적 생산물을 일컫는다. 이와 달리 조직문화, 선진문화, 다문화, 청년문화 등의 ‘문화’는 대부분 구체적인 사안들의 사이나 배경에서 작용하는 추상적인 전체의 특성을 관념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적인 사용과는 다르게 이러한 포괄적인 이해는 학문적으로 문화연구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문화를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문화와 문화의 산물을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문화’의 개념에서 구체적인 문화의 결과물들을 제외하고, 차츰 문화의 내재적 본질은 추상적 의미로 전환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화연구나 대중문화연구, 민속학, 문화학 등의 분과학문들이 개별 영역을 규정하면서 자리 잡아왔다.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문화’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담긴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완성의 상태 혹은 완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남겨놓은 생각과 경험의 총체로서 ‘기록’이고, 마지막 하나는 예술이나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제도나 일상적 행위까지 포괄한 ‘삶의 방식’이라는 정의들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옮김, 『기나긴 혁명』, (주)문학동네, 2007. pp.83-84.
이러한 분석적 이해를 통해 ‘문화’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추상적인 이상이나 완성 혹은 삶의 방식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기록이나 예술작품, 학문의 결과물들을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윌리엄스는 ‘문화이론을 전체적인 삶의 방식에 존재하는 요소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 정의하고, 문화의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관계들의 복합체인 사회조직의 본질을 발견하려 하였다. 그리고 문화를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 즉, 모든 실제의 공동체에서 매우 심층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소유되고 있는 의사소통이 의존하는 기반으로 문화를 설명하였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옮김, 『기나긴 혁명』, (주)문학동네, 2007. pp.91-94.
이는 ‘문화’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화현상이나 문화산물을 관통하는 공통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문화’로 개념화하려는 학문적 시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주디 자일스, 리차드 호가트,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공통적으로 추상적인 문화와 구체적인 문화적 산물의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주디 자일스의 정리에 따르면, “한 가지 현대적 정의는 문화가 단순히 드러내는 ‘감정의 구조’나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의미의 생산과 순환’, 즉 문화가 생산되는 과정들과 그것이 취하는 형식들이라는 것이다.” 주디 자일스 외, 장성희 역, 「문화학습」, 동문선, 2003. p43
다시 말해서, 현대 학문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구체적인 형상물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이러한 구분법에서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구별이 가능해진다. 존 피스크(John Fiske)는 ‘문화를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미와 쾌락이 생겨나고 순환하는 것’으로, ‘텔레비전은 의미와 쾌락의 담지체(擔持體)이자 촉발자(觸發子)’라고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존 피스크, 곽한주 옮김, 「텔레비전 문화」, 2017. p.65.
즉 문화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고, 텔레비전을 그 추상적인 문화가 구체화된 것으로 본 것이다. 존 피스크의 이와 같은 정의에서 텔레비전을 문화콘텐츠로 대체하면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의미도 좀 더 명확해진다. 문화는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미와 쾌락이 생겨나고 순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콘텐츠는 문화가 드러나는 의미와 쾌락의 담지체이자 촉발자이다.’
03. 문화콘텐츠 용어의 등장
학자들마다 소소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대략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나 기사, 학술논문 등을 검색해보면, 대략 2000년부터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02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문화관련 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쓰였다. 2006년에는 같은 법에서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된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문화콘텐츠’보다 ‘멀티미디어콘텐츠’,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가 먼저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초기의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디지털기술과 결부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차차 전통적인 문화적 산물이나 예술, 오락, 축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2002년과 2006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이유에서도 읽을 수 있다. ‘문화관련 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2002년 7월에 전부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 이유를 보면,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에 ‘문화콘텐츠’를 법적으로 정의한 2006년 10월의 개정에서는 디지털보다는 ‘문화산업 정책범위확대’, ‘지적재산권 및 문화산업통계 문화산업소비자보호’ 등을 주요한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즉 2002년에는 디지털기술과 산업의 성장이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2006년에는 디지털을 넘어서 문화 전반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 5년 사이에 디지털 중심에서 문화 전반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콘텐츠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04. 문화콘텐츠의 형성소(形成素)
‘근대를 거치면서 인간과 인간의 삶은 추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파편으로 쪼개지고 영역으로 분해되었다. 문화콘텐츠를 중심에 두고 보면, 인간에 대한 고민과 탐색은 인문으로, 창작의 영역은 예술로, 자연에 대한 연구는 인간과 분리되어 과학으로, 생산의 방법은 기술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이러한 영역들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과 인간의 삶을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이러한 현대의 융섭(融攝, 융통하여 융합하는 것) 위에서 형상화의 창작을 실천한다.’ 이종훈, 「창의적 융섭으로서의 문화콘텐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293.
문화콘텐츠에서 융섭하는 요소들은 문화콘텐츠의 형성소이다. 문화콘텐츠 형성소는 문화콘텐츠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나 배경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문화콘텐츠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한다.
04-1. 인문학
문화콘텐츠는 인간을 총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흐름에서 등장하였다. 노동이나 기능 중심의 근대적 인간관에서 벗어나 감성과 이성을 포함한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문화콘텐츠 등장의 중요한 조건을 구성한다. 인간에 대한 재인식과 인문적 가치, 문화원형이 문화콘텐츠 창조의 토대가 되고,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실천을 지향하는 인문적 가치는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창조적으로 구현된다. 또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이미지, 음악, 역사, 정서, 재미, 의미 등은 인문학적 요소로서 문화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형성소로 작용한다.
04-2. 예술
지금의 문화콘텐츠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디지털 매체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오락, 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예술영역을 포괄한다. ‘예술과 문화콘텐츠는 인간이 창의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내는 구체적 형상화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로 향유자(享有者)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는가, 혹은 창작자의 창조성에 향유자의 즐거움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라는 고민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종훈, 「창의적 융섭으로서의 문화콘텐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236.
04-3. 미디어
미디어의 발달은 문화콘텐츠의 개념형성과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독서와 신문의 보급과 최근 디지털 미디어,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에서 보듯이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어놓았고, 특히 영상과 음악매체의 발달에 힘입은 소통 가능성의 획기적인 증대는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느낌과 감정, 기억을 포함하는 문화적 소통과 향유의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시켰다.
특히 디지털에 기반을 둔 온라인, 모바일 미디어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미디어와 콘텐츠의 개념적 분화를 촉발하였고, 미디어에 탑재된 내용을 지칭하는 콘텐츠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04-4. 디지털
문화콘텐츠라는 말이 등장하기 이전에 멀티미디어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의 등장은 디지털기술혁신이 크게 견인하였다. 문화콘텐츠의 형성소로서 디지털기술의 역할은 크게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한 소통의 확대와 창조적 아이디어의 구체적 형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문화콘텐츠의 소통방식과 유통구조를 바꾸어 문화콘텐츠가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디지털기술은 어떠한 아이디어도 실제처럼 실감나는 이미지와 소리 등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여 더욱 풍성한 문화콘텐츠 생산과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04-5.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특히 문화와 예술이 산업화되는 것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이념적 냉전체계가 종식되면서 시장경제체계의 효율성이 증명되었고, 다양한 정치·문화적 인식의 확산과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줄었고, 문화산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산업적 선순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창조적 문화활동의 활성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05. 문화콘텐츠를 이해하는 관점들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논의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범주, 속성 등에 대한 이해들이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관련 실무에 종사하면서, 상호간의 이해와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의미공유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문화콘텐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통일된 이론이나 정설은 아직까지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문화콘텐츠의 형성소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문화콘텐츠를 이해하는 관점도 몇 가지로 나눠진다.
05-1.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다
문화콘텐츠 등장 초기에 많이 보였던 관점으로 문화콘텐츠를 문화산업의 테두리 안에서 상품으로 생산, 거래, 소비되는 재화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문화콘텐츠를 상품에만 한정할 경우 자칫 문화상품과 동의어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을 멸시하는 인습에 때문에 굳이 찾아낸 대체어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 즉 문화상품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짓기나 계급의식이 반영되어 마치 좀 더 고상한 것처럼 부를 수 있는 용어로 ‘문화콘텐츠’를 고안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많은 예술품, 세시풍속의 축제, 문화원형 중에는 상품성을 지니지 않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문화적 산물들을 제외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현재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콘텐츠의 의미를 온전히 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05-2. 콘텐츠란 디지털기술의 산물로 문화콘텐츠는 디지털기술이나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작, 유통되는 문화적 창작물이다
이러한 견해는 문화콘텐츠 등장 초기부터 주를 이루어 왔던 견해로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연장선에서 문화콘텐츠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도 역시, 디지털기술의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인류가 오래전부터 향유해왔던 문학, 연극, 영화, 음악, 오락, 게임, 설화, 문화원형 등을 문화콘텐츠에서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산물을 ‘문화콘텐츠’라고 지칭하는 최근의 흐름과 다소 괴리가 생길 수 있다.
05-3. 문화콘텐츠는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되어 문화산업의 구조에서 유통, 소비되는 상품이다
문화콘텐츠를 디지털기술과 문화산업의 형성과 성장에 따른 결과물로 보는 견해이다. 디지털과 문화산업을 동시에 문화콘텐츠의 조건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도 역시 앞의 이해들처럼 일상에서 문화콘텐츠라고 지칭하는 많은 영역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05-4.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정서, 즉 문화를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다 이종훈, 「‘문화콘텐츠 기획'의 개념과 함의」,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27.
문화콘텐츠를 매우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관점이다. 기술적 조건이나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를 토대로 한 다양한 실천과 창조물을 문화콘텐츠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산물’, ‘구체적 형상화’, ‘기획 생산된 창조적 내용물’, ‘문화적 내용물’, ‘소통거리’ 등으로 지칭한다. 즉, 위의 연구들은 모두가 문화콘텐츠를 ‘상품’으로만 한정하기는 어렵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콘텐츠의 개념에서 문화나 창조성을 강조하고, 그 문화와 창조성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문화콘텐츠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념이나 추상이 아닌 구체성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창의적 융섭으로서의 문화콘텐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284.
06. 문화콘텐츠의 개념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용어지만 문화콘텐츠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문화콘텐츠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책, 회화, 조각, 연극, 음악 등도 모두 그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예술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특정 계층들의 향유물이었던 것이 근대 이후 대중화되면서 급속한 속도로 현대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단지 ‘문화’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미디어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놀이의 장르가 개발되면서, 그리고 향유물의 제작에 공학이 개입하면서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이종대, 「미술세계」 2007년 1월호(통권 266호) - ‘융섭의 산물, 문화콘텐츠’, ㈜미술세계, 2006. p.90.
“오늘날의 문화콘텐츠들은 실은 앞서 주디 자일스가 문화의 개념이 성립하는 시기에 문화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고 언급한 ‘오페라․공연․문학․드라마․회화․텔레비전․할리우드․잡지․‘3류’소설과 신문”과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콘텐츠’라고 일컫고 있는 각종 결과물들은 실은 얼마 전에 문화라는 용어로 불렸던 것들이다. 하지만 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다양한 현대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의 문화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구체적 실체들, 다시 말해서 ‘문화콘텐츠’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콘텐츠는 구체적으로 형성화된 결과물이다. ‘의미의 생산과 순환’이라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난 결과물이다. 영화도 음악도 방송도 애니메이션도 문화재도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과하여 실체로 탄생하여야 ‘콘텐츠’로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훈, 「‘문화콘텐츠 기획'의 개념과 함의」,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23.
‘문화는 기획에 의하여 구체적인 형상화의 결과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이 구체적 형상화의 결과물의 총칭을 ‘문화콘텐츠’라 명명할 수 있다.’ 이종훈, 「‘문화콘텐츠 기획'의 개념과 함의」,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05.
넓은 범주의 콘텐츠는 ‘인간의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거나, 구현한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정서 즉 문화를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콘텐츠’와 ‘문화콘텐츠’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 그대로 ‘문화’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와 ‘구체화’와 ‘구체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콘텐츠’는 ‘문화가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고 그 외의 ‘콘텐츠’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인간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들이다. 이종훈, 「‘문화콘텐츠 기획'의 개념과 함의」,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28.
그리고 문화와 관련하여 문화콘텐츠는 문화가 드러나는 구현물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형성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