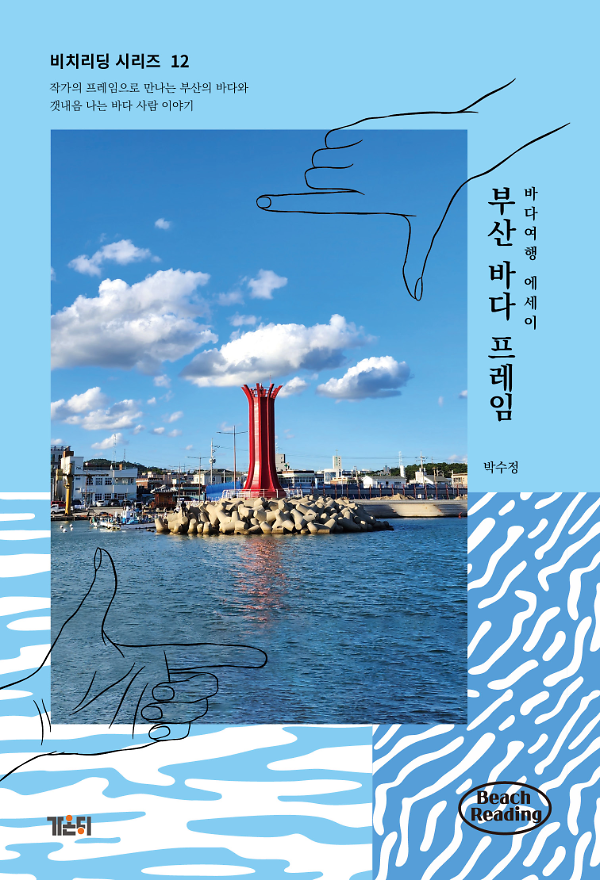“…마을 사람들은 내 그림을 보면 단번에 어디를 그린 건지 알아요. 이곳의 평범한 삶을 그린 거죠. 내가 사는 곳을 보이는 대로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건 화가로서 내 역할이구나.’ 마냥 아름답게만 그리는 것은 어쩐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원자력발전소) 외면하고 그릴 수는 없다, 저것도 들어가 있고, 또 마을 사람도 그리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는 겁니다.…”
(바다 마을 그림 p.22)
“…소두방은 산골에 뭐 묵을 끼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칠암 아들은 잘 먹어서 덩치가 좋아요. 배가 바다에 나갔다 오면 거의 만선으로 들어오거든요. 저기 멀리서 배가 들어오면 배가 물고기로 꽉 차서 거의 가라앉아서 들어온다 아입니까. 붕장어뿐만 아니라 납새미랑 천지삐까리지예. 물고기가 남아도니까 동네에서 제일 형편 안 좋은 집에도 막 나눠주고. 지금처럼 세꼬시 회로 붕장어를 먹은 기 아니고 배를 갈라서 말려 가지고 연탄불에 구워 먹었지예.…”
(붕장어마을 소년 기수 p.32)
예비 신부와 취준생, 아니 윤미와 하은이. 두 사람이 바다를 배경으로 카메라 프레임을 채운다. 깔깔거리며 잠시 사진놀이를 했다. 부산이니 바다에서 만난들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소중한 추억과 그 추억을 함께 만들 사람이 더해지니 그 또한 특별한 만남과 풍경이 된다. 한참을 바쁘게 달리다 잠시 쉬어갈 하루, 그것은 두 사람이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일 것이다.
(예비 신부와 취준생 p.50)
기장의 해녀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1910년대 신문기사에 의하면 당시 울산과 기장고을은 2~30년 전부터 제주도의 여인들이 ‘벌이를 나가는 곳’이었다. 한번 나서면 6개월 정도의 일정으로 육지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갔다는 것이다. 이후 해녀의 활동량이 많아지며 벌이를 나가는 육지도 점차 많아졌고 멀리는 일본과 중국까지 갔었다. 이런 활동을 하는 해녀를 ‘출항해녀’라고 한다.
(솔개, 가마우지, 숨비소리의 황금비율 p.61)
“광안리는 산책하는 강아지가 많아요. 버스킹 중에 견주와 강아지가 나란히 앉아있기도 해요. 그럴 때 가끔 짖기도 하거든요. 발라드는 조용히 읊조리듯 부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 타이밍에 강아지가 짖으면 노랫소리가 안 들려요. 또 배달 오토바이가 배기음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도 노랫소리가 끊기고요. 그럴 때 저도 웃고 사람들도 웃어주세요.…”
(광안리 버스커와의 대화 p.74)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사진 찍는 사람인데 일하시는 모습이 사진에 나와도 될까요?”
노인은 배에 타라는 손짓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예상보다 적극적인 반응에 잠시 주저했다. 다시 한번 얼른 타라고 손짓을 했다. 노인의 일에 더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 이번엔 주저 없이 배에 올라탔다. 기다렸다는 듯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지개마을의 귀신고래 이야기 p.82)
바다는 낙조에 붉게 물들어 가고 바람은 선선했다. 갑판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선미를 따라 갈매기가 열심히 비행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새우과자를 용케 잘도 받아먹는다. 운 좋은 날은 배 주위로 상괭이가 함께 헤엄치기도 한다. 새우과자가 바다로 떨어지면 상괭이는 웃는 얼굴로, 갈매기는 화난 얼굴로 새우과자를 두고 경쟁을 했다.
(누나 집으로 가는 바닷길 p.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