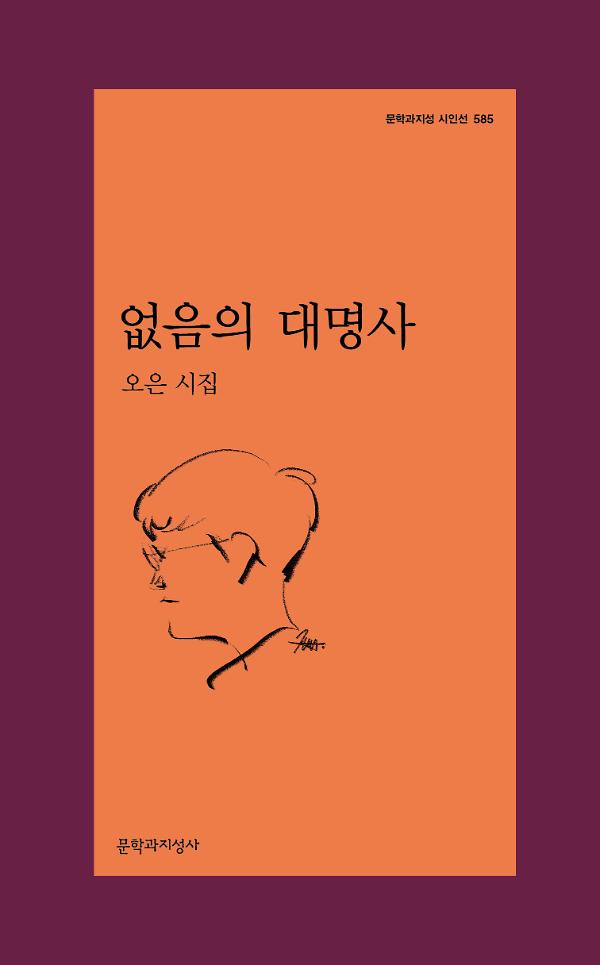시인 오은의 여섯번째 시집 『없음의 대명사』가 문학과지성사 시인선 585번째로 출간되었다. 전작 『나는 이름이 있었다』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시집이라 반가움이 크다. 오랜만의 새 시집이긴 하지만 그사이 시인은 다양한 앤솔러지와 산문집, 청소년 시집 등을 출간했을 뿐 아니라 2018년 4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도서 팟캐스트 책읽아웃에서 ‘오은의 옹기종기’를 맡아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으니, 읽고 쓰고 그에 대해 나누는 일을 게을리한 적은 없다.
2002년 4월, 스무 살에 시인이 되었다. 올해로 데뷔한 지 20년을 꽉 채우고 21년째에 접어들었다. 첫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이 2009년에 나왔으니, “등단한 순간과 시인이 된 순간이 다르다고 믿는”다는 시인이 쓴 약력처럼, 이르게 등단하여 천천히 시인이 되었다. 1부부터 ‘말놀이 애드리브’라는 부제를 달고 거침없이 언어유희를 보여주며 경쾌하게 전복적이었던 첫 시집은 큰 주목을 받았다. 오은은 이를 한때의 신드롬으로 끝내지 않고, 이후 14년 동안 여섯 권의 시집을 펴냈다. 시간의 간격이 짧은 적도, 긴 적도 있지만 2~3년에 한 권꼴로 나온 셈이다. “시인은 직업이 아닌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또 다른 시집에 시인이 쓴 약력처럼, 오은은 ‘시인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고유의 시 세계가 더욱 단단해졌음은 물론이다. 시인이 되고 나서, 오은은 시와 멀어진 적이 없다.
오은은 주황이다. 빨강과 노랑의 중간 색. 그에게 빨강은 “모든 익는 것들의 종착지”(『너랑 나랑 노랑』, p. 16)이고, 노랑은 “한없이 밝아”지게 하는 천진난만한 색이다(같은 책, p. 11). 거침없이 정열적인 청년과 해맑고 환한 아이가 함께 있다. 하여 그의 시는 끝내 빨강으로 치우치지 않았고, 기어이 노랑을 놓지 않았다. 오은은 원색은 좋아했지만 원색적이었던 적은 없다.
“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했던 시인은 이제 “없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도 “이름”을 가린 “대명사”로. ‘있었다’가 ‘없음’으로 가는 길에는 ‘잃었다’가 놓여 있다(“‘잃었다’의 자리에는 ‘있었다’가 있었다”―‘시인의 말’). “‘앓는다’의 삶이 끝나고 ‘않는다’의 삶은 살고 있는 중이”(「않는다」, 『나는 이름이 있었다』, p. 97)라고 했던 시인은 ‘잃었다’를 거쳐 ‘없음’ 앞에 당도했다. 그 슬픔을 능히 짐작하면서도 시인은 ‘없음’으로 향하는 문을 연다. 그에게 “시 쓰기는 무언가를 여는 사람의 표정을 떠올리면서 시작”(「나의 시를 말한다」, 『현대시』 2023년 5월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쏟아지는 대명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