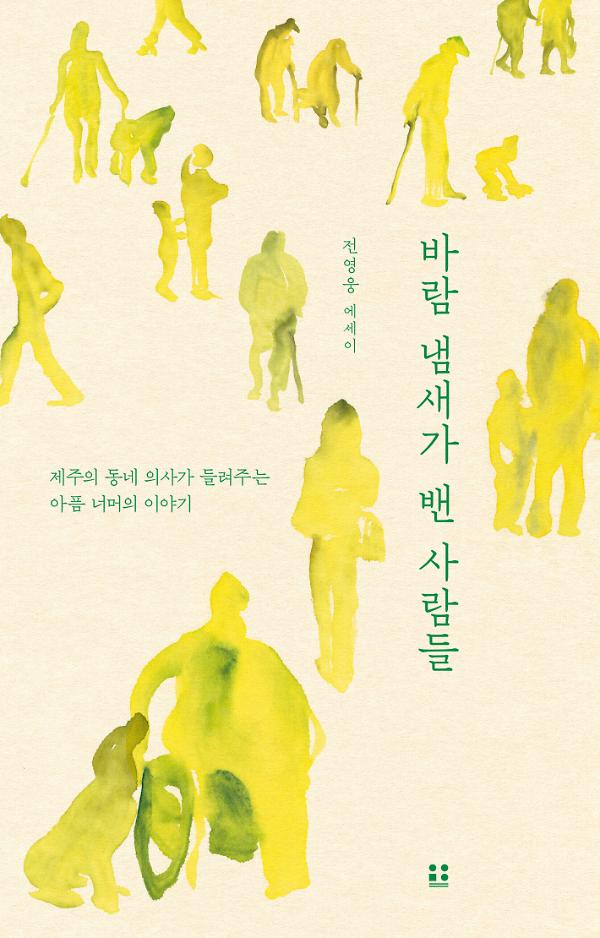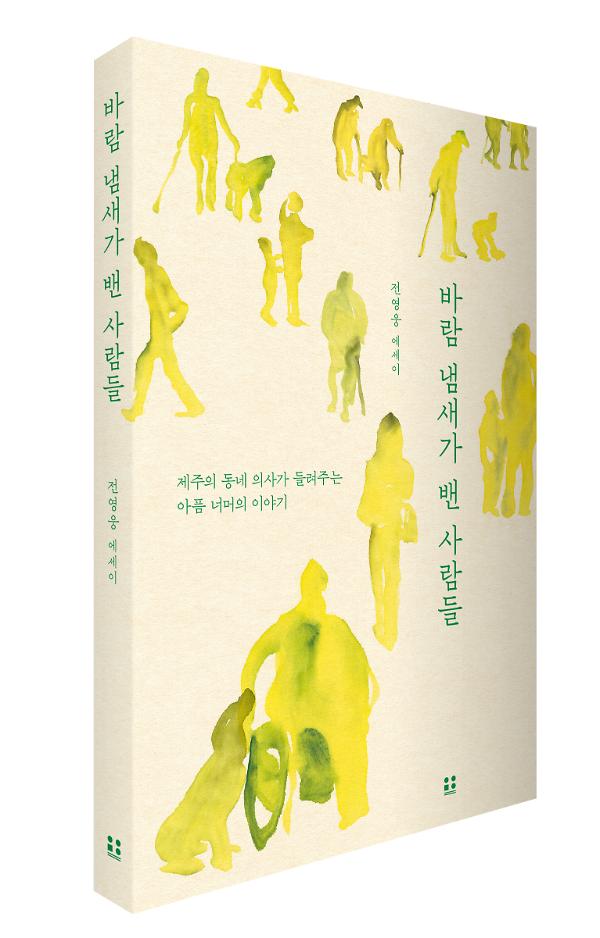18쪽 머리가 터질 정도로 구타를 당했고 깊은 산속에 있는 귤밭의 컨테이너로 끌려가 감금된 뒤 성적 학대까지 당했다. 발가벗겨진 채로, 컨테이너에서 나오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그렇게 폭행해 놓고 남편도 스스로 정도가 심했다고 느꼈는지 그날 병원을 찾은 것이다. … 시대는 발전해서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도 많아졌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는 풍경은 그러한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게 만든다._「2023년, 맞고 사는 여성들」 중에서
30쪽 4·3의 흔적은 곳곳에서 자연스레 다가왔다. 길에서, 사람들에게서, 마치 얼마 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이다. 제주에 들어와 처음 자리를 잡은 동네에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가 살던 건입동 바위 언덕은 주정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4·3 당시 여러 이유로 붙잡힌 사람들이 그 공장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집단학살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고, 수용자들 중에 임산부도 있어 수용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증언도 있다. 집 앞에서 내려다보이던 사라봉 앞바다는 예비검속자들이 이유 없이 집단으로 수장된해역이었다. 일할 곳을 알아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처음 밟은 제주공항 역시, 당시 집단으로 학살당한 후 암매장된 시신들이 묻혀 있는 땅이었다._「주제넘은 참견」 중에서
37쪽 그는 운송 업무를 하는 지입차주였다. 1억 4000만 원이나 하는 화물트럭을 60개월 할부로 구입해서 이제 겨우 석 달치 할부금을 냈다고 했다. 개인사업자였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하니 운송회사에 ‘넘버값’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운송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세월호를 타고 제주에 오다가 새것이나 다름없는 트럭을 바다에 수장한 것이다._「구조된 자의 불안」 중에서
47쪽 그가 진료를 마치고 나간 뒤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보였다. 작은 어선 두어 척이 느릿하게 범섬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조금 전 나간 환자에게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달래 주고 있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라니, 나는 그들에게 얼마나 허망한 사람일까._「바람 냄새가 밴 사람들」 중에서
56쪽 병원에서 만난 동성애자들은 대체로 무척 예민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이 드러나게 될까 봐 극도로 조심했고,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다가 나중에서야 그렇다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언제나 불안해했고 두려워했다. 때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가 불안해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다.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과 그에 따른 행위일 뿐인데 부정당하는 현실, 그 안에서 살아가려면 강박에 가까운 자기검열은 필수였다._「범죄, 질병, 성적 지향」 중에서
67쪽 울먹이던 아이는 그 후로 병원에 오지 않았다. 이틀 후 다시 오라고 했을 때 “그냥 집에서 반창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나가듯 던졌던 말이 기억났다. 아이는 자기가 만든 상처마저 스스로 떠안으려고 했다. …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자신의 속 이야기를 풀어놓을 공간이 정말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 수많은 청소년 상담 인력과 시설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찾아가지 않는지 나는 내 앞에 앉은 아이들에게 함부로 물을 수 없었다._「팔에 나타난 마음의 상처」 중에서
73쪽 아픔은 정말 개인의 문제일까. … 먹고사는 일에 있어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국가는 자신의 의무에 무척 소홀한 상태이다. 어째서 입원이 누군가에겐 휴식이 되고 누군가에겐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치료에 임해야만 하는 것인가._「먹고사는 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