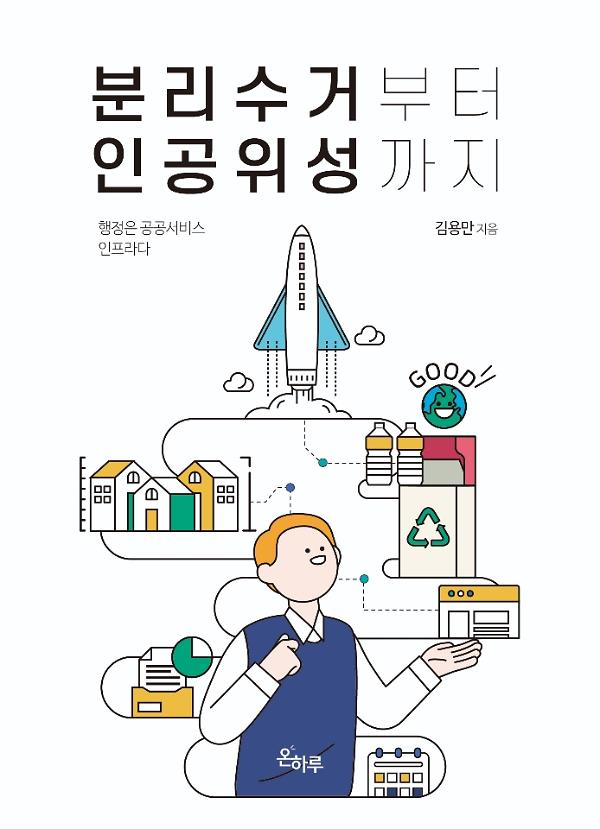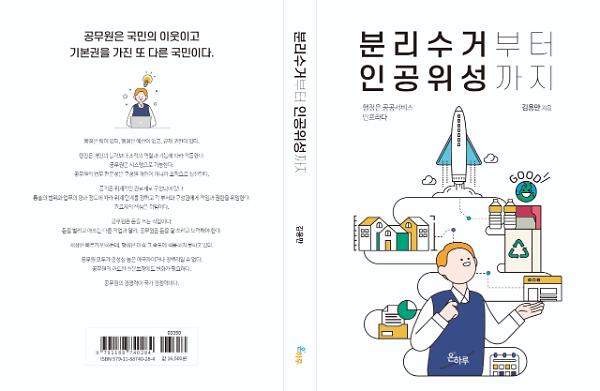공무원은 돈을 쓰는 직업이다. 돈을 벌려고 애쓰는 다른 직업과 달리, 공무원은 돈을 잘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해야 한다. 쓰레기 수거부터 인공위성 발사까지, 공무원은 국가의 모든 일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므로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춰야 한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의 낭비를 막으려면 공무원의 선의가 우선이지만, 언론, 의회,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
공무원을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중적이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과 일탈은 대개 공무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므로, 공무원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공무원의 역할과 행태에는 부정적이지만, 상당수 국민은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철밥통, 무사안일, 비전문성, 무영혼 등 부정 일색이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는 법 해석과 과학적 근거, 갈등관리 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공무원은 광범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루하루 제공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행정은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작동한다.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실현되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공무원의 명예는 상관의 명령을 마치 자신의 신념처럼 받아들여 그대로 수행하는 데 있다.”라고 관료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그런데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갇힌 공무원의 처지가 안타까워 저자는 그 자신을 돌아보며 동료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공무원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겪고 대응하며 힘들었던 그 마음을 함께하려고 이 글을 썼다.
1장과 2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이념과 제도가 행정의 현실에서 실제로 표출되는 양상을 나름의 경험과 생각으로 정리했다.
3장, 4장, 5장은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행정에 침투해 작동하는지, 지역 축제와 기업 유치 활동, 노동단체와의 갈등을 통해 조명했다.
6장과 7장은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비판에 대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을 변론하고자 노력했다.
8장은 행정학 이론과 행정 현실과의 틈새를 줄이고자, 실제로 맞부딪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특성과 원칙을 피력했다.
공무원과 국민은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다. “행정은 쇼이고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과거 어떤 단체장의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무원은 국민의 이웃이고 동료이자 기본권을 가진 또 다른 국민이다. 이 책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는 공무원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