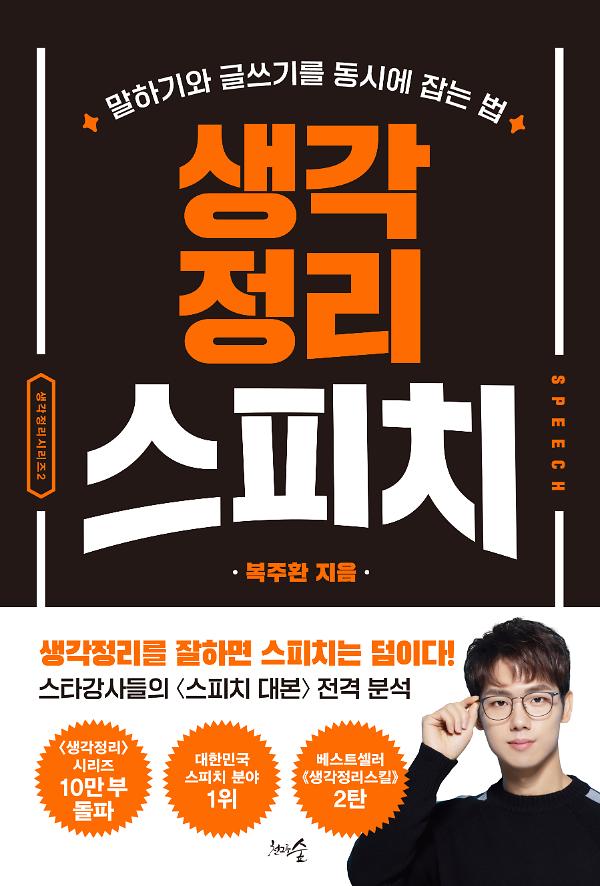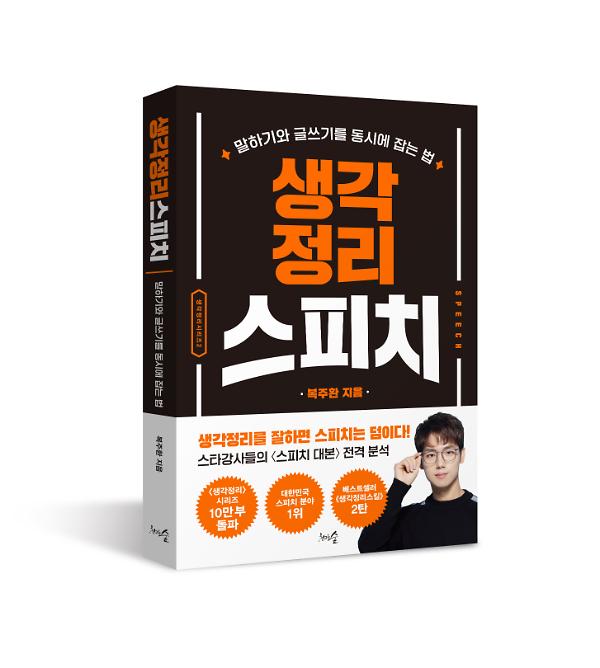아이러니하게도 스피치 책이 아니라 글쓰기와 기획을 연구하며 말을 잘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렇다! 생각과 글과 말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말 따로 글 따로 배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 p.16
생각이 정리된 사람은 간결하게 이야기해도 분명히 전달된다. 목소리가 작아도 강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사투리를 써도 정확하게 표현된다.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p.30
스타강사들은 바쁜 일정에서도 부지런히 책을 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완성하기도 쉽지 않은데 책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글쓰기야 말로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다. --- p.34
분석한 스타강사의 논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뼈대는 남기고 내용만 바꾼다. 티 나지 않게 단어를 바꿔보자. 놀랍게도 스타강사가 말했을 때 감동하는 타이밍에 내가 말해도 청중은 감동하고, 스타강사가 말했을 때 박수 받는 타이밍에 내가 말해도 박수를 받게 된다. 애당초 그런 논리였기 때문이다. --- p.59
스피치를 시작할 때 청중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은 긍정적 감정(행복, 만족, 기쁨 등)과 부정적 감정(짜증, 우울, 분노 등)으로 나뉘는데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학습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 p.66
스피치 시작의 역할은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사는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한다. 창의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는 데서 만들어진다. --- p.93
유머는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집중시키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스피치를 시작할 때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이면 연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기대감이 생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어설픈 유머는 삼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연사가 가벼워 보이고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pp.98-99
청중이 당신의 스피치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다면 요점을 정리해줘야 한다. 요약을 잘하고 싶다면 '논리구조' 형식의 대본을 만들고 핵심만 간추리는 훈련을 많이 해보면 좋다. --- p.123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뽑아 목차를 만들 줄 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질문을 나열하고,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혹은 궁금한 순서로 재배열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만 덧붙이면 스피치 대본이 만들어진다. --- p.147
말을 잘하는 사람은 스피치 도입부에 제목과 주제 등을 언급하여 상대방의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제목부터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p.189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면 그냥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메모'를 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메모해 두었어도 목적 없이 메모하면 스피치를 할 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 p.214
스피치 대본을 만들 때 디지털 마인드맵을 추천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방대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세밀하게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피치의 줄거리는 목차로 만들어 두면 좋다. 한 페이지로 논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내용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 pp.25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