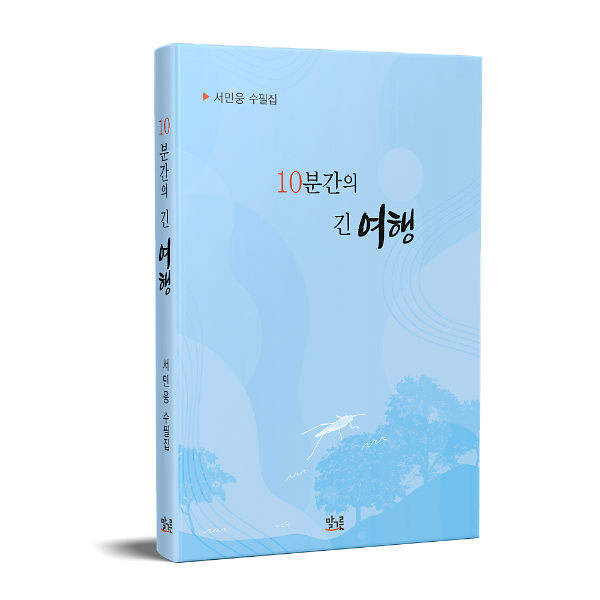서민웅의 〈메꽃〉은 메라는 텍스트와 어린 시절의 회상이라는 콘텍스트와 주관적인 감성과 객관적인 사실이 균형 있게 어울린 작품이다.
서문에서 소개하였듯이 텍스트는 완결된 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짜임을 이어가는 미완의 직물이다. 하나의 개념이 다른 이미지를 제기하는 가운데 다양한 글쓰기가 이루어진다. 메와 메뿌리와 메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원저자는 식물학자다. 식물학자가 정의하였지만 서민웅은 옛 기억을 되살리는 메가 지닌 텍스트성을 확장시켜간다. (p. 175)
-본문 중에서(박양근 평론가)
옥상은 다른 사람이 관심이 적은 곳에서 그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바깥세상을 엿보고 생각해 보는 창구이고, 넋 놓고 사색할 수 있는 자리다. 아침 하늘을 보고 그날의 날씨를 점치고, 계절에 따라 피는 꽃, 발갛게 익는 몇 개의 고추, 폐가의 가죽나무를 보며 바뀌는 계절을 느끼는 곳이다. 옥상이 있어 좋다. (p. 57)
-<옥상 보고서> 중에서
이놈들을 살려주는 방법은 없을까, 며칠 고민했다. 우렁이는 3급수는 되어야 산다는데 산골짜기 물은 너무 차고 맑아 적응하지 못할 텐데, 한강? 한강은 너무 깊고 물살이 빨라 살아남지 못해. 그러면 그 중간 지대? 결국, 하천으로 결정했다. 하천이라면, 청계천? 상류 쪽은 시멘트 시설물이 너무 많고 사람이 많아서 적지가 아니다. 한강으로 빠지는 청계천 하류쯤이면 물의 흐름, 천변의 잡초가 알맞을 거야. 오후 늦게 비닐봉지에 우렁이를 담아들고 지하철을 탔다. 용두역에서 하차해 청계천으로 내려섰다. 사위가 어두워져 갔다. 천변도 콘크리트로 쌓지 않고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농수로에서 살던 놈이니 작은 물살은 이겨내겠지. 우렁이의 귀향 의식을 치르듯 한 마리씩 수초 사이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p. 81)
-<청계천으로 간 우렁이> 중에서
나이 예순이 넘어 내 방에 큼지막한 책상을 들여놓고 보니 그 앉은뱅이책상이 생각난다. 책상바닥에 푸르고 검고 붉은 얼룩까지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아버지께서 책상을 사 오던 날, 하늘을 날 듯한 기분으로 마을 어귀로 팔짝팔짝 강아지처럼 내달리던 그 가을 저녁. 지금도 그날의 느낌이 내 몸속에 스멀스멀 깨어나는 것 같다. 되돌아보면 어릴 때 소박한 꿈은 모두 그 앉은뱅이책상과 얽혀 있다. (p. 129)
-<앉은뱅이책상> 중에서
다리 위에서 자란 이들 10종의 잡초에도 약용과 식용, 그 밖에도 이런저런 용처가 다양했다. 그래도 풀은 생색내지 않는다. 이런 풀을 잡초라고 홀대만 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잡초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잡초를 제거하되 전쟁을 선포하고 몰려오는 적군처럼 대하지는 말 일이다. 다산 정약용이 말하지 않았던가.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라고. 한 포기 풀도 곱게 보고 눈여겨볼 일이다. (p. 164)
-<풀에 배우다> 중에서
중위는 다행히 얼마 전 범인들을 잡았다. 그 민간인을 수사한 결과 카투사 공모자는 없었고, 민간인끼리 밤에 도강해서 훔쳐 갔다고 수사를 종결했다. 임진강 건너 문산에 외출 한 번 나가지도 못했는데 민간인과 공모해 통신주를 훔쳐내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체증이 확 뚫리고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중위가 한마디 덧붙였다.
“범인이 잡혔으니 망정이지, 안 잡혔으면 너라도 대신 잡아넣어야 했어. 난리 치는 언론을 무마하려면.”
갑자기 울렁증이 났다. 사실이든 아니든 얼마나 섬뜩하고 끔찍한 일인가.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야 하나. 운수 사나운 날이라고 해야 하나. (p. 222)
-<운수 좋은 날> 중에서
“오늘이 며칠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나?”
마당에서 눈을 치우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스님을 망연한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전날 새해맞이를 한다고 여러 신도와 밤새워 불공을 드렸는데 날짜를 모르다니…. 저렇게 세상을 잊고 정진하는 스님이 진정 스님일 거야. 퍼뜩 스님과 신도가 지붕에서 눈 퍼 내리는 사진을 새해 첫날 신문에 크게 실으면 잘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은 그쳐갔다. (p.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