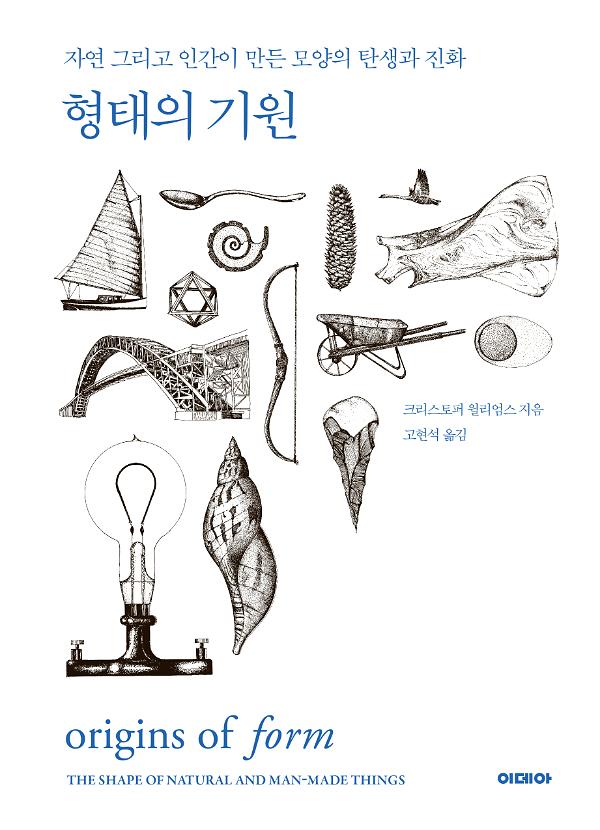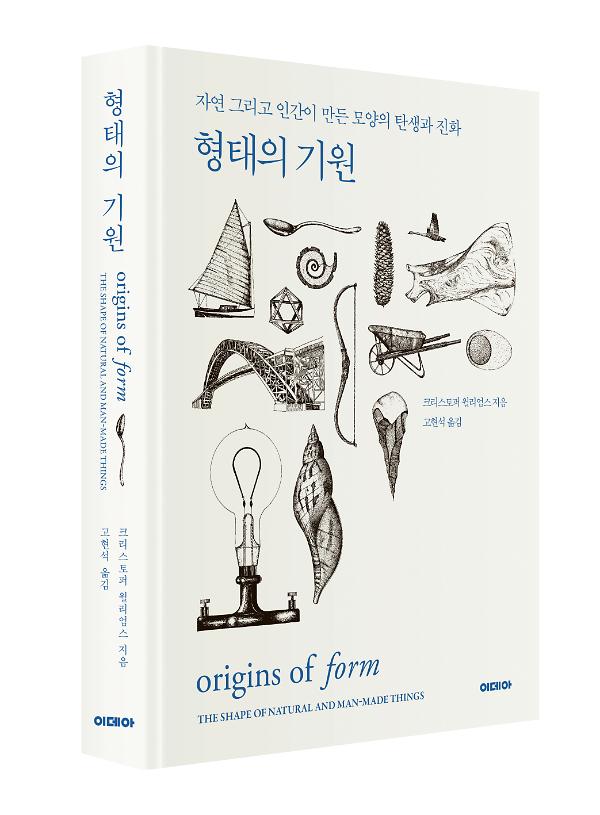모양, 크기, 비율 등 모든 형태에는 이유가 있다
인류학, 고생물학, 지질학, 구조공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넘나드는 이야기
생물, 무생물, 도구, 구조물, 건축 등 수백여 개의 삽화를 통해 읽는 재미 더해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환경의 형성 과정 그리고 진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티라노사우루스와 현수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간의 흉곽, 비행기, 들소는 서로 어떤 점이 비슷할까?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단단한 구조는 무엇이고 과학적 기원은 무엇일까? 나무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비단 중력만일까?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효율적이라는데 크기만의 문제일까?
이 책은 우리가 속한 물리적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인간의 환경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경험을 공유한다. 생물학, 인류학, 지질학, 고생물학, 형태학, 역학, 구조공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사물의 형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수백여 개의 그림들과 함께 제공한다.
나무의 뿌리, 인간의 다리뼈, 비행기의 날개
책의 저자 크리스토퍼 윌리엄스는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현상들 그리고 너무 당연해 보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날카로운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파고든다. 모든 평범한 것들을 평범하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목하지 않은 모든 것에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얻은 과학적 통찰을 선보인다. 이 책의 장을 나누는 구분이기도 하는 물질, 구조, 크기, 기능, 세대, 환경 등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구축되고 변화, 진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형태의 기본을 이루는 물질, 그중에서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구조는 환경으로부터 받는 힘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결합한다. 예컨대 나무의 뿌리, 인간의 다리뼈, 비행기의 날개는 모두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구성과 구조는 다르다. 인간의 다리뼈는 나무의 뿌리보다는 덜 유연하지만, 비행기의 날개보다는 유연하다. 실제로 인간의 다리뼈 중심부는 매우 단단하지만, 끝부분은 놀랍도록 유연하며 이 둘은 매우 조화롭게 구성된다. 동물 뼈의 끝부분은 무수히 많은 ‘잔 기둥’들에 의해 유연성이 구현되지만, 비행기의 날개는 그러지 못하다. 그렇지만, 인간은 비행기 날개를 설계할 때 이를 형태적으로 모방하고 극복하려고 한다.
한강철교와 새의 구조
세상의 모든 형태는 팽팽하게 만드는 힘, 압축을 받는 힘, 비틀리게 만드는 힘, 어긋나게 만드는 힘, 구부러지게 만드는 힘에 영향을 받는다. ‘구조’는 이 힘들(응력)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조건 중 하나이다. 구조에서 흥미로운 점은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익숙한 예를 들어보면, 인간 신체의 구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만, 새(조류)의 구조에 비해 경제성은 낮다. 인간을 비롯한 육상 동물의 구조는 고체(뼈)와 액체(골수)로 이뤄져 있지만, 조류는 텅 빈 튜브 형태를 띤다. 조류의 뼈는 투명할 정도로 매우 얇지만 작은 구슬 모양으로 이뤄져 강도를 높이며, 응력을 강하게 받는 날개의 뼈는 삼각형 그물망 구조로 되어있다. 이 그물망 구조는 직선 철봉을 삼각형으로 조립한 트러스(truss)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강철교처럼 강철로 된 트러스교와 새의 날개 구조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가볍지만, 튼튼해야 한다’는 경제성에 기초한 구조라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비슷한 것이다.
지금도 원형이 보존되고 있는 고대 로마 시대의 돌다리(마치 한국 선운사의 승선교)와 지금 어느 박람회장이나 SF영화의 우주 전초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돔 구조의 건축물은 모두 여러 삼각형으로 맞물려 압축력을 높인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 구조를 따르고 있다. 심지어 뉴욕과 런던 사이를 오가는 비행기의 경로 또한 그렇다. 책에서는 이렇듯 자연의 일부, 인간이 만든 사물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그 과학적 기원을 같이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수많은 삽화가 함께 있어 시각적인 이해를 돕는다.
무엇보다 ‘크기’
모든 ‘구조’를 압도하는 형태는 ‘크기’라고 책은 강조한다. 자연에서도 100m가 넘는 세쿼이아와 작은 관목, 코끼리와 딱정벌레, 그리고 빌딩과 미니어처와 같은 인간이 만든 사물 등에서 크기는 형태의 가장 큰 요인이다. 책은 ‘역학적 상사 법칙’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공학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 법칙은 매우 직관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건물은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처참하게 부서질 수 있지만, 장난감 자동차나 모형 건물은 같은 비례의 힘을 받아도 그리 심하게 부서지지 않는다. 기하학적으로 형태가 같아도 크기가 큰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역학적 상사 법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물리적·역학적 외부 요인이 작용해 이 법칙이 구현되는지 정밀하고 세밀하게 설명한다.
황금비율과 고둥
이 밖에도 가장 완전한 구조의 형태가 무엇이며 실현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 소위 완벽한 수열이라고 하는 ‘피보나치(Fibonacci number) 수열’과 잠자리의 날개, ‘황금비율 나선’과 고둥의 형태, 벌집이나 주상절리처럼 육각형의 모양을 갖는 형태를 고무풍선 실험에 비유하는 부분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흥미를 선사한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농기구인 따비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형태가 같은지, 거대한 유조선은 계속 건조되며 진화하지만, 갯벌에서 사용하는 배는 왜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지, 반면 똑같은 기능을 가진 도구(예컨대 스패너)이면서 산업혁명 이전의 형태와 이후의 형태가 왜 달라졌는지 등 모든 사물은 진화(진보)하지만, 그렇지 않은 형태에까지 저자의 관심은 확장된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아, 저 형태의 기원은 이렇구나’라는 지식도 얻지만, 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물을 마주하면 ‘저 형태의 기원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호기심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