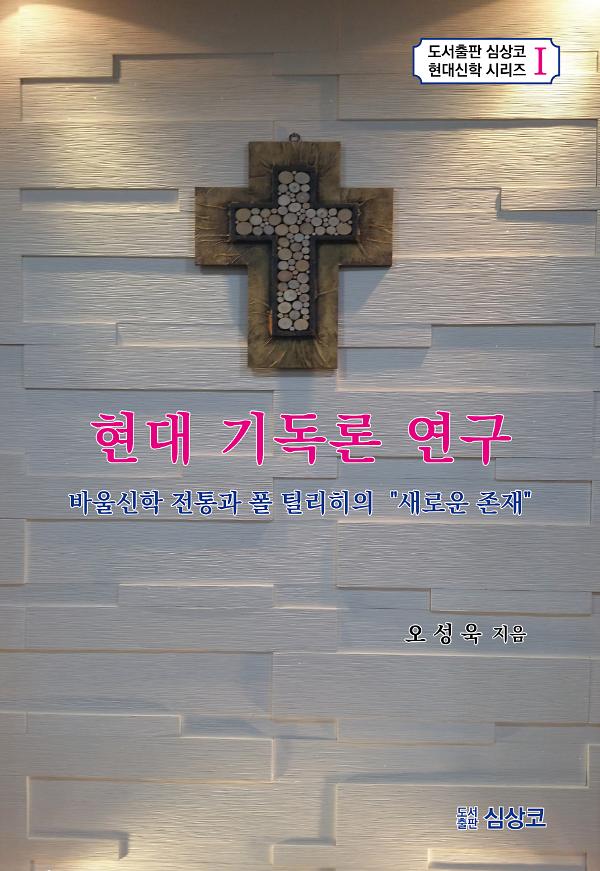1. 문제 제기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현대 신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칼 바르트(Karl Barth)와 함께 신정통주의를 대표하는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된다. 그러나 틸리히에 대한 연구의 양(量)과 질(質)이 바르트에 대한 연구의 양(量)과 질(質)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부인할 길 없다.
이러한 작금의 연구 현실은 틸리히를 너무 쉽게 '종교학자' '철학적 신학자' '자유주의 인문학자' 등등으로 분류한 후, 모호하다는 변명과 함께 연구를 종료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혹은, 틸리히의 의도를 너무 명제적으로 축소ㆍ왜곡한 다음, 연구자들의 신앙 잣대를 동원하여 형해화(形骸化) 하고난 후, 세심한 관찰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을 생략한 채, 연구를 서둘러 마감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틸리히는 단숨에 간파할 수 있는 빈약한 논리로 자신의 신학을 개진하고 있지를 않다. 틸리히는 천의 얼굴을 가진 신학자이다. 그의 신론(神論)은 종교학적 인식론에 깊게 경도되어 있고, 기독론은 실존주의 철학적 맥락에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교회론은 다분히 플라톤적인 이중 구조를 염두에 두고 전개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 위에, 틸리히의 역사관은 묵시ㆍ예언적 역사의식을 충실히 보여주며, 특히 바울신학의 묵시 사상적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신학 논지 전개에 중요한 해석학적 거점으로 명토박고 있다.
그러므로 틸리히의 신학사상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의 신학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철학적 맥락을 이해함과 동시에, 철학적 사유가 닻을 드리우고 있는 틸리히의 역사 신학적 전망과 성서 신학적 혜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틸리히의 기독론적 이해를 증례(證例)로 들어본다면 틸리히의 텍스트(text)에서 우선, 실존철학과 하이데거의 언어군(群)을 이해해야 한다.동시에 바울신학에서 보여주는 묵시적 기독론 및 "영의 임재"(Spiritual presence)라는 개념에 대한 성서 신학적 전망을 요청한다.
이처럼 틸리히의 사유는 복합적인 복선구조를 하고 있어서, 사유의 얼개와 층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해석시도는 신학적 대화가 아니라 완고한 신학적 독백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애석한 점은 틸리히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신학적 모놀로그가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세(勢)를 이루고, 지지(支持)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척박한 틸리히 연구 토양에서 필자는 틸리히의 기독론을 연구과제로 택했다. 왜냐하면 틸리히의 신학사상 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기독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틸리히 기독론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해는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본문 pp.17-19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