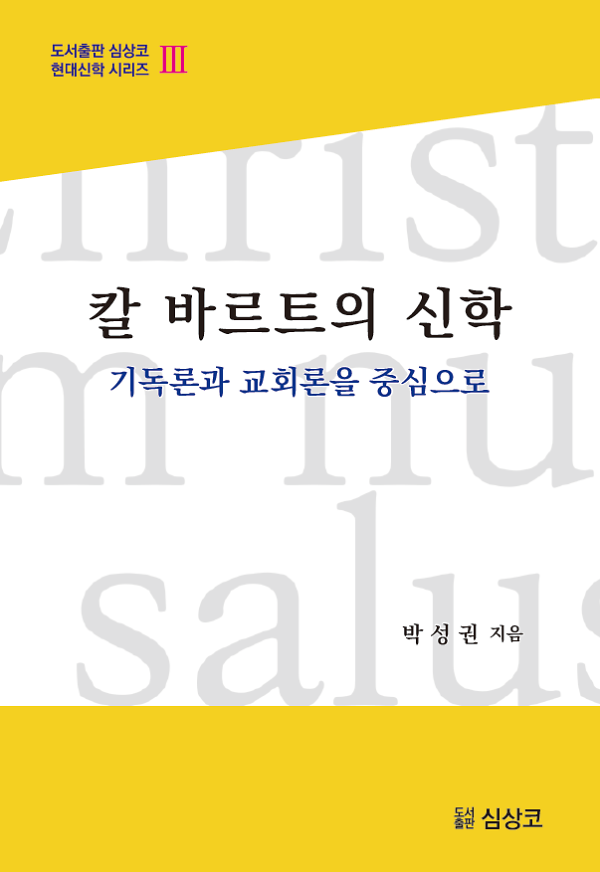신학자로서 나름의 여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여정 가운데 다소 간의 변화와 추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학교 내에서 신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님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목회 현장에서 목회와 연구를 병행하는 저와 같은 인물에게도 신학 여정에서 변화와 발전 혹은 추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Th.M.)을 밟을 때만 해도, 당시 학교 내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모두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를 전공한 분들이셔서, 자연스럽게 바르트 신학을 수업 시간에 접하면서 그 신학을 배웠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안에는 김균진 교수님과 김광식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들로 계셨는데, 두 분 모두 한국 바르트학회장을 역임하셨을 정도로 바르트 신학 전공자들이셨습니다. 이후 김광식 교수님은 감리교신학자이자 토착화신학자로서의 면모를 더욱 발전시키시고, 김균진 교수님은 본인이 박사과정 때에 공부하신 내용을 수십 년 간의 연구를 통해 또한 스승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현재) 교수님의 영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신학”을 정립하시지만, 제가 6년간 학교에 다녔던 시기에는 바르트 신학이 두 분 교수님을 통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석사학위 논문을 바르트의 기독론에 대한 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논문이 이 책의 제1부인 “칼 바르트 기독론에 나타난 ‘순종’의 개념 연구”입니다.
이후에 저는 목회자 후보생 교육과정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과정에서 후보생으로서의 경건 훈련을 받는 동시에, 신학 연구와 학술 논문을 쓰는 과정도 꾸준히 밟아서 석사논문도 썼습니다. 이 졸업논문도 바르트의 기독론에 대한 것인데,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가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서울신학대학교에도 바르트 신학 전공 교수님들이 조직신학 분야에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에서 다소 미진하게 연구된 기독론 부분, 즉 바르트의 부활 이해에 대해 연구하여 논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논문이 제2부인 “칼 바르트의 부활 이해”입니다.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독자적 연구를 하고 싶던 저는 다시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Ph.D.)으로 돌아갔고,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석사논문 지도교수님인 김균진 교수님에게 다시 박사학위논문까지 지도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교수님의 정년은퇴와 동시에 저도 졸업을 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 받은 3인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균진 교수님에게서 박사논문을 지도받기 전에 제게는 석사논문 두 편을 확장하고 심화시켜 바르트 신학에 대해 학위논문을 쓰고자 한 계획이 있었으나, 제 계획과는 달리 지도 교수님의 지도 가운데 저는 “몰트만의 신론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당시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래도 회고하자면 저는 바르트 신학에 대해 두 편의 석사논문을 쓰고 또한 몰트만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난 뒤에, 다시 이후에 학술논문을 바르트의 교회론에 대해 쓴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학위과정과 독자적인 연구 시기를 통해 두 신학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감히 바르트의 신학과 몰트만의 신학에 대해 간략한 나름의 평을 하자면, 먼저 제게 스위스 사람으로서 바젤(Basel)의 신학자였던 바르트는 상당히 목회친화적 인물로 생각됩니다. 이미 바르트에게는 젊은 시절 10년을 넘게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담임 목회를 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평생 대학교 강단에 있을 때조차도 설교자를 향한 연구와 교육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잘 알려진 바대로 상당하여 바르트의 원숙기에 기록된 교의학 이름은 “교회 교의학(Church Dogmatics)”입니다. 실제로 바르트의 교의학과 그 이외의 많은 바르트의 글들에는 신앙인들을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통찰력과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지금도 바르트의 문헌들을 읽고 목회에 도전을 받곤 합니다. 비록 그의 시대적 상황과 제 시대적 상황은 다르다고 해도 말씀과 신학 독서를 통해 이러한 일은 제게 지금도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독일 사람인 몰트만은 독일대학교에서 철저히 배움을 쌓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자신의 길을 잘 찾아 튀빙엔(Tübingen) 대학교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학자로 부상한 인물로 생각됩니다. 그의 글은 목회적으로는 바르트에 비해 약하다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받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공감 있게 제시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시대를 함께 사는 그의 이야기를 그와 함께 호흡하며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몰트만에게 있습니다.
이전처럼 앞으로도 목회와 연구를 병행할 계획을 가진 저로서는, 몰트만 신학에 대해 계속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바르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 현장이 우선적이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재까지 제가 바르트 신학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한 것을 모아 출간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기회에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그냥 묻어 두기에는 아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두 편의 석사학위논문과 「한국조직신학논총」 39집에 발표된 “칼 바르트의 교회론”을 한 데 묶으면서, 이번에 저는 새롭게 내용도 추가하고 각주도 상당 부분 보완하면서 문맥도 다듬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다듬어 출간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아 내 놓으려고 합니다. 책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책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저처럼 목회자이면서 출판 사역을 병행하는 도서출판 심상코의 대표 백승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출판 사정임에도 제 생각을 들으시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오래 전 일이지만 논문을 지도하신 김균진 교수님과 황덕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균진 교수님은 박사학위 논문지도까지 해 주셨고 지금도 저와 만남을 지속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더욱 분발하고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 옆에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마선경 사모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귀한 아들들인 경배와 윤배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충남 공주에서
저자 박 성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