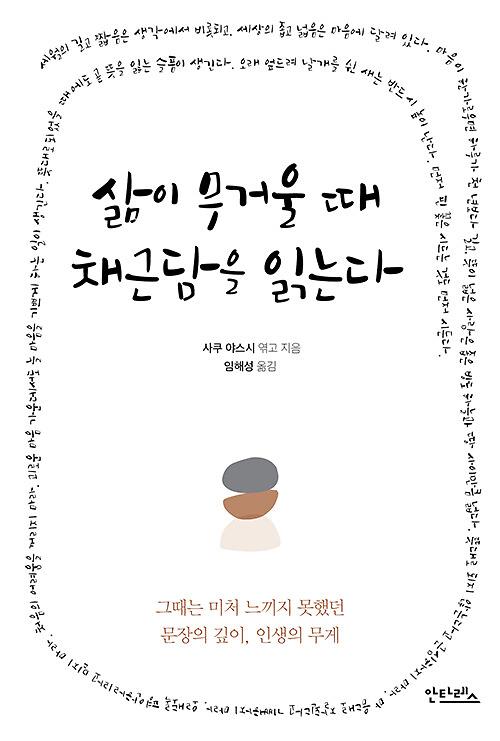험난한 삶의 갑옷이 되어줄 불멸의 인간학
중국 당나라 시대의 관료이자 시인이던 하지장(賀知章)이 지은 〈회향우서(回鄕偶書, 고향에 돌아온 심정을 적다)〉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어려서 고향 떠나 늙어서 돌아오니, 고향 사투리 그대로건만 머리털만 희었구나.”
하지장이 수십 년 동안의 벼슬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감회를 읊은 것인데, 세월의 무상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채근담(菜根譚)》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부싯돌이 빛나는 한순간의 삶을 살면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겠는가. 달팽이 더듬이와 같은 좁은 세상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상이 얼마나 크겠는가.”(후집 13)
아웅다웅, 옥신각신하며 살기에 인생은 짧다.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때로는 이 한 번뿐인 짧은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 책 《삶이 무거울 때 채근담을 읽는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쉽게 주변에 휩쓸리는 여린 마음,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한 집착과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능숙하게 다스리는 법을 알려준다. 맑고 바르게 사는 일은 쉽지 않지만, 올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소중히 간직한 채 스스로의 힘을 믿고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나물뿌리를 씹어먹는 마음으로 삶을 견뎌내다
《채근담》은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 명나라 말기 홍응명(洪應明)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다. 홍응명의 자(字)는 자성(自誠)이고 호(號)는 환초(還初)다. ‘채근(菜根)’은 ‘풀뿌리’, ‘나물뿌리’를 말한다. 《소학(小學)》에 인용된 송나라 때 학자 왕신민(汪信民)의 “사람이 항상 나물뿌리를 씹어 먹고 살 수 있다면, 능히 백 가지 일을 이룰 수 있다(人常咬得菜根, 則百事可做)”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채근’이 품은 의미는 나물뿌리를 씹어먹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산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다는 데 있다. 어금니를 꽉 물고 버티며 쓰러지지 않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채근’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거창한 게 아니라, 나물뿌리처럼 소박하고 담백한 것에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듯 《채근담》은 우리가 곱씹어야 할 삶의 교훈이 담긴 책이다. 삶이 무거울 때 《채근담》의 문장을 되새겨보자. 고전(古典)이라서 얼핏 생각하기에 읽기 어렵고 고리타분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와 같은 동양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서, 일단 읽기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고전 《채근담》을 새롭게 엮은 이 책 《삶이 무거울 때 채근담을 읽는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무겁고 힘겨운 삶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한 뒤 각 장의 핵심 메시지를 제목으로 만들고 해설을 덧붙여 지은 것이다. 《채근담》은 ‘전집(前集)’ 225장과 ‘후집(後集)’ 134장으로 모두 359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전집에서 90장과 후집에서 29장을 뽑아 범주를 나눈 뒤 119장으로 구성했다. 분량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지만, 원문에 비슷한 내용의 장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 책에서 말하려는 요지에 맞춰보더라도 본래의 《채근담》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지금의 역경은 훗날 얻을 행복의 자격
“세상살이를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살이 가운데에 있다. 굳이 인연을 끊고 세상에서 숨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마음을 깨닫는 길은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에 있다. 굳이 욕심을 끊고 마음을 꺼진 재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후집 41)
홍응명은 《채근담》에서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거나 굳이 초야에 묻혀 지낼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세속에 머물면서 세속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것이 이전의 은둔지향적인 책들과 사뭇 다르다.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말하는 인생 교훈담은 세상을 향한 원망의 넋두리로 흐르기 쉬운데, 《채근담》은 그것을 넘어서서 후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삶의 참된 의미를 전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채근담》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수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굳이 우리가 삶의 교훈을 얻고자 고작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유명인들의 언사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는 없는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홍응명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시대를 앞서간 선견지명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연을 세속을 벗어나 피난처로 삼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어디든 자연이었다. 자연과 융화된 삶의 방식이 인간과 인간 사회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여겼다.
오늘날 세계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번영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 끌어다 쓸 자원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으며, 개인과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경 파괴는 지구의 기후 자체를 변하게 만들었고,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다.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러우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혐오와 반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는 또 어떤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무작정 현실을 비관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로잡아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요즘 같은 상황이야말로 《채근담》이 담고 있는 지혜와 정신을 살릴 최적의 시기다.
보이지 않는 미래, 좌절뿐인 현재, 마음이 부러질 듯 삶이 무거울 때, 꿈이 있지만 길은 험하고, 혼자서 헤쳐 나가기 어려울 때, 지금의 역경이 훗날 내가 얻을 행복의 자격이라고, 나는 반드시 행복하리라고, 스스로를 믿어보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일이 막혀 궁지에 빠진 사람은 마땅히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성공해서 만족한 사람은 마지막 길을 내다봐야 한다.”(전집 30)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있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도 있다. 무엇이든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은 처음과 끝에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잘못되면 대개는 실패로 끝난다. 초심을 놓치면 당연히 실패할 것이고, 다행히 초심을 유지해서 성공을 거두더라도 끝이 나쁘면 그 또한 결국 실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품었던 뜻을 살피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헤아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 또한 미래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
잘되고 싶다. 잘나가고 싶다. 아름다워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법이지만, 욕심에 얽매인 마음을 조금만 풀어보면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보자.
―험난한 삶의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책
《채근담》은 현실의 냉혹함을 돌파하기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읽는 책”이라는 인식이 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변화와 혁신이 강조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홍응명이 과연 자신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더러 읽으라고 《채근담》을 썼을까? 아닐 것이다. 후손들이라도 자기가 깨달은 도리를 토대로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또한 우리를 힘들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의 속도 앞에서 끊임없이 강요되는 근면과 쇄신이다. 몸은 바쁠지언정 마음만은 여유로워야 하지 않을까? 이 책 《삶이 무거울 때 채근담을 읽는다》가 험난한 삶을 꿋꿋이 이겨낼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것이다.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문장의 깊이와 인생의 무게를 되새기며, 나물뿌리를 씹고 또 씹으면서 그 맛과 향을 음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