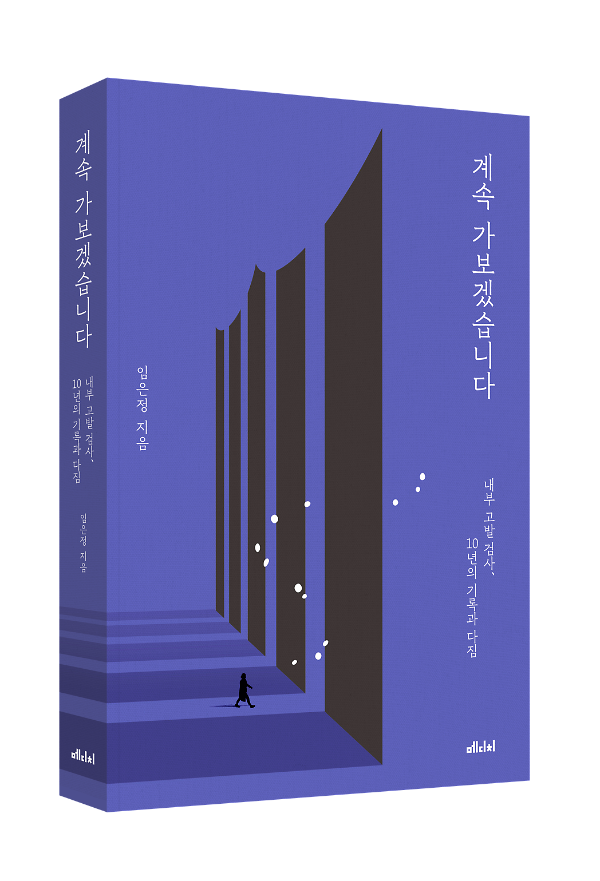■ 본문에서
내부 고발자로 팍팍하게 살게 되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였을까’를 더러 생각하곤 했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으로 소위 ‘잘 나가는 검사’에서 문제 검사로 급전직하한 2012년을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죄 구형을 해야 해서 무죄를 구형한 것에 불과하니 전환점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실질적인 전환점은 2009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때 법무부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개인적 일탈을 저지르는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투덜거리며,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 〈프롤로그〉 중에서
많은 분이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법정 최종 의견 진술인 논고가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은 후 저는 ‘검사는 공소장과 논고로 말한다’고 고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정가표처럼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횟수에 따라 양형이 거의 정해진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조차 구체적으로 논고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게야 양형 기준이 정해진 전형적인 사건이지만, 사건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그 가족에게는 생계가 걸린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 〈공판검사의 다짐〉 중에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법의 정신은 36.5도의 체온이 담긴 인간에 대한 신뢰와 연민입니다. 공판검사에게는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 우리 사회의 분노와 자책, 피고인에 대한 연민과 충고 등을 모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말할 의무가 있지요. 판사, 피고인은 물론 방청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더러는 법정을 떠돌고 있을 가여운 영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진심을 논고문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논고문에 대한 생각〉 중에서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조폭과 우리 검찰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 상명하복에 우선하는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검사 개개인이 고유의 법적 양심에 따라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 상급자가 끝내 불의한 지시를 거두지 않으면 최소한 그 지시를 거부하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을 때, 진실로 검사가 검사일 수 있고, 검찰이 검찰로서 자리매김합니다.
- 〈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중에서
거칠게 항의하던 그 검사들 상당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검사게시판에 맹렬하게 글을 쓰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검사들은 검찰과 검사에 대한 전제 개념, 검찰 위기의 원인 진단과 처방 등에 대한 견해가 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고, 이제라도 제 진심을 알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 혼자 목소리를 높이던 시절, 이프로스로 굳이 말을 걸어 ‘임 검사님의 진심을 믿지 않는다’고 항의한 모 후배에게 ‘누가 검찰을 위하는 가는 역사가 판단할 거다. 검찰이 이렇게 될 동안 침묵하고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중에서
법무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기획조정실에서 ‘국회의원들과의 술자리에 여성 검사들 필참하라’는 업무 연락을 돌리기도 했던 황당한 시절이었습니다. 검찰 간부들의 추행, 성희롱 따위가 문제 될 리 없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 역시 침묵해야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꽃뱀으로, 참으면 헤픈 여자나 불륜녀로 몰리던 시절이었지요.
- 〈검찰개혁을 위한 고언〉 중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지만, 그래도 겁이 나 뭘 먹어도 체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아침에도 그냥 눈이 번쩍 뜨인다. 겁이 나지만 어제로 시계를 돌린다고 하여 다르게 행동할 게 아닌데 견뎌내야지. 겁이 나지만, 오늘 하루도 축복임을 믿는다.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인다. 당장 바뀌지는 않더라도 결국 바뀔 터. 내 의지가 그 시기를 앞당기리라고 믿는다. 난 검찰이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왜 이렇게 비장해져야 하는가.
-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사 직권 재심 청구’ 보도를 접하며〉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부딪쳐 가다 보면, 철옹성 그 철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역사의 물꼬가 결국 트이는 걸 봅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최선인 양 주장하고 무죄판결에 불복해 온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간 도가니 사건 등 이런저런 참혹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세상은 물시계와 같구나, 사람들의 눈물이 차올라 넘쳐야 초침 하나가 겨우 움직이는구나, 사회가 함께 울어줄 때 비로소 역사가 한 발을 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불의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죽비 소리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합창을 위한 하모니로 인정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따뜻한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겠지요.
- 〈아이 캔 스피크 1〉 중에서
검사는 임관할 때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합니다. 수사의무와 공정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현실적으로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까지 차마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와 동일한 잣대로 검사들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다면, 누가 검찰의 결정에 승복하겠으며, 사회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검찰 구성원인 검사가 검찰을 믿지 못해 시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은 물론 검찰에게도 비극입니다.
- 〈나는 고발한다〉 중에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은 그 당시의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무죄를 무죄라 말하고 지난날 과오를 사과해야 할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우선 하는 관행과 조직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조직 논리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반성 논고를 결행했을 경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단독 관청인 검사의 유효한 논고입니다. 검찰 과거사 반성의 물꼬를 트기로 결단하고 결행했지요.
- 〈용서받지 못한 자들〉 중에서
“경찰 송치 사건이나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로 남을 것인지, 변호사들에게 뒷돈받고 소소한 사건들은 좀 봐주더라도 수사비로 거악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가 될 것인지, 잘 선택하라”고 초임 검사에게 조언하던 황당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큰 거악으로 보여 무서웠지요. 덮고 싶으면 소소한 악으로 단정하여 눈감고, 죽이고 싶으면 거악으로 규정하여 파헤치는 막무가내 검찰의 전횡을 봐버린 듯 아찔했습니다. 십 원짜리 사건과 천 원짜리 사건, 멋지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 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문제 검사에게 수사받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대는 과연 공정할까요.
-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 중에서
이제 그 검찰총장은 사퇴 후 정치권으로 바로 투신하여 대권을 거머쥐어 그동안 그가 지휘해 온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철권 통치 시도가 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네요. 공익 신고자인 검찰 구성원으로서 주권자 시민에게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고발합니다. 이런 검찰이 과연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 〈길모퉁이에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