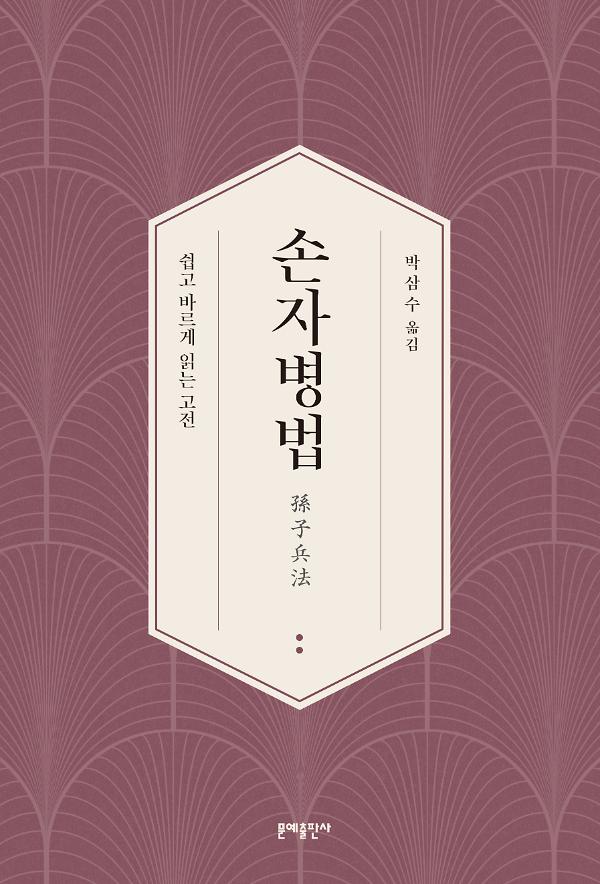P. 5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그야말로 다반사였다.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의 난세였던 춘추·전국시대는 더더욱 그러하였으니, 약육강식의 겸병(兼幷)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 당시 주 周 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제후국들이 병기(竝起)한 가운데 각국 사이에 정치 외교적 모순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력 충돌이 빈발하였다. 사서(史書)의 기록에 따르면, 크고 작은 제후 열국이 전후하여 무려 일백수십 여(餘) 국이나 출현해 부침을 거듭하였다. 빈발하는 전쟁은 걸출한 전쟁 영웅들을 무수히 길러 내는 한편, 병법 兵法의 이론적 체계화에 대한 욕구를 분출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전쟁 영웅들의 풍부한 경험은 곧 병법 이론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용병(用兵) 전쟁의 실례(實例)와 이론적 사유(思惟)의 소재(素材)를 제공하였다. 『손자병법』은 바로 그 같은 배경하에서 탄생된 현존 최고(最高)의 고대(古代) 병법서(兵法書)이다.
P. 28이 편에서 손자는 먼저 전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최대한 진지하고 신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사로 백성의 생사가 걸린 영역이요, 나라의 존망이 달린 관두(關頭)이기〔兵者, 國之大事,死生之地,存亡之道〕” 때문이다. 그러니 전쟁은 진정“ 깊이 궁구하고 신중히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不可不察也〕”는 얘기다.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사전에 반드시 피아에 대한 제반 여건과 요소들을 세심히 따져 꼭 군사를 일으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전쟁을 꼭 해야 한다면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여야 하며,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 함부로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전쟁에 대한 신중론은 바로 손자의 병법 연구와 군사 전략의 기본정신이다.
P. 62전쟁은 양날의 칼과 같다. 적을 무찌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당대(唐代) 이전(李筌)이 이른 대로, 이로움과 해로움은 서로 상대에게 기대어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먼저 그 해로운 바를 자세히 안 연후에야 비로소 그 이로운 바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세상만사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이해득실이 서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폐해와 환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절한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다. 하여 손자는 힘주어 말한다. 전쟁할 뜻이 있다면 ‘용병의 이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용병의 폐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그 최소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P. 159군대는 합리적인 조직 편제로 엄정하게 통제 관리하고, 우월한 전투태세를 바탕으로 용맹한 기상과 사기를 고취시키며, 천하무적의 군사 실력을 길러 막강한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그 같은 ‘자기보전〔自保〕’ 내지 자기 충실을 발판으로 공수 작전에 임할 것이며, 특히 적절한 속임수를 구사해 적이 우리의 기만과 유인에 미혹케 한다면 “이미 패배의 구렁에 빠진 상대〔已敗者〕”(「형」)는 어렵지 않게 쳐부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충실을 ‘정(正)’이라고 한다면, 속임수는 ‘기(奇)’라고 할 수 있는데, ‘기정상생’의 전술적 효과는 진정 막대하고 또 무궁할 것이다.
P. 330전장에서 장수는 자신의 군대가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하여 긴밀히 상호 호응·협력·구원할 수 있도록 통솔하여야 한다. 그것은 마치 “그 머리를 공격하면 즉각 꼬리로 응수해 오고, 그 꼬리를 공격하면 즉각 머리로 응수해 오며, 그 몸뚱이 가운데를 공격하면 즉각 머리와 꼬리 두 가지 모두로 응수해” 오는 솔연 뱀처럼 유기적인 협동 체계를 구축해 어떠한 적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수가 어떻게 군대를 그같이 이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손자가 생각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군사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소위 ‘부득이’함이 곧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적극적으로 서로 구응(救應)하게 하는 근본 동력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