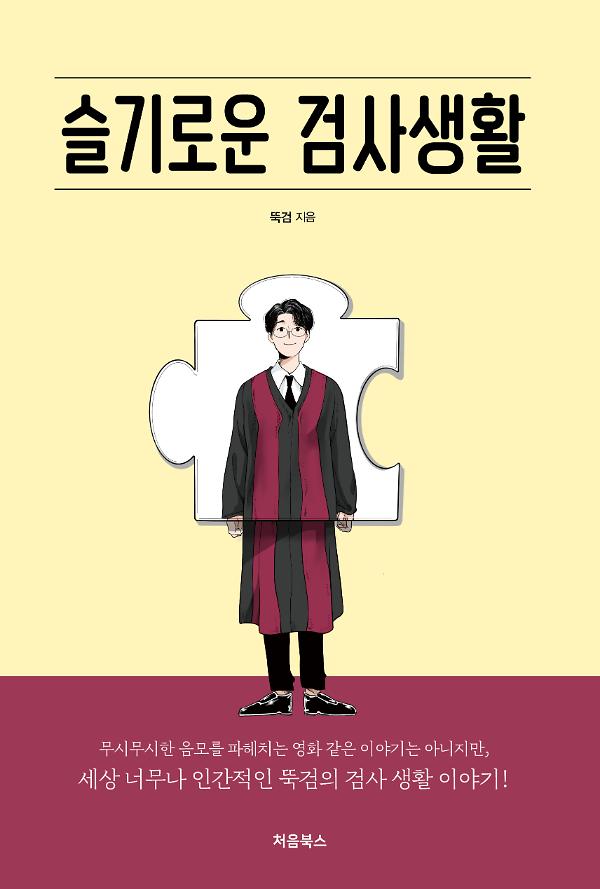검사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검사라는 직업 특성상 <명탐정 코난>만큼이나 사건 사고가 뒤따르다 보니 소재가 풍부하고, 인원이 적은 탓(검사의 정원은 검사정원법에 따라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에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다 보니 그 삶이 궁금하기도 해서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자신의 직업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저건 말도 안 돼!’라거나 ‘저건 고증이 잘 되었네!’라는 추임새를 넣으며 몰입하듯이 나 또한 검사가 등장하는 작품에는 동질감을 느끼며 푹 빠져들곤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습검사와 초임검사라는 이름의, 어딘지 모르게 서툴고 엉성하지만, 오지랖이 넓다고 느껴질 정도로 인간적이고 열정 하나만큼은 세계관 최강인 등장인물을 하나쯤은 마주한다.
_p.13(좌충우돌 검린이)
꽃샘추위가 한풀 꺾이고 산들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꽃의 계절이 찾아온다. 자줏빛 꽃의 우아한 자태가 당나라 현종의 왕비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양귀비. 꽃이 지기 전 꽃봉오리에 칼집을 내어 흘러나온 즙액을 끓이고 말리면 점액 덩어리가 남는다. 그게 바로 아편이다. 아편은 통증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 까닭에 아편을 가공해 만든 모르핀이 널리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심각한 환각 증상과 중독을 일으키기에 우리 법은 양귀비와 아편을 마약으로 정하고 있다.
그 꽃이 피어날 즈음이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양귀비는 번식력이 강해서 물 따라 바람 따라 흘러 다니다가 농가 앞마당에 자리를 잡곤 한다. 더러는 양귀비의 효능 탓에 이웃에서 씨앗을 얻어다가 상비약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이들도 있어 단속 건수는 의외로 많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양귀비의 계절이 오면 시골 검찰청에는 양귀비 사건이 쏟아진다.
_p.39(영감님, 우리 영감님)
초임검사 시절의 나에게도 복수의 가치가 충돌하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반려동물 사건. 최근 들어 개정 논의가 활발하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법의 관점에서 동물은 물건이다.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무생물처럼 자연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권에 대한 개념이 발전했고, 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다르므로 그 소유자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지금은 동물에 대한 서로 다른 법률적인 해석이 빅뱅을 일으키는 과도기인 셈이다.
_p87(래브라도레트리버)
아수라장이었다. 방송국 중계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녔고, 경찰관들이 아파트 한 동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어떤 아이는 잠옷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나온 남자에게 안겨 울고 있었고, 다리가 풀린 듯 맨발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자도 있었다. 허공에는 새카만 연기가 휘날렸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 사이사이에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뚝 검사입니다. 현장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그 사이사이에서도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다. 알코올로 무언가를 닦은 듯했다. 불길은 잡혔지만 연기가 자욱했다. 최초발화점이라는 그 집은 열기로 그득했다. 폭압에 터진 유리 조각과 뜯겨 나간 현관문이 처참했다. 현장이 정리되면 자세히 둘러보기로 하고, 분주한 현장을 피해 계단실 문을 열었다.
계단을 따라 한 층을 내려갔다. 나는 아직도 그때 눈앞에 펼쳐졌던 광경을 잊을 수 없다. 선혈이 소방호스가 내뿜은 물에 섞여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얀 벽면에는 피 묻은 손자국이 잔뜩찍혀 있었다. 손자국 하나하나가 살려 달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다. 계단 한편 주인 잃은 신발이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단순한 강력사건이 아니었다. 대형 참사였다.
_p.244(그해,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