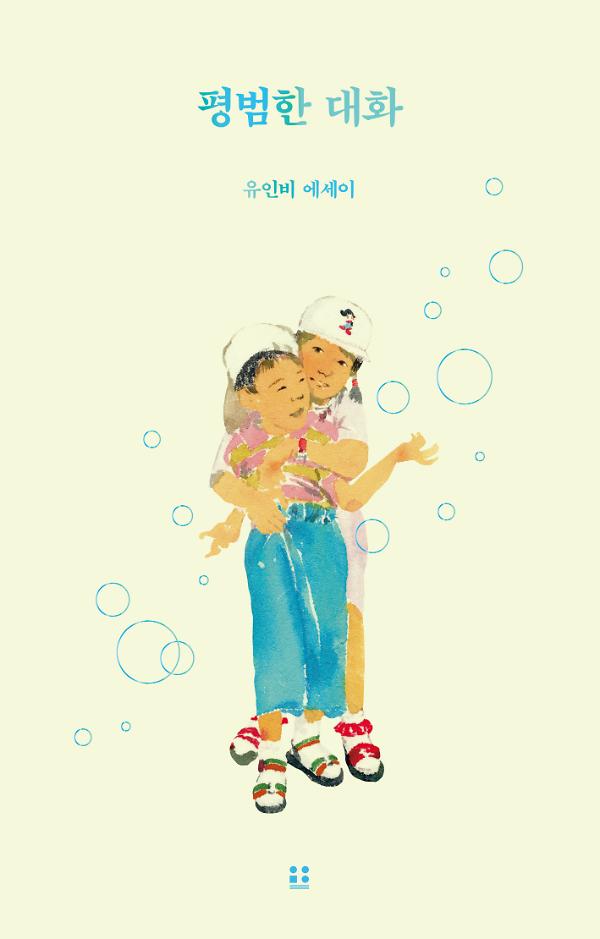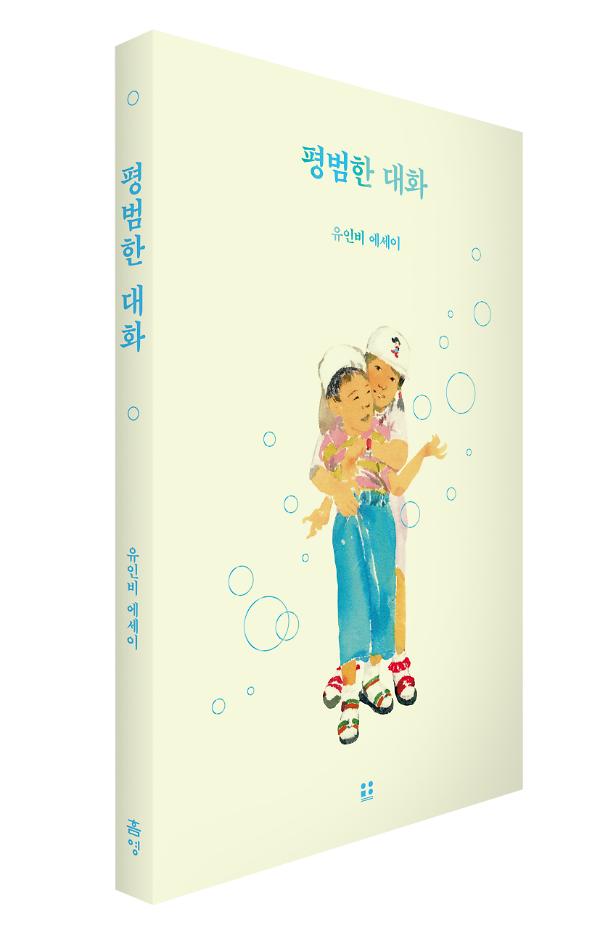8쪽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특수교사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극적인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왜 그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만큼 극한의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비장애와 일반교사를 평범함이란 범주에 넣어 놓고 장애와 특수교사를 평범하지 않다 여기는 것. 비장애는 감사한 것이고 장애는 불쌍한 것으로, 일반교사는 좋은 직업(profession)인 반면 특수교사는 좋은 일(vocation)로 여기는 선입관 때문은 아닐까.
48쪽 평범함과 특별함은 환절기의 일교차와 같다. 아침과 밤에는 마치 다른 계절인 양 낯설지만 낮이 되어 평균기온을 되찾으면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다. 새벽의 서늘함도 한낮의 포근함도 모두 하루라는 삶의 일부다. 모두가 새벽의 온도와 한낮의 온도를 품고 살아간다. 어느 시간엔 평범함 속에서, 또 어느 시간엔 특별함 속에서. 다양한 색깔의 단풍처럼 곳곳에 일교차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기면서 말이다.
69쪽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부모의 소원. 그 소원엔 오직 장애를 가진 아이와 그의 부모, 단둘만 존재한다. 비장애 형제는 그 이야기에조차 끼이지 못하고 가리어져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 소원 안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나는 그 소원이 왠지 밉다.
73쪽 그의 앞에 놓인 박스에는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꾸준히 도와 달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모두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 모른 척, 못 본 척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다.
100쪽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졸업식은 조금 천천히 왔으면 하는 행사 중 하나다. 해가 바뀌면 학교의 정규과정을 잘 따라와 준 아이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격려를 보내는 것은 마땅하나, 아이들에게 곧 다가올 새로운 시작이 그리 밝지만은 않기에 졸업을 축하한다는 말이 도통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졸업 후 갈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106쪽 어떻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장애는 비장애보다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누가 그들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가.
130쪽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라면 무언가를 대신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을 수도 없이 마주할 것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장애인들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을까? 정말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일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도 내가 대신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저 동생에게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