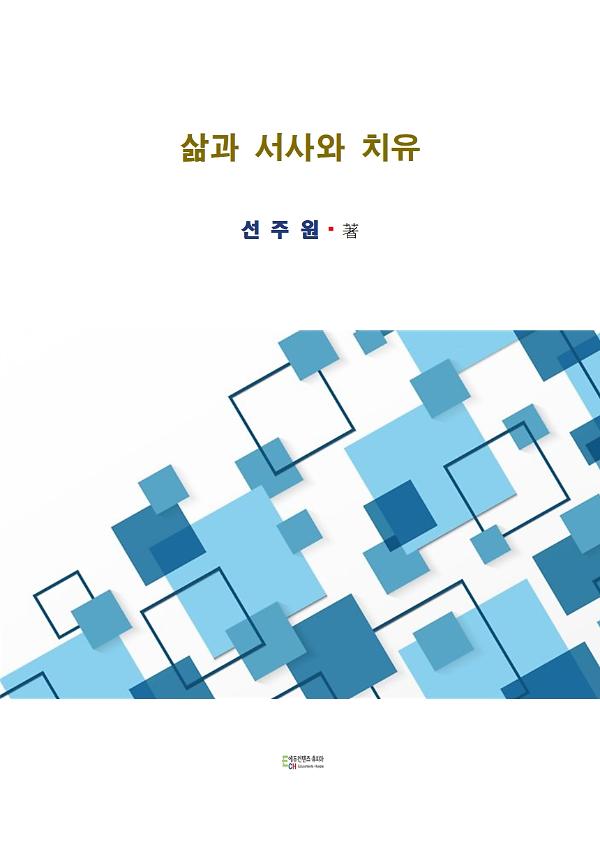우리는 저마다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답을 끝없이 찾으면서 인생사를 만들고 있다. 시지포스처럼, 무수히 넘어지고 상처받으면서도 걸어야만 하는 인생의 숙명을 짊어진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마다 우리를 붙잡아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생에 대한 애착일 것이다. 극한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생에 대한 애착. 그 애착이 이야기를 하고 듣는 존재로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우울을 애도할 수 있게 했다. 그 애도를 통해 우리는 타자에 대한 혐오와 수치를 넘어서 실존적 기투라는 생산적 삶을 도모할 수 있었다.
루카치가 말한 것처럼,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며 인생의 빛나는 순간들과 웃음을 천천히 생각하던 꿈같은 시간들은 끝난 지 오래다. 감정이 아닌 이성, 주관성이 아닌 객관성 등을 굴레처럼 짊어진 채, 온몸에 지져진 인생사의 상흔으로 고통 받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인 지는 오래다. 그 시간들에서 우리는 고독과 회한, 환멸과 우울에 시달리면서 병적인 자아도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병적인 자아도취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가슴의 통증을 달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적인 자아도취는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뻔히 보이는 파멸의 길에서 끝없는 자책과 자학으로 생을 끝내야 했던 오이디푸스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 상생과 갱생,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한 애착, 병적인 자아도취가 아닌 타자에 대한 지향 등을 실천하는 실존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성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성찰하는 데서 출발한다. 아울러 2020년대라는 ‘지금-여기’의 상황이 안고 있는 타자에 대한 배척과 혐오, 폭력적 정동의 점증 등에 의한 감정적 격동의 폭발을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서 출발한다. 그 출발은 서사적 존재로서 우리가 타자와 ‘함께 함’을 지향하면서 인간다움이라는 서사 윤리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인간다움이라는 서사 윤리 형성은 이상적 자아에 매혹되지 않고, 슬픔과 우울을 애도하면서 타자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우울의 극복을 위한 삶의 서사화를 통해 실존적 기투를 실천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서사 윤리 형성을 통해 우리는 병적인 자아도취나 타자에 대한 가학, 자신에 대한 자학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생산적으로 설계하는 공동체적 치유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연민의 태도로 타자를 이해하고, 혐오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수치의 태도로 자아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상을 통해 현실을 변혁하여 존재의 심연을 확장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아 성찰과 서사 윤리 형성은 궁극적으로 삶의 진정성과 관련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산다는 것의 의미’를 탐색하는 기반이다. 아울러 우리가 과도한 기억이 아닌, 망각의 구성 작용을 통한 새로운 기억의 생성으로 잘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이 책은 기획되고 저술되었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의 삶,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슬픔과 우울, 트라우마와 상처, 삶의 서사화와 기억의 문제, 연민의 태도와 타자 지향, 혐오사회와 사회의 공공선 추구, 수치의 태도와 자아 성찰, 환상을 통한 현실 변혁, 서사 읽기를 통한 치료, 은유적 서사 읽기를 통한 치유 등이 이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것들은 이전 시대에 비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감정적 격동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감정적 격동을 치유하고 서사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이 책에 담겨진 것들이, 낮에 물레를 돌려 베를 짰다가 밤에 다시 베를 풀었던 페넬로페의 시간처럼, 도도하고 급격한 시간의 흐름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기 바란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시간들’을 잠시나마 세워, 우리의 시간들이 ‘괜찮았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잘 견뎠고, 고마웠고, 빛났던’ 것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