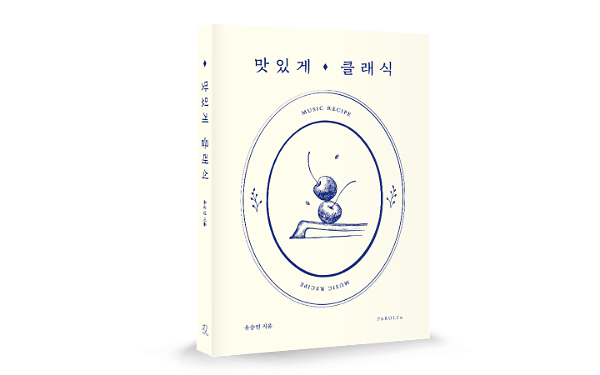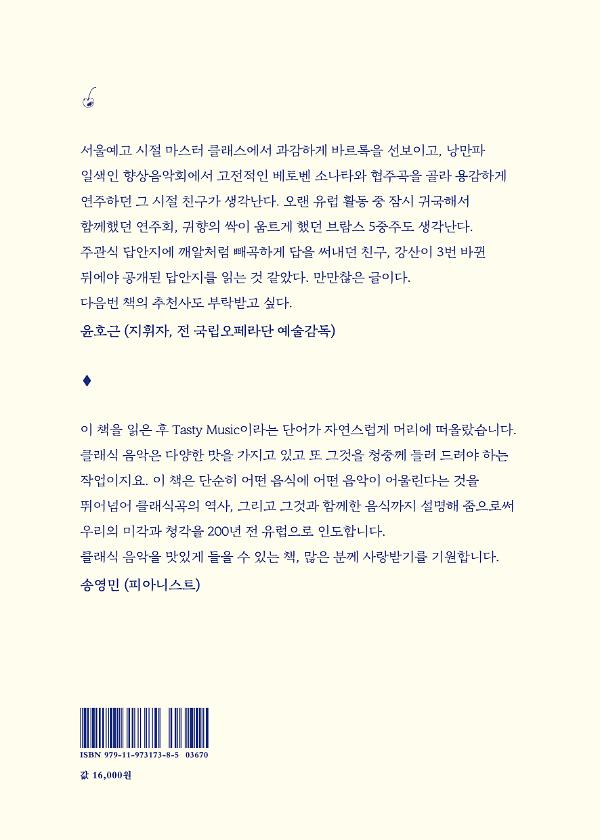흔히 사람들은 멘델스존이 조금만 더 불운한 환경에 태어났다면, 베토벤을 능가하는 심각한 걸작이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혹 모차르트가 멘델스존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모차르트의 음악이 바로 멘델스존의 음악과 꼭 같았을 거란 우스갯소리도 있다. 어떤 작품이 더 걸작인가 하는 질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문(愚問)이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작품이 현답(賢答)을 대신할 일이다. 베토벤은 베토벤이어서,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여서, 멘델스존은 멘델스존이니까 아름답다. 당신은 당신이어서 귀하디귀하고, 나는 그대로 나여서 퍽 다행이다. (19쪽)
살다가 종종,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고리를 잘 관리하며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보란 듯이 깊숙한 곳을 파고 들어오는 날렵하고 찬란한 순간들이 있다. 단단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판타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들 말이다. 무대에서, 선생님의 오른팔이 물고기처럼 반짝거렸다. 선생님의 작은 체구는 고요히 그 자리에 있는데, 선생님의 깊고 깊은 <스코틀랜드 환상곡>은 매끈매끈 펄떡이며 빛나게 무대를 채웠다. 그날부터 나의 판타지는, 뻔하고 재미없게도, <스코틀랜드 환상곡>이 되었음을 더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영영 판타지에 그쳤다는 것도 이제는 아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92~93쪽)
세기의 명연주자도 눈치를 보았었다. 그리고 눈치 보며 내놓은 작품들은, 이제는 무대에서 앙코르곡으로 가장 많이 연주될 만큼 대중에게 사랑받는 곡들이 되었다. 쉽고 짧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은 특정 애호가만의 것이 되기엔 아깝고 아름답다. 그리고 다행히 아주 많다. 듣다 보면 어느 날은 40분짜리 교향곡에도 마음이 열릴 일이다. 어느 날은 다시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소품을 들으며 수수한 식탁을 차릴 수도 있다. (119쪽)
이왕이면 한창 제철을 맞은 어여쁜 무화과나, 붉은빛이 고운 사과가 좋겠다. 허브가 푸릇푸릇 들어간 크림치즈도 양껏 바르고, 양파도 갈색이 나도록 나른나른 볶아 함께 얹어야겠다. 이 가을, 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 나를 위해 지은 예쁜 음식과 바흐의 멋진 춤곡, 책꽂이가 허술하도록 빼내 읽는 책들과 더위가 가신 가을 산책길이 있다면, 이보다 더 근사할 것이 무엇일까. 어린 카잘스는 낡은 책더미 사이에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삶의 안내서를 집어 들었다. 소년의 마음이 되어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은 계절, 어김없이 다가온 이 가을에, 소년처럼, 삶의 또 다른 길잡이를 홀로 발견해 낼 수 있기를 고대한다. 진지하게 나와 마주하되, 춤을 추듯 즐거이 살아 낼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본다. (125쪽)
이렇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서로 어울리는 짝이 있다. 물론 어느 한 조합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이스트라흐와 오보린의 연주가 뜨거운 연애와 같다면, 리히테르와 함께한 오이스트라흐의 연주는 깊고 묵직한 한 권의 철학책과도 같았다. 제랄드 무어와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겨울 나그네>가 너무 완벽해서 먹먹했다면, 브렌델과 함께 한 피셔 디스카우는 보다 자유롭고 로맨틱했다. 음악처럼 친구처럼 사람들처럼, 음식도 궁합이 맞는 짝이 있는가 한다. 소박한 것들도 제 짝을 제대로 만나면 조금 더 제구실을 해내는 걸, 그 오랜 세월을 보내고서야, 배려 없는 수천 번의 식탁을 차리고서야, 조금씩 더 알아간다. 때로는 작은 부엌도 이렇게 우주가 되어 준다. (169쪽)
살다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의 삶도 어쩐지 위로받고 싶은 맘이 드는 서늘한 날들이 있다. 알고 보면 어떤 이의 삶도 굽이굽이 이야기가 없는 삶이 없고, 누구의 이야기도 고단하고 처연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누구의 삶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할 삶이란 없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계절에, 특별히 서늘한 어떤 날에는, 내 고단한 삶에게 가만가만 말을 건네 본다. “너의 이름은 빨강. 붉고 빛나는 빨강, 피처럼 소중한 빨강. 그토록 아름다운 너의 이름은 빨강” (1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