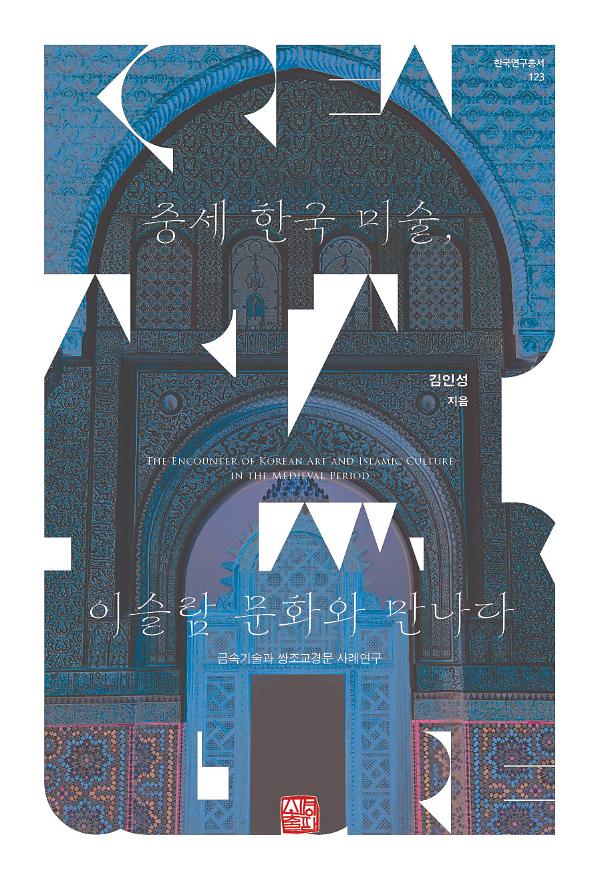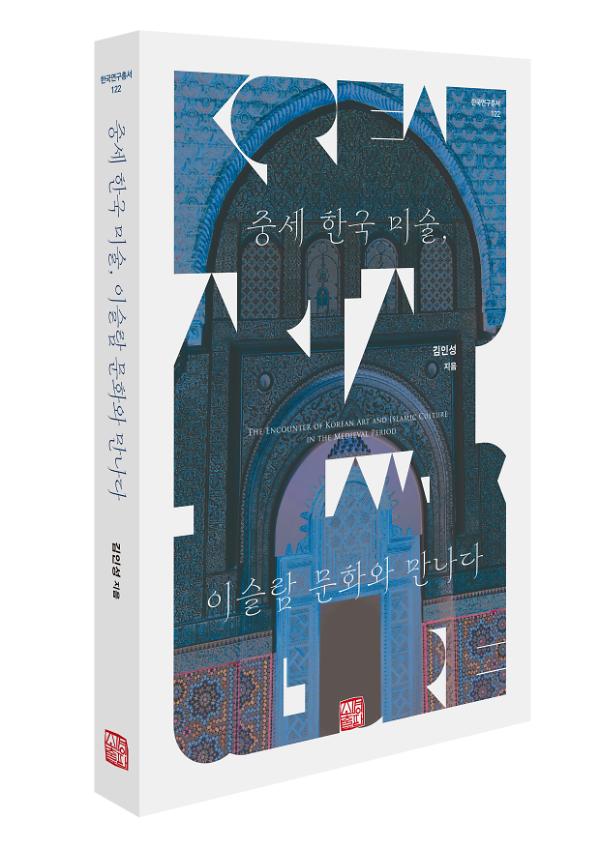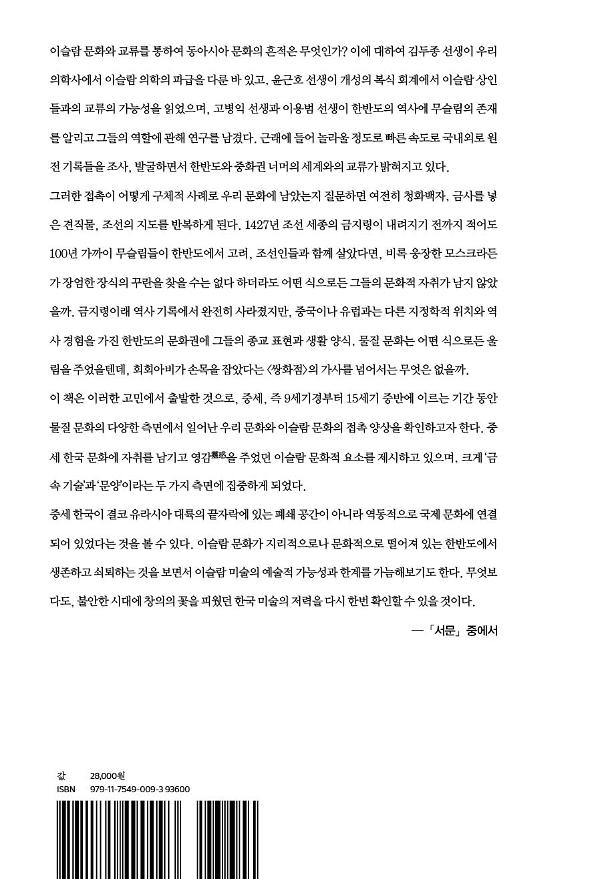한국 문화에 남겨진 이슬람 문화
종교적 특이성을 담고 있는 이슬람 문화의 흔적을 우리 문화 속에서 찾아가 보는 여정을 담았다. 만일 한반도의 왕조가 대제국과 함께 했던 기록을 현상이나 유물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면, 한국 미술의 지평은 한결 커질 수 있고, 한국 문화의 포용성 역시 크게 부각될 수 있다.
더하여, 이슬람 문화와 우리 문화의 관계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미술’, ‘예술’이라고 당연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게 된다. 더 나아가, 문화를 규정하는 우리의 기준이 지나치게 서구중심으로 편파적일 수 있다는 반성도 하게 된다.
우리 문화와 이슬람 문화 간의 교류 가능성은 또 다른 관점에서 기존의 편견에 대해 반성하게 만든다. 흔히 서구인들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관점으로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거 같지만, 물질문화의 측면에서 중세 기독교 문명권인 비잔틴제국과 이슬람 세계, 근세 서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상호 작용을 자주 다룬다. 다면적인 방향에서 역사적인 현실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를 보면 물질문화의 사례로 역사의 공백기를 메꾸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를 재구성해낼 수 있음을 실감한다.
오늘날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을 찾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문화에는 그 표현 양식에 따라 매겨진 등급이 있다. 현실에서는 건축이 가장 중요하고, 조각, 회화, 그리고 공예의 순서로 중요도가 고려된다. 이 순서를 다시 살펴보면,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미술을 바라보던 관점이기도 하다. 그들에게는 서예(書藝)라는 예술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서예는 엄연히 예술이었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예술이었다. 같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썼기 때문에 시와 글씨와 그림, 즉 시서화(詩書畵)는 늘 함께 다녔다. 이슬람 문화에서도 서예가 가장 중요한 예술 양식이었다.
전통적인 이슬람 미술에서는 조각이 극히 드물다. 회화도 많지 않다. 우리가 두루마리 양식의 그림을 남겼듯이 그들도 서책의 삽화로 그림을 남겼다. 서양의 회화가 전시를 염두에 두고 캔버스에 그렸다면 동아시아나 이슬람 문화권의 그림은 사적 감상의 대상이다. 이렇듯 이슬람 문화와 미술의 남다른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슬람 미술은 서양인들이 당연시하는 물질문화의 서열을 따르지 않고, 소위 ‘minor art’라고 평가되는 공예에 아주 많은 공을 들였다. 다른 표현 양식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가나 장인들의 에너지가 여기로 다 몰려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고 화려한 작품들이 많다.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마구 찍어 나오는 공장 제품에 우울을 느꼈던 영국인들이 무슬림들의 수공예에서 위안을 얻기도 했다. 무슬림들이 제작한 일상용품, 대야(手盤)나 주전자(注子)는 유럽 왕실의 애호품이었고, 심지어 왕실의 세례(洗禮) 용기로 특별 관리되기도 했다. 일상성과 예술성이 혼재해 있는 이슬람 물질문명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예품은 어느 종교나 문화권으로든 유입되어 갈 수 있었다. 이슬람 미술의 실용적인 특징 덕분에 한국의 물질문화에서도 거부감 없이 그들의 공예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문화와 이슬람 문화 간의 교류 가능성에 있어서는 특이점이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종교적 배경, 역사적 발전 등은 이슬람 세계와 공통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교류 연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자들도 불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할 만큼 회의적이다. 불교와 이슬람의 이질감은 대부분 우리 시대의 산물이다. 중세시대에는 최소한 이슬람 세계에서 다른 문화에 대해 지금과 같이 이질적이지는 않았다. 실은 바그다드의 압바스 칼리파 아래에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던 바르마크(Baqrmak) 가문은 오래된 불교도 가문이었다.
결국, 이슬람제국과 불교 문화권이었던 한반도 사이에 어떤 유형의 교류나 문화적 접촉도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관념의 한계를 넘어, 『중세 한국 미술, 이슬람 문화와 만나다』에서 중세 무렵 시작된 이슬람 문화의 교류의 장을 오늘날 다시금 이어갈 수 있는 지점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